-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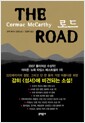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삼백페이지의 절망, 단 한줄의 희망. 이라는 책의 선전문구를 보고 구입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서에 비견된다는 말도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다.
우울하고 음침한 내용일거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 역시나 음침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음침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시적인 운율감을 지닌 문체를 좋아하는데, 이 로드의 문체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최악의, 추하고 더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조차도,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세상임에도 그 표현하는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단락을 읽고 또 읽고를 반복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세계. 남아 있는 음식들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사람들은 결정을 한다. 같은 사람을 먹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느냐, 아니면 사람을 먹이로 삼느냐. 어떤 선택을 하던, 로드 속에서 그려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결국 같은 귀결일 것 같다. 죽음. 음식과 약이, 인간다움이 상실된 세상. 조금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죽는다는 결론은 같다. 글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목표로 삼는 그 남쪽 역시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살아남은 이상, 죽고 싶지 않으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뿐이다.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말이다.
반복되는 풍경, 반복되는 장면.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아,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남쪽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 외의 등장인물은 거의 없고, 어떠한 스토리도 없다. 그저, 그것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 걸어가다가 비나 살육자들을 피해 몸을 숨기고, 집이나 건물이 보이면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무슨 숭고한 의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자도 빠짐없이 샅샅이 읽고 있었다.
유토피아는 없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한다. 식량난. 전쟁.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나라를 뜯어먹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현실에 유토피아라니 가당치도 않은 상상이다. 이 로드를 읽고 생각을 했다. 만약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저런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미래는 바꿀 수 없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더욱이 나처럼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저 바랄 뿐이다. 저런 디스토피아를 내 살아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언젠가 멸망할 세상이라면,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럼에도 [로드]의 내용을 가만히 더듬고 있노라면, 가슴이 알싸하게 아파오면서 콧등이 시큰해진다. 슬퍼서? 무서워서? 아니다. 그 절망과 죽음뿐인 세상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희망은 사라진 땅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단 하나의 희망이, 그것일까. 그냥 사랑이 아닌, 목숨을 바쳐 자신의 소중한 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사랑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