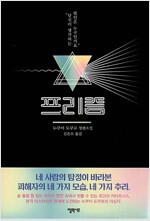
프리즘 / 누쿠이 도쿠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통(혹은 고전) 추리소설은 장르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공식을 중시한다. 먼저 수수께끼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단서들을 통해 의문을 풀고 범인의 정체를 밝혀나간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고전적인 추리소설, 즉 수수께끼 풀이 형식의 추리소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반복을 취한다. 작가가 문제를 던지고 독자가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머리싸움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도 존재한다. 명문화된 규정집이 없을 뿐 스포츠 경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하지만 추리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독자일지라도, 작가가 마음먹고 만들어놓은 함정을 피해 가기는 힘들다.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실제 이미지가 아닌 거짓 이미지에 근거하여 전개되기 마련이며, 작가는 누가 진짜 중요한 인물인지, 또 무엇이 중요한 사실인지를 조바심 날 정도로 조금씩 밝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쿠이 도쿠로의 『프리즘』은 형식 자체가 반전이자 독특한 형식을 지닌 작품이다.
‘어느 초등학교의 젊은 교사가 아파트에서 살해된다. 방에 있던 골동품 시계에 머리를 맞은 것이 사인(死因)이며, 부검 결과 수면제가 검출된다. 죽기 전 누군가 보낸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 속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과연 누가 죽인 것일까…?’
이상은 누쿠이 도쿠로의 『프리즘』 도입부 요약이다. 1장 ‘허식의 가면’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인 ‘나’가 동급생들과 함께 담임 선생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서며, 열띤 의견 교환 끝에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까지는 여느 정통 추리소설의 형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2장 ‘가면의 이면’에서는 화자인 ‘나’가 피해자의 동료 교사로 바뀌고, 이어진 3장 ‘이면의 감정’과 4장 ‘감정의 허식’에서는 다시 피해자의 전(前) 애인과 학부형으로 바뀌면서 일반적인 작품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 장마다 바뀌어 등장하는 ‘나’는 각각의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지만, 독자로서는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가는 최종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완전무결하고 오류 없는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는 대신 독자에게 판단을 넘겨준다.
흰색의 빛을 통과시키면 무지갯빛 띠를 보여주는 프리즘처럼, 이 소설의 제목은 중의적이다. 하나의 살인 사건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다. 각 장은 독자적인 굴절 각도를 지닌 프리즘으로, 등장인물의 입장을 빌려 무려 열 가지의 가설이 제시된다. 두 번째 의미는 피해자 미쓰코에게서 비롯된다. “나는 그런 미쓰코가 마치 눈이 어지럽게 만드는 만화경이나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난무하는 프리즘처럼 느껴졌다”는 작중 표현처럼, 미쓰코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린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자신들 편에 섰던 다정한 선생님이었지만 동료 교사 입장에서는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순진한 사람, 한때 애인이었던 남자에게는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기분을 이해할 줄 모르는 형편없는 상대, 불륜 관계였던 중년 남성에게는 만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여성이다. 미쓰코의 여러 모습은 상대하는 사람의 프리즘에 따라 다른 색으로 비추어진 결과일 뿐이며 그녀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극단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작품의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누쿠이 도쿠로는 이 소설을 에드거 앨런 포의 「마리 로제 수수께끼」의 뒤를 이을 작품으로 구상했다고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포의 순수한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명쾌한 결말을 맺는 「모르그 거리의 살인」과 「도둑맞은 편지」와는 달리, 19세기 뉴욕에서 실재했던 메리 로저스의 변사 사건을 바탕으로 한 「마리 로제 수수께끼」에서는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 여기서 포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사건의 두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마치 변명처럼 느껴지는 문장을 남겼다. 누쿠이 도쿠로는 이러한 결말에 영감을 얻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이야기를 썼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유재홍 옮김, 인간사랑 펴냄)에서 “허구의 진실임 직함은 설화의 기만적인 진리에 대립”되며, “탐정소설은 문학혁명에서 표상적인 진실임 직함의 탄생과 정화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합리성의 영토”라고 했다. 논리의 문학이라고 일컫는 추리소설은 최대한 진실임 직한 가설을 따라가게 되며, 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작가의 결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해석에서는 텍스트보다 독자가 더욱 중요하다. 때로는 독자야말로 텍스트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작가만큼 텍스트를 창조해낸다. 어쩌면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 독자의 눈을 거치며 작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고, 작가가 제시한 열 가지 가설 이외의 새로운 가설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프리즘』의 결말에 대해서는 독자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임에 틀림없지만, 흔히 보기 힘들었던 시도는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박광규 (추리소설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