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come, hard to go
이번에 소개할 두 권의 책들은 얼핏 쉽게 넘기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넓고 멋드러진 세계에 대한 개괄서이며, 나머지 하나는 어떤 가족에 대한 냉소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공통점은 강렬합니다. 읽기는 쉬우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창고에 가져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우 고민하던 책들이라는 거죠.
결국 결정했고, 해서, 쉽게 읽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책 두 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르지만요.
재미난 집 - 물론 기호학과 씨름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냥 일단 즐기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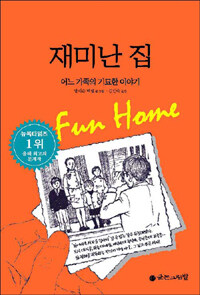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좋고 내용 면으로도 유익한 그래픽 노블로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아트 슈피겔만의 <쥐>와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지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앨리슨 백델의 <재미난 집>을 추가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첫 번째 상자에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망설이다가 말았죠. 앞의 두 작품처럼 역사적인 스펙터클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좀 어려워서요.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좋고 내용 면으로도 유익한 그래픽 노블로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아트 슈피겔만의 <쥐>와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지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앨리슨 백델의 <재미난 집>을 추가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첫 번째 상자에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망설이다가 말았죠. 앞의 두 작품처럼 역사적인 스펙터클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좀 어려워서요.
사실 얼핏 보기에 프루스트나 제임스 조이스를 인용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치밀하게 짜여진 연출을 통해 대사와 행동 이외의 부분에다가 메시지를 숨겨 놓는 작가와 내내 게임을 치러야 하죠. 앞서 언급한 두 작품에 비해 <재미난 집>은 그런 기호학적인 놀이를 확실히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난 집>은 보통 만화들처럼 그림이나 대사가 직접적으로 상황을 수식하지 않고, 그 어떤 순간의 주위를 빙빙 돌며 스케치하듯 그려나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실은 똑바로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처럼요. 등장인물들은 모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겉으로는 모두들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만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 한 명인 작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어도 재밌을까. 내내 고민이 됐습니다. 게다가 죽음이니 동성애니 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건조하게 다뤄지는 것도 자칫 재미없어 보일 수 있고요(성기가 드러나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무미건조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 만난 형제들이 서로 피식 웃음을 주고받는 부분을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후배에게 읽혀 봤습니다. 뭔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흥미롭다라는 반응이 나오더군요. 더 고무적인 반응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고심 끝에 <재미난 집>을 이 코너에 집어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마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수없이 인용되는 낯설은 고전 소설들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정독한다면(만화라서 쉽습니다) 곧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환상적인 영화같은 스펙터클한 감동이 아니라, 마음 속 어딘가에 남아서 자신의 일상 속에 문득 출현하곤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청소년들이 이 책을 한 번 읽고 나서 나이를 좀 더 먹고 또 읽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겉모습처럼 냉소적인 책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주는 가슴 뜨거운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사실 결코 청소년들을 위해 나왔다고는 볼 수 없는 이 책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 쓰여진 책들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히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오해와 냉소, 가족은 하늘이 점지해 준 집단이기 이전에 서로 다른 인간들이 서로를 매일 바라봐야만 하는 곳이라는 서글픈 깨달음, 그리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애정까지요.
조숙한 문학소년소녀들과 한 발 앞서가는 부모님/선생님들이시라면 눈여겨 볼 만한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추천. 뭐,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선정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한 권으로 읽는 세계의 신화 - 헤쳐 모이니 이렇게 즐겁네요!

-독일에서 학생들이 논술 대비용으로 읽는다는 아비투어 교양 시리즈네요. 시리즈의 앞 책이었던 <청소년을 위한 철학 교실>이 국내 학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꽤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책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생각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응용도가 높은 책이더군요.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책을 즐겁게 읽은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유명 신화를 개별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주제 별로 세계의 신화를 별도의 체계 없이 모아 놓았기 때문이죠. 신선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 책이 정말로 논술에 즉시 써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드랬구요... 뭐 사실, 여기는 제가 좋게 읽은 책을 다 가져오는 개인 블로그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런 책이 논술에 써먹기는 훨씬 좋습니다. 각 신화의 통사를 꿰려는 매니아가 아닌 다음에야 주제별/상황별 적용 사례를 모아 놓은 게 더 써먹기 편하니까요. 신화라는 게 정말로 신성 불가침의 주제라도 되는 양 하나같이 큰 덩어리만 던져주는 기존의 입문서들에 비하면 읽기도 훨씬 쉽고 간단해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 책에서 달에 대한 신화는 몇 개나 소개되고 있을까요? 네 페이지 남짓한 분량 속에서 그리스, 게르만, 발트, 인도, 토고 신화 속의 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고요? 아프리카의? 그렇습니다. 이 책은 유명 신화 뿐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작은 신화들까지 아우르고 있지요. 유명 신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의 신화'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신화 비교를 통한 학습이 통사를 익히는 학습보다 그 문화적 가치에 훨씬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들의 연대기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하수구를 수호하는 로마의 여신 클로아치나를 만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 많은 신화들의 서로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을 내보이도록 사례별 정리를 한 것은 결국 좋은 시도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을 위해 나온 책으로써 쉽게 쓰여졌으면서도 폭넓은 세계를 아우르는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지요. 한 우물로 끝을 보는 우리나라의 대세에는 썩 들어맞지 않는 컨셉이지만, 저는 이런 책이야말로 정말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맛을 보여주는 것만큼 입문서가 갖춰야 할 미덕이 또 있겠습니까? 비록 분량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턱없이 넓다 보니 깊이가 부족하다는 필연적인 약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 오케이! 아닐까나요? ㅎㅎ
어딘가에 참고하거나 써먹을 일이 생겨 생각보다 자주 꺼내보게 되는 책입니다. 쉽게 읽고 즐겁게 느낀 다음, 다시 언제고 필요할 때 꺼내보고 싶어지죠. 위대한 걸작과는 또다른 Hard to go라고나 할까요. 다이제스트의 모범이라고 할까요. 묻히기에는 아까운 책입니다.
(p.s: 어떤 청소년이 이 책을 읽고 조셉 켐벨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면, 아, 저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