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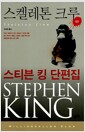
-
스티븐 킹 단편집 - 스켈레톤 크루 - 상 ㅣ 밀리언셀러 클럽 42
스티븐 킹 지음, 조영학 옮김 / 황금가지 / 2006년 5월
평점 :



개인적인 편차가 있지만, 책을 읽다보면 유명세에 비해 잘 안 읽게 되는 작가가 있다. 속된 말로 '아니 아직도 이 작가 책 안 읽어봤어요?' 하고 고전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들 말이다. 아직 초보독자인 나는 언급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추리 소설의 영역에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로스 맥도널드가 해당된다. 아직 한 권도 완독해 본 적이 없다. <움직이는 표적>과 <마의 풀>을 읽다가 만 정도랄까...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스티븐 킹도 그러하다. 꽤 많은 영화와 TV 시리즈도 재미있게 보았고, 나름 책도 몇 권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른 작가의 비슷한 공포 소설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도 있었고, 워낙 다작가다 보니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라서기도 하고...그러다가 우연히 읽게 된 <유혹하는 글쓰기>를 보고, 그의 솔직하면서도 장인의 숙련된 글솜씨에 호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서 읽기로 결심한 작품은 바로 이것이었다. 장편에 비해 분량도 적었고, 설사 재미가 없더라도 단편집이라서 쉬엄쉬엄 읽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읽게 되었다.
핑계는 이정도로 하고, 미루고 미루다 읽게된 단편집. <스켈레톤 크루>는 그런 면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85년에 출간된 작품이니 20년의 세월이 흐른 작품이라 일부는 빛이 바랜 느낌이 들지만, '공포의 제왕'인 킹이 창조해내는 솜씨는 세월이 지나도 대단하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유혹하는 글쓰기>에서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보고 그런 점에 유의해서 읽었는데, 번역을 감안하더라도 문장을 깔끔하게 쓴다.-이 빚어내는 일상의 공포는 초심자에게도 충분히 흥미진진하고, 스릴넘쳤으며, 그리고 무서웠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단편은 '평온한 일상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위협받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인간심리'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감히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을 스티븐 킹은 다양한 변주를 통해 섬뜩하게 그려낸다. 재료는 하나지만, 수천만가지의 레시피로 다양한 요리를 맛깔나게 만들어내는 요리사랄까.
스티븐 킹이 위대하면서 동시에 교묘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가해자의 실체가 두리뭉실하다는 점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묘사를 통해 외연만 보여질 뿐, 실체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물론, 실체를 묘사한다면 초자연적인 묘사가 아닐 수도 있다.) 초창기 공포영화의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발 루튼의 지론처럼 '안 보이는 게 더 무섭다'는 점을 스티븐 킹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화에 실패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각 단편에 등장하는 생생한 심리묘사는 역시 스티븐 킹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길이의 제약을 심하게 받는 단편에서도 비교적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에 성공하고 있다. <안개>는 단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숭이>나 <뗏목>에서 보여지는 정교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심리묘사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의 멋진 서문. 서비스 정신에 충실한 작가 답게, 웬만한 소설보다 재미있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이 책이 나온 경유를 설명하는 서문도 재미있다. 단편을 잘 써야 장편도 잘 쓰게 되는지, 단편과 장편은 창작 방법 부터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티븐 킹은 전자의 입장(자기 단련)+독자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장편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별미라면 충분할 것이다.
나보다 먼저 이 소설을 읽고 좋은 리뷰를 써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이 작품은 더위를 이겨내는 데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부메의 여름>이나 <망량의 상자>같은 작품이 찬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면, 이 작품은 팥빙수를 한입한입 떠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각 단편들이 주는 재미와 서늘함, 그리고 유머-스티븐 킹은 유머작가로서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를 천천히 맛보다 보면, 무더위을 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로는 <안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두려운 면에서는 <원숭이>와 <뗏목>, 단순한 재미로는 <카인의 부활>과 <토드 부인의 지름길>이 좋았다. 특히 <토드 부인의 지름길>의 결말 부분의 환상적인 느낌은 과연 킹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다. 살짝 인류의 효율에 대한 집착을 풍자하는 듯한 느낌도 좋았고. <조운트>나 <결혼 축하 연주>는 심심한 편이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교열을 안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탈자가 많다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찌 실수가 없겠느냐만, 나같이 둔한 독자의 눈에도 많다 싶을정도는 곤란하지 싶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가 더 많은 듯 해서 걱정이다. 그래도 킹이 펼처놓은 세상이라면 기꺼이 무서워하면서 들어가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