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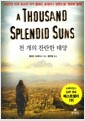
-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 200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모두 다 불행하다,
어느 누구 하나 소위 '잘 되는 꼴'이 없다.
민족과 조국과 종교의 굴레 속에서 운명적으로 불행하다,
특히 '여자라서' 더욱 운명적으로 불행하다.
'나나'와 '파리바'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자식의 부재를 못견뎌했고,
'마리암'과 '라일라'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자식을 지켜주지 못해 애끓이며 살아야했다.
너무나도 부드러웠던
'잘릴'과 '바비'와 '타리크'라는 남성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내려는
애절한 부정으로 모욕을 견디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는 어떠한가?
'마리암', '라일라', '타리크', '아지자', '잘마이'...
이들의 성장과정은 모두 고통의 파도 속에서
아둥바둥대며 살아남아야 하는 길이었다.
돌아보면,
'아프카니스탄'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전쟁이야기와 다르지 않고
'아프카니스탄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 의 한맺힌 설움과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게
인류의 길이고 인간의 운명이지 싶다.
어쨌든,
때리는 '라시드'의 폭력성도
맞는 '마리암'의 절규도
살아남아 괴로운 '파리바'의 허무함도
절망하지 않는 '라일라'의 희망도
꿈을 심어주려는 '바비'의 가르침도
후회하며 그리는 '잘릴'의 뉘우침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타리크'의 온기도
...
다 내 안의 것과 맞닿아 있었다.
하여, 단숨에 읽어내려가면서
가벼운 몸살을 앓는다,
관절마다 찌르르 욱씬거린다...
끝으로,
마리암의 최후를 옮겨본다.
pp.505-506
마리암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많은 걸 소망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그녀에게 엄습해온 건 더 이상 회한이 아니라 한없이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한 시골 여자의 하라미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녀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불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잡초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이자 벗이자 보호자로서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되어,
드디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마리암은 이렇게 죽는 것이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 나쁜 건 아니었다.
이건 적접지 않게 시작된 삶에 대한 적법한 결말이었다.
마리암의 마지막 생각은 코란의 한 구절이었다.
그녀는 그걸 나직하게 웅얼거렸다.
"신은 진실을 갖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신은 밤이 낮을 가리게 하시고, 낮이 밤을 따라잡도록 하신다.
신은 해와 달을 소용이 되도록 만드셨다.
해와 달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신은 위대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탈레반이 말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오,신이시여! 용서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함시라, 여기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아래를 보세요."
마리암은 시키는 대로 했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