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지구를 군림하고 있는 듯한 그 자세가 불편하게만 느껴졌다. 물론 이 지구 상에 현존하는 어떠한 생물체보다도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그렇기에 우리는 지구에 나타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순간 이 곳을 점차 개발하고 발전시켰으며 인간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왔다는 것은 지난 역사와 현재의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인간을 위해서만 오롯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얻은 것일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쓸어 담는 우리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 모든 것들을 피지배층으로 전락시켰던 것일까.
모든 생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중심주의적인 편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세워놓고 자신의 관점에 다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말고 다른 생물이 언어를 사용하리라고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최근 들어 다른 생물도 인간 못지 않게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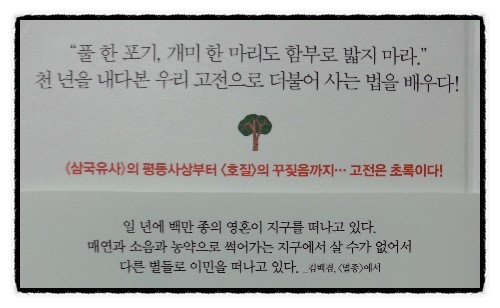
이 책 안에는 옛 선인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들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다. ‘녹색’이라는 것이 빛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 등 모든 것들을 포괄한 것임을 서문을 지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깨닫게 된다.
봄철이 되면 산 속에서 버섯을 채취해서 이웃들과 먹었다가 알고 보니 독버섯이기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기사들을 가끔 마주하다 보면, 먹지도 못할 이름 모를 독버섯들은 대체 왜 솟아 오르는 건가 하면서 때 아닌 원망을 하기도 했었다.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먹었을 경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에 독버섯의 존재 자체에 대해 괜한 시비를 안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읽었던 책에서 독버섯은 인간이 아닌 자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것을 배우면서 다분히 인간적인 시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규보의 <이와 개에 관한 생각>을 읽어보면 개를 때려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쌍하다기 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길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나 역시도 사실 길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버섯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길손이 ‘이’는 죽여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규보는 ‘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며 인간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필요/ 불필요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양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몇 해 전 일본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괴하는 경우 지금까지 명목적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법을 고쳐 이제는 무거운 벌금형과 함께 감옥살이를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나 벼룩을 보호하자는 운동은 눈을 씻고 세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 대한 편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규보는 바로 이런 편애에 쐐기를 박고 있습니다. 자식을 편해하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듯이 생물을 크기에 따라 편애하는 것도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본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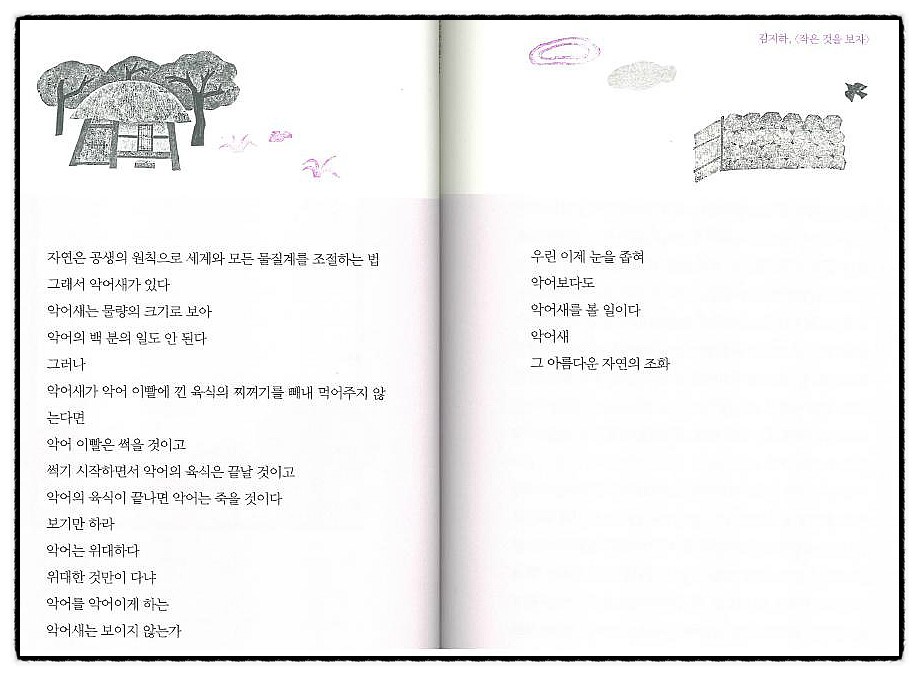
이나 벼룩에 대해서 별 다른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없어져야 할 해충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행태는 김지하의 <작은 것을 보자>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곤충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한 것들을 인간은 단지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 혹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다.
생태계라는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꾀할 때 생태계는 그만큼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김지하에게 생명이란 궁극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상생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생 관계에서는 종이나 개체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본문
고전 속에서 그 안의 인간사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느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이 안에서 자연 속의 인간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처음 해 본 듯 하다. <녹색 고전>이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느꼈던 그 생경함은 책을 덮으며 땔래야 땔 수 없는,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지며 고전에서도 이토록 말하고자 하는 이 녹색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