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음반을 샀다. 산도스 30주년 기념 음반과 8월의 크리스마스 OST다. 산도스 음반은 처음 듣는 곡이 많아 좋았다. 아직 다 듣진 못했지만 낯선 곡들의 아름다운 향연은 귀를 흥겹게 했다. 루이 로르띠의 쇼팽 에뛰드 음반이 중복된 것 말고는 겹치는 CD가 없는 것도 맘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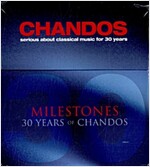


8월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좋아하는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내가 신입생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심은하가 사진관 유리창을 깨는 장면에서 난 울고 말았다. 그 간절한 그리움이 슬펐기 때문이었다. 둘이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 부끄러운 듯 팔짱을 끼는 장면 들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그 잔잔한 음악이 영화의 깊이를 배가시킨 듯하다. 가벼운 깊이가 느껴진 이 형용모순의 영화는 내게 그렇게 특별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허진호의 봄날은 간다이다. 다들 내가 이 영화를 내 인생의 영화로 꼽으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렇게 감성적인지 몰랐다는 말도 덧붙인다. 내가 기실 사람 앞에 가벼이 처신하고 잘 웃는 건 그냥 그게 편해서다. 고고하고 깊이 있는 척하는 모양새도 싫어서다. 봄날은 간다는 그런 내 색깔에도 잘 맞는 영화인 듯하다. 조용히 귀를 갖다 대면 어디선가 대나무 숲의 노래가 들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영화가 봄날은 간다가 아닐까 한다.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달음에 달려가는 그 설렘이란 잔잔하면서 여전히 가슴 뛰는 울림을 준다. 남 몰래 옛 연인의 차를 긁어놓는 유치한 질투의 표정은 사뭇 안타까워 손발이 오그라들게 한다. 둘이 있었던 산사의 대 숲 소리는 푸름의 시각으로 더 선명하고 할머니가 차려 준 고봉밥의 까슬까슬한 밥알은 그 푼푼함이 배보다 마음을 먼저 채운다. 자고 가라는 추파는 나도 모르게 볼을 붉게 하고 내가 라면으로 보이냐는 투정은 이별의 전조인 듯하여 아프다. 헤어지잔 그이의 말에 힘없이 내가 잘할께라 답한 상우의 먹먹함은 무릎이 시리고 발을 저리게 한다. 할미 가슴에 안겨 그이 못 잊었다 우는 아이 같던 모습에 그리도 봄날은 갔더랬다.
다시 산도스 음반을 듣는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곡 모음. 가볍다 할 수 없는 선율의 흐름이 창 밖 빗소리마냥 제 존재를 알린다. 나도 그이 보고파 한달음에 택시타고 먼 길 떠나는 상우가 되고 싶다. 어둑새벽을 가르고 그이를 보듬고 싶다. 상글상글 웃으며 그이 볼 부비고 싶다. 그러고 보면 아직 내 봄날은 오지 않았다. 가을이 한창인 지금의 풍경에도 나는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린다. 바드름히 모자 쓴 쇠라의 그림처럼 점점이 빛 날 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