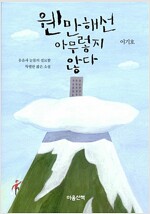떠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떼어내오지 못해 찜찜한 몸뚱이 하나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궂으면 궂어서 집에 있기 좋구나라고 생각하며 몸은 한껏 더 바닥과 합을 맞춘다. 햇살은 창을 비집고 기어이 들어와 자외선을 쏘고 굳이 선크림 하나도 챙겨오지 않은 나는 홍역을 앓듯 내내 붉은 얼굴이다. 방안에서 혼자 붉고 말다니 어쩐지 억울하다. 바닷가 햇살이라면 좀 생색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금요일이 체육대회고, 수업이 없다는 것을 임박해서야 알아져서 급, 여행준비물이라곤 없는 가방 하나를 겨우 들고 섬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 나도 모르게 비는 시간만 있으면 줄행랑이 쳐지는 이 마음과 몸이 나도 내가 싫다. 그렇다고해서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건 아니라서, 좀 일찍 돌아가는 걸로 하고. 가볍게 다니려고 책을 한 권도 가져 오지 않았고, 모처럼 밝은 날 도착이 되어져서 한라도서관으로 직행. 대출증을 만들고 다섯 권 빌릴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세 권을 빌렸다. 새로 들어 온 책 코너에 가서 눈에 띄는 대로. 이런 가열찬 행보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동안 나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다.
나:아무개야. 이틀 내리 멍 때리는 것은 뇌의 휴식이 아니고, 게으름이지?
아무개:그만큼 뇌가 휴식을 원한 다는 거야.
그 이틀이 모여서 일주일쯤 된 것 같긴 한데, 암튼 뇌가 휴식을 원한다니 그저 팔다리를 늘어뜨린 채로 늘어져 있을 수 밖에. 실은 햇살이 저렇게 뜨거운데, 팔다리만은 비오는 날의 컨디션을 유지했으니 셀프 맛사지로 허벅지를 주무르며 집에 두고 온 <여자는 허벅지>를 생각했다. <여자는 허벅지>를 두고 와서 벌 받는거야..반나절 허벅지가 아린다는 생각을 하고나니 그 나머지 날은 어깨가 결리는 것이다. 왜 다리는 팔을 주무를 수 없는가, 몸은 구조적인 모순을 타고 났는가, 팔과 손은 늘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또 한 나절. 아, 팔은 걸을 수가 없지. 그게 그건가.
하루종일 널브러져 있다가 해거름이 되어서 쪼리를 질질 끌고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노을을 보러 나섰다. 한쪽에선 노을이 지고 한쪽엔 달이 떴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나는지. 그랬다 치고. 떠나왔으면 떠남 그 자체를, 지금 여기.를 즐겨야 할 것 아냐. 바부탱아.
이틀을 뒹굴거리고 나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급한 마음에 온갖 책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책들을 다 읽고 가고 싶어서, 순간, 화요일 뱅기표를 예매했다 취소했다를 반복하다, 미리 예매 해 둔 일요일 표 취소 비용이 더 비싸서, 그간에 취소 수수료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이랬다 저랬다 하다 취소수수료만 편도표 한 장이 나온 것 같다. 암튼. 혼자서 50쪽쯤 책 읽을 시간을 허비했다.
6월에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강의를 들을 계획이라,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바닥에 깔려 있어 그랬겠지만, 엄청 크고 (<나눔의 세계>에 비하면 반 밖에 안되는구나.)라고 말하려니, 암튼 두꺼운 책인데 <그림과 함께 읽는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눈에 들어오자 마자 펴서 읽기 시작.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프루스트는 뭔 복이 많아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루브르를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들었다는. 꼭 그게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흥!하는 마음으로 읽어졌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며 뭔가 무식한 것 같고, 바보 같은 마음이 되는 순간을 해소해 주는 책이다<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그림들을 다 찾아서 문맥과 함께 보여주는데, 한 면엔 본문, 한 면은 그림이라 두꺼워도 진도는 술술 잘 나간다.
책을 읽으며 나는 종려나무 이런 걸 일일이 찾아 보는 편이라 진도가 참 더디 나가는 편인데, 화가이름 그림이름들이 나오면 대략 전체적으로 난감하다. 찾아보거나 무시하거나여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괴롭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순간을 해소해주는 참 친절한 책인 것이다. 굳이 전 권을 독파하지 않더라도 요 책 한 권만 읽고도 슬쩍 아는 척 하기도 좋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전 권을 독파하고픈 에너지가 생기기도 할 것 같다. 물론 완독 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이러구러 머리 맡에 온갖 책을 펼쳐 놓거나 쌓아두고, 책등만 줄기차게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기도 하느라 한 편 한 편 그래도 다 못 읽은 것이 제 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 작품집인 <눈한송이가녹는동안>이다. 굳이 맨부커의 여파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요즘 한국소설을 읽어오고 있었지 말입니다. 한강작가님의 맨부커 수상 소감도 멋졌지만, 역시나 황순원 문학상 수상 소감도 참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그런 느낌 있는 수상소감에 반하고. 사실 나는 좀 어려운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어려운 걸 잘 이해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걸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데, 이번에 한강작가님이 수상소감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으쓱했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송중기체가 나오는지.흠....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던 작가 위주로 먼저 읽어졌는데, 일단 ‘눈한송이가 녹는 동안’을 읽고, 팬심 가득한 이기호 작가를 읽고, 권여선, 황정은 순으로 읽었다. 일단 한강과 이기호작가는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 어디 내놔도 티가 나는 글들. 한강은 흐릿한데 읽고 나면 분명하고 이미지가 선명한, 이기호 작가는 분명한데 읽고 나서는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한다. 그 글들의 뒷부분에 간략하게 한 페이지에 해설이 실렸는데, 길잡이 역할로 참 훌륭했다. 아 이래서 평론가구나 하는. 뭐야 이사람들은 같은 글을 읽고 이런 사유를 하는. 에잇. 편해서 참 좋구나 하며 쪼그라들었다.
이런 편견,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들 글은 도무지 너무 감각적이어서 읽어지지가 않아. 는 왜 내 의식 속에 자리했는지, 내가 뭐 딱히 젊은 작가들의 글을 읽으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아무튼 친구에게 황정은 작가의 <파씨의 입문>이 괜찮다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읽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웃는 남자’를 읽게 되었다. 한 마디로 그녀는 내 취향이다. 서사구조가 뚜렷하진 않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손보미 작가는 외국 고전문학을 너무 열심히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권여선작가는 보편적이고 부드러우면서 메시지가 있는 글이 잘 읽혔다. 한강작가님 덕분에 이러구러 이름만 듣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작품이라도 읽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