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JCO 책의 리뷰를 쓰면서 그녀는 노력형 작가와 천재형 작가중 노력형 작가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덜했던 <블랙 워터>보다는 두번째 읽은 작품인 <사토장이의 딸>일 것이다. 첫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떨어지게 쓰는 완벽함이 천재보다는 노력가에 가깝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사토장이의 딸>의 박력있는 전개와 강한 여주인공, 100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이 이토록 완벽한 시작과 끝과 과정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찰 지경이었다.
그 후에 읽은 <멀베이니 가족들>에서는 약간 실망. <사토장이의 딸>에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 <멀베이니 가족들> 역시 좋은 작품이지만, 길이에 비해 단조로운 이야기 전개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읽은 <소녀 수집하는 노인>에서도 역시, 그녀의 조사와 노력을 십분 느낄 수 있었다.
문학적 센스와 감각이 없다면 그런 멋진 작품집을 만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섯 거장( 헤밍웨이, 헨리 제임스, 애밀리 디킨슨, 마크 트웨인, 애드거 알랜 포우)의 작풍과 작품. 그들에 대한 역사를 새로운 창작물 속에 세밀하게 끼워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거다.
조이스 캐롤 오츠하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생각나는 작가가 나에게는 존 어빙이다. (존 어빙은 커트 보네것이나 J.D. 샐린저의 이름과 함께 오르내린다고는 하지만) 다작에 장편을 쓰는 작가라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사진은 아님. ^^ 사진은 존 어빙와 그의 아들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타고난 이야기꾼' 은 바로 존 어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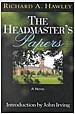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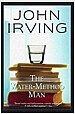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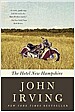





작품이 정말 많긴 많다. 우리나라에선 어쩌자고 다 분권으로 나왔는지; ( 가아프가 본 세상이나 일년동안의 과부는 충분히 한권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이었는데 말이다.)
다음 장을 예측할 수 없는, 클리쉐 따위는 개나 줘, 그가 창조하는 인물들, 불행, 행복, 모든 것이 새롭다.
조이스 캐롤 오츠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그녀가 한문장 한문장 계산된 문장을 쓴다면, 존 어빙은 그냥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술술술술 자판이 알아서 움직여 줄 것 같다. <가아프의 세상>에서의 그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건에 충격받고, 도대체 이건 뭔가. 싶었는데,
만만치 않은 분량이라 미루고 있었던 <사이더 하우스>를 읽기 시작한 채 5분도 안 되어, 아, 진짜 존 어빙은 타고났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이제 1권을(480페이지) 다 읽었을 뿐이니 2권에서 또 어떤 쇼킹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든 '타고난 이야기꾼'에 대한 생각은 읽을 수록 굳혀질 뿐이다.
이야기는 메인 주 세인트 클라우즈(St. Cloud's)고아원의 남아관에서 시작된다. 병원에서 간호사 둘이 신생아의 이름을 짓고 의무 포경 수술을 받은 작은 성기들이 잘 아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192x년) 세인트 클라우즈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그건 이 병원의 의사가 전쟁 중에 포경수술 받지 않은 병사를 치료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고아원의 책임자고, 이름은 윌버 라치였다. 두 간호사중 하나는 '라치'라는 성에서 단단하고 강한 침엽수를 연상했다. (라치Larch는 낙엽송 의미) 하지만 그 간호사는 '윌버'라는 우스꽝 스러운 이름을 싫어했고, 그것을 나무같이 실질적인 단어와 나란히 붙여 놓은 어리석음에 분개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닥터 라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생아 이름을 지을 차례가 되면 존 라치, 존 윌버, 윌버 윌시, 등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첫장부터 이야기의 배경이자, 시발점인 세인트 클라우즈 고아원의 중요 인물인 두 간호사 에드너와 안젤라, 그리고 주인공인 윌버 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청산유수로 흘러나온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기대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눈 똘망똘망 뜨고, 책으로 몰입하게 한다.
윌버 라치라는 인물에 대해 세세하게 해부하듯이 펼쳐 보여주어서, 윌버 라치의 말 하나하나, 행동과 판단 하나하나에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한다.
겨울이 긴 동네, 메인주의 황량한 마을에 있는 세인트 클라우즈
세인트 클라우즈에서 봄은 사건을 의미했다. 음주와 싸움, 매춘과 강간. 봄은 자살의 계절이기도 했다. 그리고 봄이면 고아의 씨들이 과도하게 뿌려졌다. 그렇다면 가을은? 닥터 윌버 라치는 고아원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 비슷한 자신의 일지에 가을에 대해 썼다. (...) "바깥세상에서는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다. 사람들은 봄과 여름의 수고로 맺은 결실을 거둬들인다. 이 결실은 겨울이라고 불리는 비성장의 계절과 긴 잠에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 세인트 클라우즈의 가을은 5분이면 지나간다." 하기야 고아원에서 어떤 날씨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휴양지'의 날씨? 또 고아원이 '청정'마을에서 번창할 수 있기나 할까?
이 배경은 윌버 라치와 함께 이야기의 주인공인 호머 웰즈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것 중에 하나다. 독자에게 '세인트 클라우즈' 고아원과 고아원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닥터 라치, 호머 웰즈, 나중에는 멜로니까지...가 읽어주는 <제인 에어>와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그 어느때보다 더 의미심장하다. 많은 현대의 작품 속에 <제인 에어>와 디킨스의 작품들이 나온다. 이렇게 감정이입되는 작품속의 제인에어와 데이빗 코퍼필드는 정말이지 처음이다.
윌버 라치와 호머 웰즈의 고민은 독자에게도 역시 같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한다.
몇몇 장면 묘사는 정말 극적이어서, 아, 이래서 영화보다 책.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체 무슨 일이야? 멜로니는 그녀의 신랄한 창가에서 궁금해하며 서 있었다.
강렬한 천장 조명 때문에 창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고 흰 캐딜락이 그녀의 윗입술에 멈춰 섰다. 컬리 데이가 그녀의 뺨을 가로질러 뛰어갔고 그녀의 목에서 아름다운 금발 여자가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안고 있었다.
꽤 중요한 장면이다. 그녀보다 먼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호머 웰즈가 약속을 깰 것이라는 예감과 복선
멜로니라는 인물은 존 어빙이 만든 기괴한(?) 인물 중 하나인데, 2권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중이다.
무튼, 이 장면에서 멜로니가 창가에서 고아원에 찾아온 윌버와 캔디, 그들의 캐딜락을 보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일까? 존 어빙의 책을 읽으면, 그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가가 아니면 뭐가 되었을까? 레슬링 코치? (그는 레슬링 선수였다.) 가끔 인터뷰를 보면, 꽤 심심하지만, 그가 쓰는 책만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