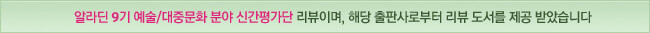[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 기억 속의 색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미셸 파스투로 지음, 최정수 옮김 / 안그라픽스 / 2011년 8월
평점 :



유럽에는 참 다양한 학문이 많구나. 홍차가 가장 맛있는 온도와 시간에 대해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 책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다. 색에 대한 연구는 '컬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색의 활용에 대해서는 집중되어 있을 거라 짐작했었는데,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차갑고 따뜻한 색, 보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건 다 이런 연구 덕이 아니겠는가. 그저 감사할 뿐!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신호등의 색이 왜 초록과 빨강으로 되어 있느냐, 노랑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을 갖게 하는가 등의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겠거니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내가 주목한 것은 역사와 사회상과 언어가 함께 얽혀서 색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초록 염료를 만드는 과정에 비소가 들어가 초록 염색을 한 옷을 입거나 벽지를 발랐을 경우, 비소 중독으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비소'를 문제 삼지 않고, 초록색 자체를 멀리하고 불길하게 여겼다고 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색에 대한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데. 홍안(紅顔)이란 말은 뜻그대로 보면 붉은 얼굴이지만, 이 말은 미인에게 보통 붙인다. 혈색이 좋아서 붉어졌기 때문이라는데 단순호치(丹脣皓齒 -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를 생각해 봐도 '붉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아, 어떤 색이 예쁘다. 배색이 좋다는 등의 생각은 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왜 빨강이 금지를 나타내는지 궁금해 한 적은 있지만, 저자처럼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할 생각은 하지 못 했다. 태어날 때부터 보게 되는 엄청난 색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색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 건 아닐까?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무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적이 참 흥미롭다. 무색과 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책을 읽어보라.
책을 덮고 글을 쓰려고 이것저것 떠올리니 우리의 대화에도 색에 대한 표현이 다양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재미있게도 우리에게 색色이란 단어는 '색채color'란 뜻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쓰였는데,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진 않지만(네이버 사전으로 검색하니 없었다), 색기(色妓)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원래 이 말은 기생 중, 춤이나 노래 등을 주로 하는 '예기'에 반하여 몸을 밑천으로 하는 기생 들을 '색기'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쓸 때, '색기'가 있다고 말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色氣'가 아닐까 했는데, 네이버 사전에 없으니 넘어가자. 어쩌거나 이 색色이란 신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