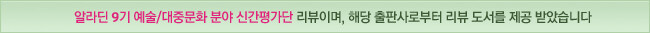[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볼프강 카이저 지음, 이지혜 옮김 / 아모르문디 / 2011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2011년 7월, 신간평가단 문화/예술 분야의 첫 책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이다. 말 그대로 그로테스크한 그림과 함께 크고 굵게 쓰인 '그로테스크'란 글자는 나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 딱 좋았다. 이 이유로 나는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니 책을 만든 분이 이런 표지를 만들어낸 이유를 조금 알 것도 같다. 이거야 말로 책과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봐야할.. 까? 나도 덩달아 그로테스크한 글쓰기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고 봐야겠다.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은 시크하다, 엣지있다, 아방가르드 하다는 단어와 같이 어떤 것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느낌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단어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소비되고 말 수도 있었던 '그로테스크'라는 단어를 저자는 놓치지 않고 끄집어 냈다. 그리고 하나의 장르 혹은 사조로 만들어냈다. 이야, 이것이 바로 미학이 하는 일일까? 그렇다면 정말이지 더욱 더, 공부하고 싶어지는 학문이다.
그로테스크, 이 스쳐지나갈 수도 있는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처음은 그 뜻과 쓰임을 밝히는 것인데, 이는 단어분해부터 시작한다. 이때, 뭣보담도 -esque'라는 어미가 만들어내는 깊이감이 그로테스크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게 참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저자의 능력은 더욱더 흥미로웠고 말이다.
그 후부터는 보통의 미학 책들이 그렇듯, 시대와 문학장르별로 단어를 파악해 나간다. 특히 제목에 명시한 대로 미술과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학 장르 안에는 연극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가웠는데, 아무래도 내가 주로 배운 게 연극이라 그렇지 '미술과 문학'만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진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어쩌랴, 반가운 것은 반가운 것이고, 키치적인 감상이라 해도 조금이라도 아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해도 빠른 것을.
미술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를 설명할 때 이용되는 보스나 브리헐 등의 작품은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도판을 통해서 접했고, 또 미술사를 훑어보기만 해도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낯선 것이 많지 않았지만, 문학은 전혀 다르다. 번역자도 '이 책은 미학책이지만 저자가 독일어문학 전공이 아니면 읽기 힘든 작품들을 거론하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할 만큼 문학분야에서 다루는 소설은 낯설기가 한량 없다. 저자는 해당 작품마다 줄거리와 인물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가며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해 친근하게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괴테, 카프카 정도는 알고 있고 몇 작품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로테스크를 설명할 때에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 나머지 작품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데다가, 그로테스크를 전면에 들고 나온 작품이다보니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 것들이어서 읽기 어려운 적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 연극을 다룬 것은,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는데, 내가 실제로 읽거나 깊이있는 분석을 하지 못한 작품이라 할 지라도, 어디서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더 꼼꼼히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몰리에르','뷔히너' 등의 작가 이름 뿐만 아니라 '꼬메디아 델아르떼'라는 프랑스의 즉흥극 중 하나의 장르를 설명할 때에는 친근감마저 들 정도였다. 아무래도 문학이란 장르에서도 특히 소설과 연극을 주로 이용한 이유는 '극(劇)'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로테스크를 더 쉽게 설정, 표현할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다고해서 미술 분야에서 거론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저자는 미술의 범주도 상당히 넓혀놓았는데, 캐리커쳐와 풍자화, 신문이나 책 등에 들어가는 삽화까지 다양한 그림들을 소개하며 그로테스크를 설명해낸다. 저자가 현대 미술의 초현실주의로까지 범주를 확대해 그로테스크를 설명하는 지점에 이르면, 저자의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그로테스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된다. (이것마저 저자의 의도라면... 흠좀무?)
미학자의 흥미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미학이라는 틀 안에서 전개된 까닭인지 술술 읽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주제와 폭넓은 예시는 책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게 해준다. 지리한 장마가 그치고 찜통같은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공포물을 접하기 딱 알맞은 시기다. 피가 튀고 눈알이 돌아가는 공포영화, 소설과 함께 약간의 지적허영심을 채워주고, 또, 후에 '그로테스크'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책을 중간중간 읽어주는 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