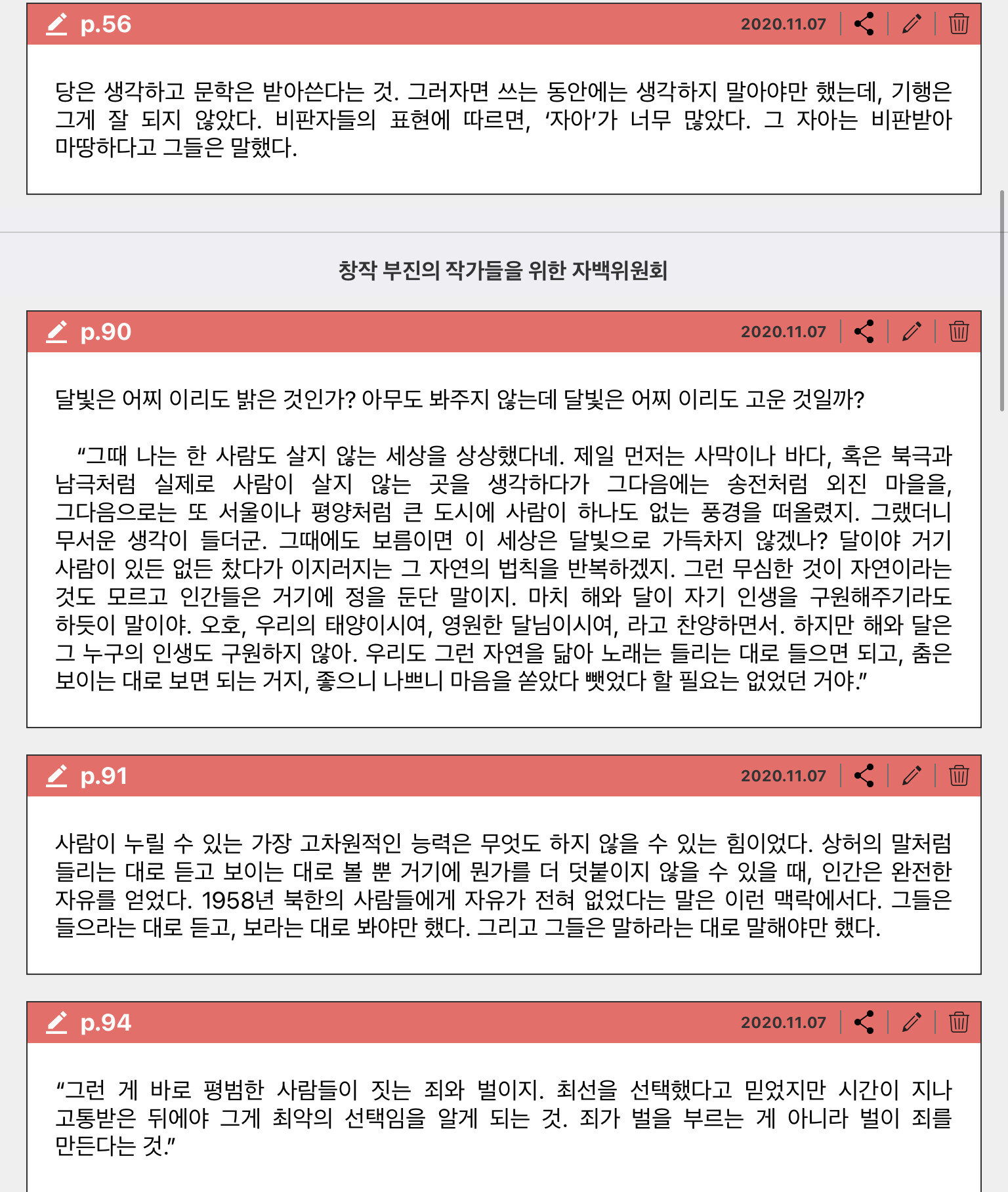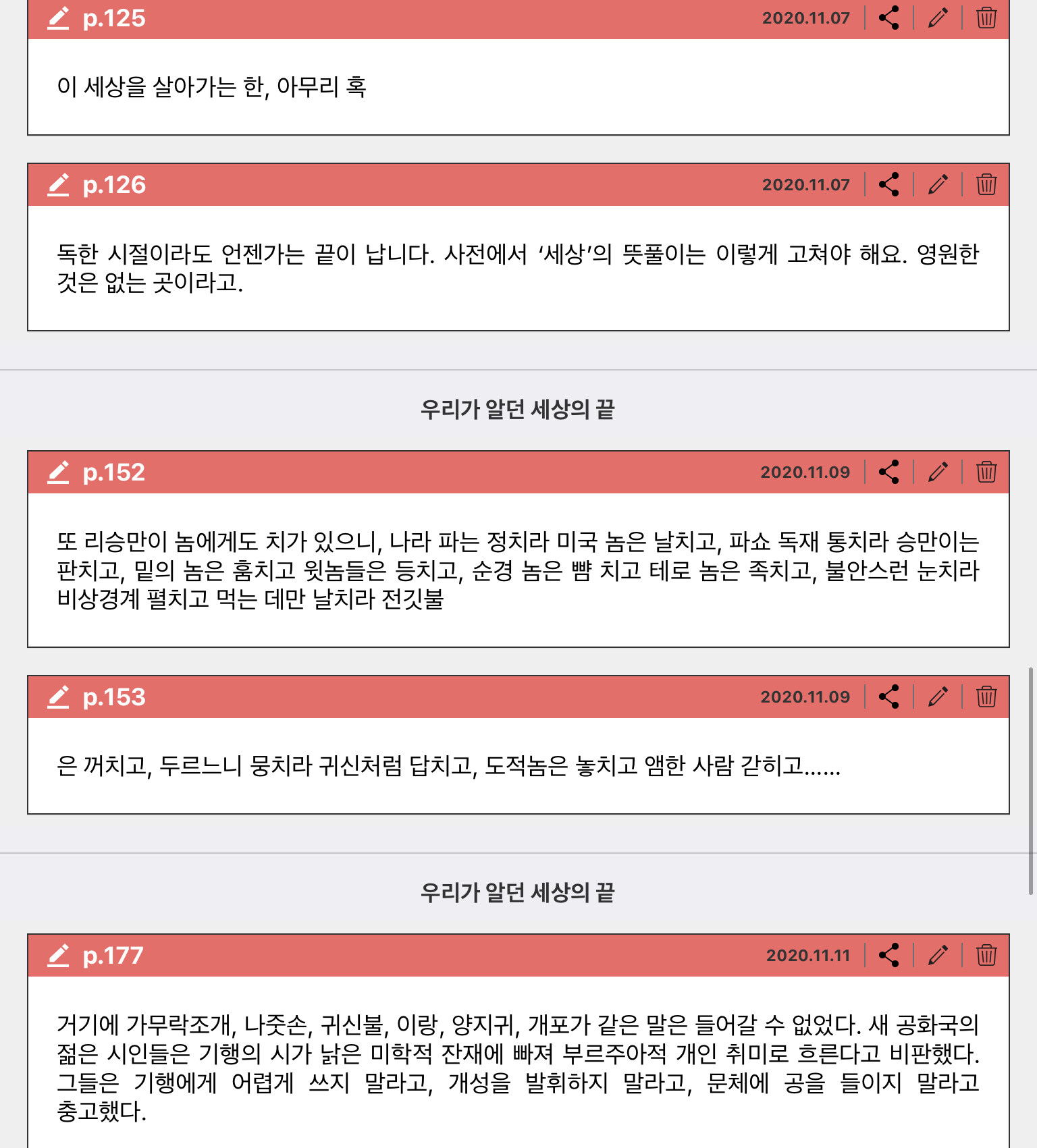-

-
[전자책]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지음 / 문학동네 / 2020년 7월
평점 :



-20201111 김연수.
Jaurim - #1
https://m.youtube.com/watch?v=SpVV6HvtX8c
아기에게 먹이지 못하고 흐르는 젖. 사랑하는 이에게 가닿지 못하고 허공에 뿌려진 씨앗물. (야이 원초적인 새끼야…)
시를 빼앗긴 시인. 소설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
읽는 내내 슬픈 것들을 생각했다.
전기나 전기소설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영웅 만드는 게 싫다. 칭송 받는 아동 운동가가 사실은 소아성애자였고 고통 받는 아이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 같은 불온한 상상을 한다. 그 시절 살아보지 않은 후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사람의 증언도 추억 필터가 씌인 것이라 믿지 않는다. 애를 어떻게 키우면 이런 뼛속까지 불신자로 자라는 걸까 나도 궁금하다.
이 소설은 시인이 정상에 선 순간을 그리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라면 시집 사슴을 출판해 벗의 손에 든 걸 때 탈까 집어 넣어라 할 때일까. 작가의 말대로 시인은 자신이 죽은 뒤에 그리던 남쪽 동네 사람들이 자기 시를 읽게 될 걸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어리고 젊은 애들이 수능 대비를 위해 밑줄 쳐가며 자기 시를 ‘분석’할 줄은...심지어 진짜로 수능에 나올 줄은…
수능 출제 시 한 편 감상하고 갑시다.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앓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고향(故鄕)’<사슴> (1936).
우리 아빠(혹은 아빠 같은 으르신) 친구는 관우 같고 여래 같은 삼수 갑산 화타….ㅋㅋㅋㅋㅋㅋ
시인이 나오는 소설이지만 내내 시를 쓰지 않는다. 다만 그가 썼던 시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남몰래 추운 방에서 몰래 연필로 썼다가 남볼새라 불태워진다. 아름답게 울리는 말을 쓰면 혼나는 세계에서 멍텅구리가 되어 가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은 왜 그걸 보는 나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지...정작 시인은 너무 담담해서 더 슬퍼… 1984도 생각나고 감옥에 갇힌 소설가나 자살한 시인들도 생각난다.
글로 남기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인은 시를 보고 시를 만진다. 잃어버린 시들을 잊지 않았지만 잊으려고 애쓴다. 나는 언젠가 읽기도 쓰기도 집어치우고 무덤덤하게 사는 나의 미래를 가끔 상상한다. 생각보다 불행하지는 않을 것도 같다. 그러니까 괜히 미치고 팔짝 뛰었네. 어쩄거나 시가 남았으니 남은 나는 조만간 읽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