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양, 다시 읽기 - 철학과 예술에서 경제와 과학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지식의 모든 것
커크 헤리엇 지음, 정기문 옮김 / 이마고 / 2006년 3월
평점 :

품절

교양, 다시 읽기/ 커크 헤리엇 지음, 정기문 역/ 이마고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지식의 모든 것
디트리히 슈바니처의‘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이란 책을 끈질기게 읽어 치웠다. 나는 그 책을 읽는 와중에 서점에서 꽂힌 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교양, 다시 읽기’였다. 부피와 무게가 만만치 않은 이 두 책을 어떻게 읽을 용기가 있었는지 구입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구입했지만 막상 읽는데는 굉장한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다.
전자의 책은 나에게 ‘역사, 세계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후자의 책은 내게 지식의 방대함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고나 할까?
솔직히 커크 헤리엇이 병리학자 즉 의학박사이면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이력을 보면서 그의 바탕이 인문학이 아니라 의학이었기에 글의 느낌이 많이 달랐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디트리히 슈바니처는 영문학자이게에 인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빨랐고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커크 헤리엇이 보여준 정말 파리 뒷다리가 가진 세밀한 정보와 역사 훑기는 정말 솔직히 질릴 정도로 지루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탄복할만한 것은 의학자로서 출발한 그가 이렇게 방대한 교양적인 지식을 9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엮어냈다는 데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는 이러한 방대한 양의 교양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인류는 한 사람의 독점적이고 창의적인 지식과 발명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우연과 함께 협력된 수 많은 사람들의 아이템의 도움이 있었음을 분명히 짚고 가고 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다. 벨이 전화기를 혼자서 발명한 것도 아니고, 증기기관을 와트가 혼자서 발명한 것도 아니다. 수많은 발명가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진면목은 한 사람의 발명은 수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업적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학자의 원래 신분이 없었다면 작가는 과연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나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 많은 용어와 신체기관과 설명을 달달달 외워서 적재적소에 순간적으로 적용시켜야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학자만이 이런 다양하고 굉장히 나열성이 짙은 교양지식서를 펴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책을 중간에 읽으면서 이 책에 건질만한 것은 이를테면, 벤츠 회사의 이름이 왜 메르세데스 벤츠냐 하면 카알 벤츠가 자기와 자동차 기술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의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여서 회사 이름을 ‘메르세데스+벤츠’로 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LG-OTIS라는 상호가 나오는데 그 오티스는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엘리샤 오티스에서 온 것이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다 읽고 난 후 느낌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지식인들 중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분야에서만 전문성을 띠지 다른 분야에서는 찍 소리도 못하는 현실이 오히려 각 분야와 전공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교양의 결여를 초래함으로써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장벽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는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날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을 꼽고 있다.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의 작가의 결론이 다소 의아하긴 했다. 하지만 그가 수없이 나열한 정보와 지식과 교양을 생각해본다면 그럴만도 하다 싶다.
이 책은 부제처럼 ‘철학과 예술에서 경제와 과학까지’총체적인 모든 역사와 지식을 담고 있다.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특별히 작가는 과학지식에서 굉장히 세밀화를 기한 대신에 문학사나 예술사에서는 다소 줄기만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인문학도인 나로서는 과학사를 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로켓이 나오고 세포가 나오는데...병리학자인 작가야 익숙해서 닳고 닳은 지식영역이겠지만 나에게는 완전히 ‘쇠귀에 경읽기’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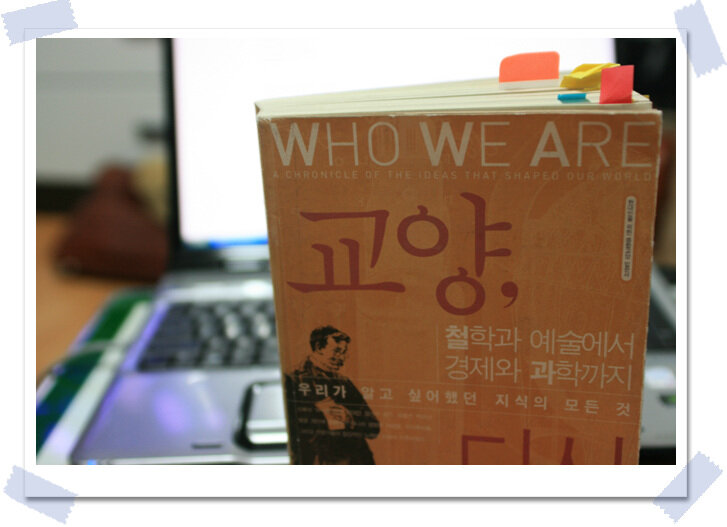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록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미래의 세대들을 향해 글을 적고 있다. 커크 헤리엇은 특히나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에서 파생했다는 비교종교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좀 의아했다. 작가의 눈에서 비친 개인적인 지식의 여정 가운데서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까지 다룰려고 했다는 데서 점수를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교양의 모든 것을 다 다룰려고 하다 보니 양은 비대해졌다. 숲은 비대해졌지만 숲에 심긴 나무들이 다소 앙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상식들이 우리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자는 고발하기 위해 상식의 파격적인 면을 노출시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역자는 이 책의 후기에서 이 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류 교양의 총서이자 상식에 대한 도발적 질문 제기”
나는 저자가 이러한 모든 교양지식을 집대성하여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육의 절실한 필요를 말하며, 세 번째는 인구과잉에 따른 가족 계획을 들고 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TQM(Total Quality Management)를 들고 나와서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인류가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의 발견과 발전과 아울러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어야 함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디트리히 슈바니처의 책,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이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이 책은 끝까지 다 완독한 자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지적 사유의 여운이 남는다. 한 지식인이 자식의 전공과 영역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교양을 다룰려고 했다는 점-심지어 의사가 음악의 대위법을 운운하고, 제임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했으니 말 다하지 않았는가?-이 너무나 탁월하다. 하지만 커크 헤리엇은 인류의 교양사가 그냥 독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물과 인물의 도움과 도움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신의 책의 내용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전공외의 수 많은 학자들과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지적 산물을 탄생케했다.
모든 전공과 학문에 통달한 지식인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Walking Dictionary라고 해도 모든 분야에서 No.1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No.1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학문하는 자의 성실한 자세로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 저작을 탄생시켰다. 이 점에서 나는 커크 헤리엇을 더 높이 사고 싶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교양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조언과 충언과 피더백을 구하면서 방대한 저작으로 다듬어갔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이 그가 박사학위 Ph.D 학위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준다. 정말 그래서 Ph.D 학위가 있는 자는 자기가 전공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면 또 다른 분야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인 듯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더 드러커가 3년마다 자신의 공부하는 영역과 분야를 바꿔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철저한 연구자의 자세가 커크 헤리엇에게서 엿보인다. 아...정말 지루했고 힘겨운 지적 탐색이었지만 ‘교양, 다시 읽기’정말 멋진 놈을 만난 기분에 감상을 적어 보았다.
20080625.
Written By Kar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