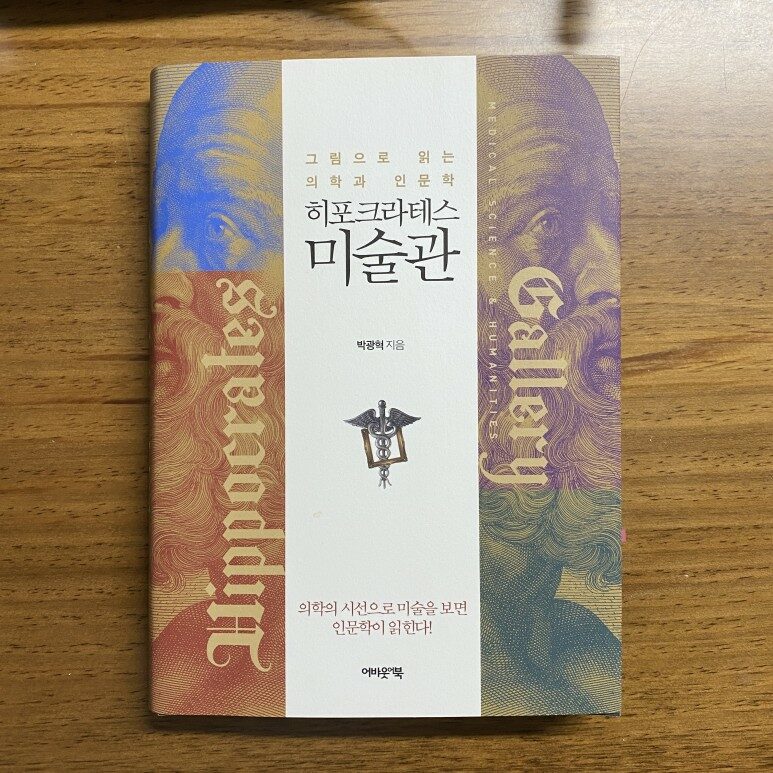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은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 고흐의 그림을 시작으로 콜레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차이콥스키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다. 아무래도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다. 이 책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코드도 바로 죽음이다.
머릿니와 옷니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진화생물학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기욤 아폴리네르를 통해 아폴리네르 증후군이란 질병도 알게 되었다. 아폴리네르 증후군이란 뇌의 기능 중 감정 형성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손상되는 질환이라고 한다.
고야의 숱한 그림을 봤지만 <의사 아리에타와 함께 한 자화상>은 처음 본다. 이 그림을 통해 '굿닥터'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저자의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놀라웠다.
오스트리아의 빈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상화가 있는데, 바로 '씨시황후'이다. 자객에게 칼에 찔린 후 그녀가 입고 있던 코르셋이 지혈 효과가 있었는데 코르셋을 풀면서 심장눌림증에 의해 그녀가 사망한 이야기는 몰입감이 있었다.
전에 읽었던 미술 관련 책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작가들의 작품과 뒷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하일 브루벨이다. 작품의 주된 소재였던 '데몬'과 신경매독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그의 삶이 살포시 오버랩되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병을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뇌질환에 해당이 되고, 돈키호테가 이 질병에 걸렸을 것이란 이야기도 의사의 시선이었기에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였다.
카인과 아벨, 최초의 슬픔(이브가 아벨의 죽음에서 느낀 감정)에서 시작된 '형제간 경쟁'이 정신의학에서도 다룬 연구주제였다고 한다.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가 겪은 성매개감염병과 그녀가 지원한 <백과전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지적인 모습,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안락사를 통해 왜 생명을 살려내야만 하는가란, 당연한 질문에 대한 고찰 역시 인문학을 접하는 재미였다.
'닥터 러브'라 불린 의사, 닥터 포지와 '드레퓌스 사건'에서 양심을 지키려 한 에밀 졸라의 황망한 죽음은 펼친 책을 덮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몰입이 되었다.
태초의 악녀라 할 수 있을까, '릴리트'를 통해 사악함도 질병일까? 란 신선한 의문을 가져보았다.
작가이자 의사였던 안톤 체호프와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도 의사의 눈으로 흥미롭게 읽었다.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의사인 저자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공이 대단하고 나에게 신선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