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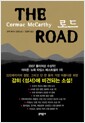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갑갑하고 숨이 막혔다. 목이 죄어 오는 느낌이었다. <로드>를 읽는 내내 불편했다. 침대위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책을 덮을 수 없었다. 부조리로 점철된 삶에 집착하는 우리네 모습처럼 <로드>가 만들어 놓은 무간도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예전에 위노나 라이더와 에단호크가 주연한 리얼리티 바이츠(한국 제목 청춘스케치)에 에단호크가 부른 'I'm Nuthin'란 노래가 있었다. 당시 한 평론가는 이 노래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만약 당신이 교통 정체가 심한 퇴근 길 차 안에서 우울함을 만끽하고 있었다면, 절대 이 노래를 듣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아냐'라고 외치는 에단호크의 염세적인 목소리를 듣다보면 어느 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빠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로드>를 읽으며 에단호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로드>엔 가슴 속에 있는 우울과 몽상의 씨앗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마 그 힘은 <로드>의 저자 코맥 매카시가 만들어낸 지옥같은 상황 설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독할만큼 건조하고 무덤덤한 그의 문체가 독자의 폐부를 쥐어 짜낸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통해서 코맥 매카시의 지독한 능력은 이미 눈치챌 수 있었다. 거대한 악 앞에서 그저 동전의 앞면이 나오길 바랄 뿐인 인간의 지독한 무기력함. 노구를 이끌고 악의 뒤를 쫒는 형사의 허무함. 생명이라곤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미국 서부 황무지의 황량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엔 염세적인 암울함이 영화에 팽배해 있었다. 코맥 매카시는 <로드>에서 한 층 더 강력한 지옥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세계. 그곳에 홀로남은 아버지와 아들. 그 속에서 부자는 걷기 위해 걷고 살기 위해 산다. 그들의 행동에 목적은 없다. 남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폐허 속에서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발부림일 뿐이다. 굶주림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 먹는 인간들은 <로드>의 완벽한 지옥을 완성한다. 아버지는 폐허 이전의 세계를 경험했다. 색이 존재하던 그 시기의 추억이 아비가 맞딱드린 지옥의 세계를 더 흉칙하게 만든다. 밤마다 꾸는 과거의 세계는 그에게 악몽일 뿐이다. 아들은 폐허에서 태어났다. 오직 뿌연 재만 남아있는 폐허만이 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색이 없는 아이의 세상은 아들이 겪고있는 지옥의 비극을 더 슬프게 만든다.
<로드>엔 오직 폐허를 걷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만 나온다. 그 속에 특별한 이야기나 설명이 없다. 때문에 이 책의 번역가 정영목씨의 말대로 독자는 자유롭게 <로드>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난 <로드>에서 부조리를 맞딱뜨리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 비극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폐허의 세계. 그 속에서 우린 어떠한 본래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폐허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폐허를 향해 찾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에서 곧 굴러떨어질 바위를 산 위로 올리는 시시프스의 무의미한 노동이 오버랩 된다. 굶주림 앞에서 제 자식도 잡아먹는 인간의 모습은 카프카가 묘사한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카프카, 시골의사) 이 같은 비극 앞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야기하던 '어떠 어떠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말하긴 너무 어려워 보인다. 서로를 잡아먹고 짓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시에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간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이다. 결국 <로드>에 처한 아버지와 아들의 상황은 독자에게 우리의 실존적 비극을 직시하게 만든다. 부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은 인간 삶의 알레고리인 셈이다. 책을 읽는 내내 갑갑함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를 가려줄 수 있는 거짓 세계를 창조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거짓의 천막을 벗겨낸 사람은 극도의 좌절을 겪게 된다. 여기서 일부는 자살이란 방법을 택하게 된다. 시시프스의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할 바엔 바위에 깔려 죽겠다는 심산이다. <로드>에 등장하는 엄마(아내)도 죽음을 택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폐허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극 앞에서 택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코맥 매카시의 시선은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 아버지의 삶 역시 폐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무의미한 노동을 지시한 부조리 신에게 대항한 시시프스처럼 아버지는 무의미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바로 아들이다. 카뮈는 '자살을 택한 행위는 결국 부조리 신에게 인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부조리 신을 극복할 수 있다. 바위를 올리는 과정에 저만의 의미를 창출해내며 부조리 신에게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시시프스. 결국 아버지도 폐허만 남은 세계 속에서 아들이란 의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가며 부조리를 극복한다.
극도의 염세적 분위기가 책 전체를 휘감고 있는 <로드>. 하지만 코맥 매카시는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 결국 부조리를 극복하는 것도, 부조리한 세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완벽하게 객관화 될 수 없는 주체적 존재다. 오로지 행위 자체만으로 실증되는 역동적인 존재다. <로드>에도 이같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배여있다. 죽은 아버지를 두고 낯선 사내와 함께 길을 나서는 아들의 모습에서 연대라는 힘으로 부조리를 극복했던 과거 선배들의 모습이 떠올렸다. 간만에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극한의 부조리 속에서 희망을 이어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연민의 눈물이었다. 양념과 작위로 뒤 범벅인 소설, 거짓 세계의 모습을 확대 재생산하는 소설 사이에서 만난 <로드>는 보물 그 자체다. 코맥 매카시 같은 작가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나에겐 삶의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응 희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