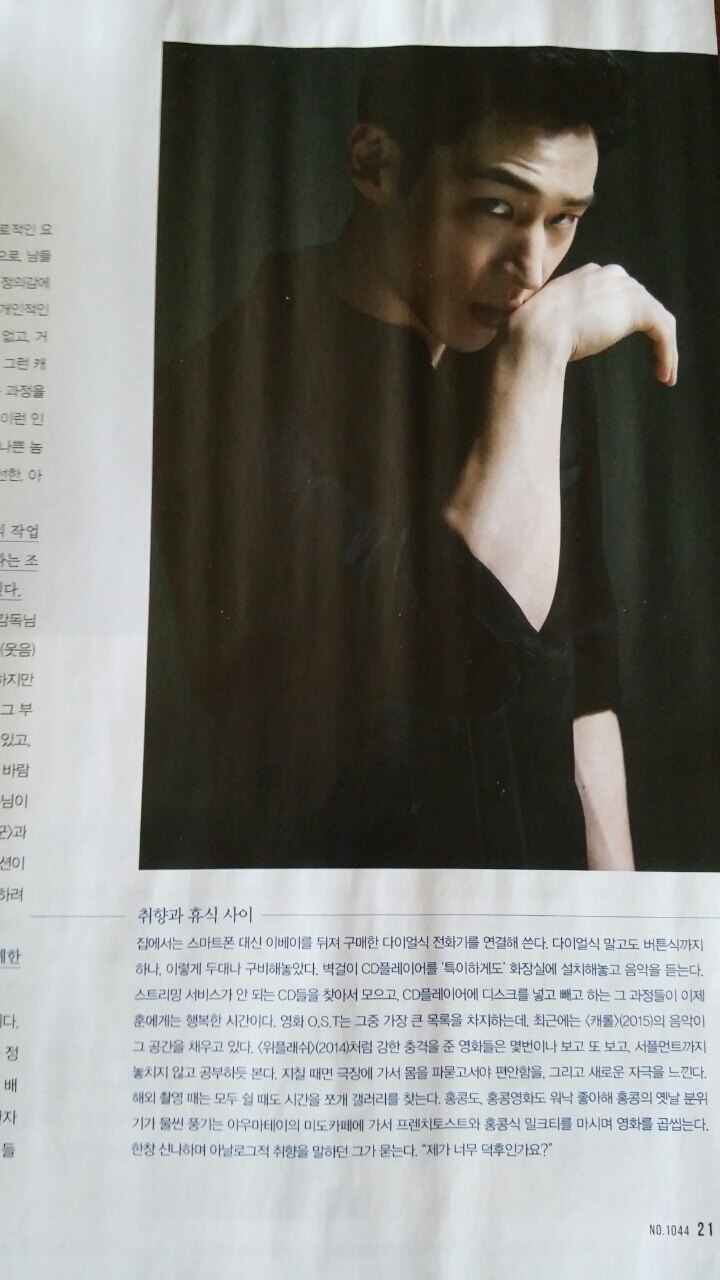
화장실이 아니라 욕실이겠지? 집 넓고 자기 공간이 큰 사람들이 욕조에서 와인 마시며 음악 듣는다는 건 잘 알지만(뭔들 못할까?) 벽걸이 시디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캐롤 ost를 듣는 이제훈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일부러 다이얼식 전화라니, 버튼식 유선전화는 우리집에도 있지만. 남의 취향에 관심 갖는 거 잉여스러울 때가 많지만(대개 감놔라 배놔라 하고 싶어하니까) 재미있게 보던 <치즈 인 더 트랩>이 분노 유발로 방향을 틀며 끝나기에 삼일절에 다시 <시그널>에 버닝한 후 그동안 쟨 왜 저러고 사나, 뭘 위해 살지? 싶던 해영의 사정이 나오며 완전 좋아져서 금요일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도달한 <씨네21> 1044호. 너는 왜 티븨드라마로 표지모델이 됐니, 땡큐. 하면서 또 생각한다. 그 힘든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잘 컸니? 시니컬하긴 했지만 나빴던 적은 없잖아. 어쨌든 지금은 불의에 분노하고 타인(범죄자일지라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됐잖아.

나는 가끔은 비싼 향초, 자주 싸구려 향초를 켜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온갖 형광펜과 색연필을 총동원하여 정성들여 다이어리를 쓴다. 읽은 책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간혹 책도장을 찍는다. 중고샵에 내놓을 때 값 떨어질까봐 최근엔 책 훼손을 조금 고민하게 됐다. 인생 끝까지 들고가야 할 책 많지 않은 것 같거든.

자주 간절곶에 간다. 구룡포항과 강구항을 좋아하지만 7번국도는 너무 멀다. 뉘엿뉘엿할 즈음이면 더 좋고 사실 화창한 봄날에도 좋고 아주 추운 겨울날에도 좋다. 어느 순간 카페와 레스토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전처럼 고요하고 한가로운 분위기는 찾을 수 없게 됐지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바다 덕인지 매력을 완전히 잃진 않았다. 낭만과 소요를 동시에 느끼면 평온해진다. 오랫동안 선적과 하역이 이뤄지는 부둣가 동네에 산다. 부둣가 낚시꾼들과 방파제와 수출입 현장의 분주함 가까이서 어린시절을 보내다보니 세상에서 제일 잔혹한 바다는 해운대. 아침마다 미어터지는 지하철에 실려 센텀으로 출근할 땐 미칠 것 같았다.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태종대, 기장, 다대포, 송도까지 바다 순례는 매번 많이도 한다. 바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바다를 버리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산의 매력을 잘 알진 못하지만 바다의 매력은 밤새워 얘기할 수 있다. 섬은 로망으로 충분하다. 제주까지 갈 것도 없이 7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정말 살고 싶은 동네가 많이 나온다.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건 아직 좀 많이 두렵기는 하지만.

겨울엔 눈꽃 트래킹이 그렇게 좋더니 기온이 바뀌니 금방 봄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신이날 수가 없다. 산 아래 계곡, 푸른 바람 아래 살려면 꽃은 핑크나 퍼플이 제격이겠지? 푸릇푸릇/ 울긋불긋. 사진 한 장으로 잊고 있던 봄이 되살아난다. 저 예쁜 풍광을 지나 외길로 굽이굽이 산을 오르던 캠핑장 가고오는 길. 한적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에 봄은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다.

둘이 가는 캠핑에서 독서는 좀 버거운 일이다. 텐트치기도 밥도 설거지도 간식준비도 술상차리기도 나는 거의 하는 게 없지만 둘이 있는데 하나가 책에 빠지면 하나는 외톨이가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 명 가면? 독서할 일이 있을까? 여기선 해지면 어두워서 책 못 읽는다. 겨울밤 난로 피워놓고 마쉬멜로 구워 먹으며 침낭에 들어가 영화보는 건 행복 그자체다. 온도는 후끈하고 바깥공기는 차갑고 어둠과 밤과 자연 그리고 나는 하나. 이게 다 취향 때문. 밀크티도 좋고 율무차도 좋다. 책을 한가득 빌려 나오면서 도서관 한켠 자판기에서 한 잔 뽑아마시는 밀크티나 율무차는 소소한 행복의 최선. 아직도 금요일이 아니구나. 아, 이번호에 실린 과학자 5인방 기획기사 중에 서민 교수님도 계신다. 『기생수』를 비롯한 몇 개의 텍스트를 소개한다.



<사울의 아들>은 상영이 끝나기 전에 <쇼아>랑 같이 보고 싶다. 『한 혁명가의 회고록』이 정말 아프면서도 재미있다. 기억해야 한다, 이름 없는 자의 이기지 못한 혁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묵직한 것들이 자꾸 차올라서 뜨거움이 그리워지는 겨울의 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