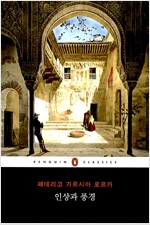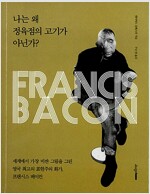큰외숙모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친정 엄마처럼 의지하는 분이다. 외사촌 오빠는 나와 친정 오빠가 자취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마땅히 가야할 장례였지만 외사촌 오빠는 코로나로 아무도 못 오게 했다. 어쨌든 울적했다. 큰외숙모가 어떻게 사셨는지 엄마에게 여러 번 들어 마음이 안됐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엄마가 큰외숙모를 생각하며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쓰였다. 결국 남을 염려하는 것은 짧고 나를 염려하는 것은 길다. 나는 돌아가신 분보다 엄마를 더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평안은 나와 밀접하다.
시골집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 배관 공사도 하고, 보일러도 바꾸었다. 살다 보면 예정에 없는 이런저런 일이 생긴다.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 사업 실패나 암 같은 큰병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갑자기 다치거나 하는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는 일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만 그렇겠는가. 살아 있는 것들이 저마다 이런 번거로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하면 모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다.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내고, 간간이 떠오르는 기억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
문성해 시인의 시는 편안하게 읽히면서 시에 오래 머무르게 한다. 대부분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쓰려고 한다. 낯설고 새로운 것이 놀람을 주기도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다. 그에 비해 시인의 시는 익숙한 느낌을 준다. 그 편안함 안에서 잔잔한 파문이 인다. 가만히 들여다 보게 된다. 시인의 다른 시집도 주문해 두었다.
책이 어렵다기보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혼돈스런 책이 좀 있었다. 그중 막스 피가르트의 책이 있다. [침묵의 세계]가 무척 좋았는데 [인간과 말]을 읽다 보니 침묵의 세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말의 선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첫 장에 있다. 말이 있기 전에 말이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오르게 한다. 아이디어가 있고,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느낌은 그가 말하는 말의 세계에 이끌리지만 생각은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어진다.
다음 주엔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단축 수업이긴 하지만 점심을 먹고 오니 내가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단축 수업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몰라도 시간은 간다. 벌써 3월이라니.
=====================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문성해
산책하는 사람에게-안태운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김희준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안희연
땀 흘리는 시-김선산, 김성규, 오연경, 최지혜 엮음
로르카 시 선집-로르카
천 개의 아침-메리 올리버
난 혼자지만 혼밥이 좋아-정훈교
나는 왜 정육점의 고기가 아닌가?-데이비드 실베스터
플러쉬-버지니아 울프
인상과 풍경-로르카
광기의 역사-미셸 푸코
헤테로피아-미셸 푸코
인간과 말-막스 피카르트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김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