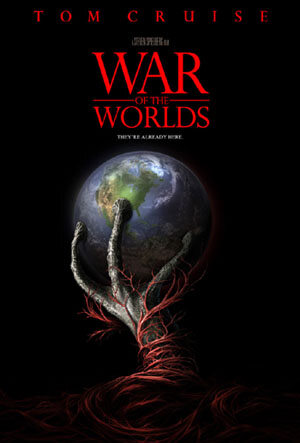
눈으로 타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데 있어선 탁월한 재능을 갖춘 노장과 헐리웃에서 오래 묵은 각본가 데이빗 코엡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웰즈의 원작이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에 대한 우회한 비판이었다는 비평을 현재의 미국과 결부시키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류의 블럭버스터에 팀 로빈스가 광기에 물든 우파적 페르소나를 가지고 출연했을 리는 없을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라크전에 대한 비교적 순화된 우화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폭격과 테러의 공포를 막대한 물량으로 보여준다. 두 번에 걸친 대규모의 폭발을 주인공들이 지하실에 숨어있는 동안 겪어내게 된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밖으로 나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풍경들이다. 팀 로빈스의 집 지하에 갇힌 주인공들이 밤새도록 빛과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는 걸 공포 속에서 겪어야하는 장면은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인들이 겪어야했던 '충격과 공포'의 재현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 보이는 죽음은 오직 민간인들에게만 찾아온다. 달아나고 겁내고 피를 빨리거나 빔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죽어나가는 건 오직 민간인들의 몫이고 의도적으로 배제된 군인들의 죽음은 단지 외계인의 불기둥에 전차와 함께 불타버리는 수준으로밖에 표현되질 않는다. 그들은 영화 내내 줄기차게 도망다니기만 하는 톰 크루즈만큼이나 썩 영웅적이지가 못하다. 이 영화에서 두 번 나오는 지구인의 승리 장면 중 두번째이자 마지막인 다 죽어가는 시체처리하듯 외계인 로봇을 부숴버리는 미군의 전투씬에선 우리가 흔히 봐왔던 전쟁의 승리를 다룬 영화에서와는 달리 아무도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화면 안에선 그저 차갑게 이상없음이란 한마디가 울릴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최대반전은 레이의 아들내미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다는 결말에 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쏙 빠진 이 밉상인 탕아의 개과천선 및 귀가는 고난하기만 했던 레이와 레이첼의 귀로와 비교하여 설명이 안되어 있기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당혹스럽다. 동시에 스필버그 영화의 전통인 가족이데올로기의 황당한 강조를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비극성을 현저히 약화시킴은 물론 바이러스로 인한 외계인의 절멸이라는 원작의 결말을 짧은 상영시간 안에 그대로 따른 탓에 다소 황망하게 느껴지는 마무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필버그의 이 선택은 그자신이 구축해낸 박스오피스의 법칙을 결국은 저버릴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결과로 영화는 정치적 지향성과 블럭버스터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여 빚어낸 값비싼 사생아로 보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