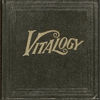
내가 그런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미 커트 코베인이 자살한 다음이었다. 아마, 뉴스에서 잠깐잠깐씩 본 기억이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난 그 시점에서도 커트 코베인이 뭘 팔아먹고 다니는 사내인지 모르고 있었다. 난 그 때 건즈앤로지즈와 판테라, 세풀투라와 메탈리카에 빠져있었던 시기였고, 한마디로 시대에 뒤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도 멀리서 들려오는 얼터너티브 어쩌구는 그럭저럭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었고 음반 가게를 왔다갔다 할 때마다 본 그쪽 관련의 정보와 연계되는 앨범들은 적절한 정도의 흥미를 일으키는 대상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최초로 사게 된 그런지 앨범이 바로 펄 잼의 'vitalogy'였다.
처음 들었을 때, 4500원이라는 돈을 이 밍숭맹숭한 앨범에 쏟아부었다는 것에, 나는 중학생의 신분으로 처절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부클릿은 치워두고라도 그들의 음악이란 것이, 필립 안젤모와 막스 카발레라의 짐승 같은 목소리와 금속성 짙은 둔탁함에 익숙해있던 내 귀가 듣기엔 너무도 순했다. 장장자그장자그자그장장 앙증맞게 연주되는 기타와 깡통을 때려대는 듯한 드럼 소리, 웅얼대는 듯한 에디 베더의 보컬은 그런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칠음을, 얼터너티브란 단어에서 힘을 느끼며 스래쉬 메탈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음악을 판단하던 나에게 너무도 빈약하게 들려왔다. 난 4500원이 아까워서라도 이 앨범에 익숙해지려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나는 이 앨범을 책상 깊숙이 봉인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나는 더이상 일렉 기타와 드럼, 샤우팅 창법의 속도와 낙폭을 음악의 가치 결정 조건으로 두지 않게 됐고 시끄러움의 정도는, 그저 시끄러울뿐이었다. 할 수 있는 한 과격하게 귀를 학대하는 음악은 세풀투라를 정점으로 지겨워졌고 내 음악적 취향은 다변화됐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머뭇거리며 이 앨범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감동적이었다.
http://music.bugs.co.kr/Info/album.asp?cat=Track&menu=m&Album=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