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버필드]는 시청자에게 진득한 사유의 시간따윈 제공해주지 않는다. 핸드헬드로 찍은 카메라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주인공들은 오로지 경악하고 소리 지르고 내내 촛점 잃은 카메라 덕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쫓겨 도망 다니는 것이 일이다. 그런 와중에도 스튜디오 영화답게 대규모 파괴씬과 군부대의 동원, 군중씬과 같은 블럭버스터적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것은 [블레어윗치]의 적자인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저예산 인디물과 차별점을 마련했는지를 얘기해준다. 한마디로 [클로버필드]는 사유 같은 건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실시간 롤러코스터적 경험의 영화이며 그건 시청각적으로 끊임없이 두들겨 맞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과 비슷하다. 이 영화는 시청자를 옴짝달싹 못하는 공포의 무력한 체험자로 불러 세운다.
명백히 9.11의 다각화된 패러디인 [클로버필드]는 재난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망다니느라 바쁜 이들에게 뉴욕의 미래를 맡길 가능성은 썩 없어 보인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보는 이는 금세 이 영화에 흥미를 잃겠지만, [클로버필드]는 관객들이 주제 넘게 괴물에 맞설 바주카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틈을 현명하게 차단한다. 관객들은 희망찬 미래와 영웅주의적 심리상태를 갖추기 전에 주인공들과 함께 달리고 도망 가고 힘들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거의 불사조와 같은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뉴욕을 박살내고 돌아다니며 미시 영역의 자가컨트롤 공격병기까지 갖추고 있는, 설정적으로 볼 때 거의 무적인 괴물과 더불어 내내 도망자의 강박감을 표현해주는 어질어질한 핸드헬드는 정서적-육체적 피로에 의한 절망감을 선사해준다. 이것이 마냥 즐거운 체험이라고 하긴 힘들다. 그러나 유령의 집이나 호러영화들은 유쾌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진 않는다. [클로버필드] 또한 같은 종류의 영화다. 앉아있는 동안 팝콘의 소비량과 중성지방을 풍성하게 늘려줄 이런 영화들은 전통적으로 선택된 마조히스트들을 필요로 하는데 [클로버필드]는 거기에 더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시신경과 위장의 강인함도 시험할지 모를 일이니 통각의 갯수를 늘려놓은 의미에서 첨단의 영상 사디즘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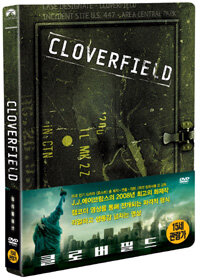
[클로버필드]에 대해선 이런 불만도 심심찮게 있다. '결국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이 일직선으로 뻔하고 기존의 괴수물에서 새로운 게 없다.' 그러나 유령의 집에서 진득하고 다채로운 스토리를 원한다면 [캐리비안의 해적]은 못 만들어졌을 것이다(사실 그 심심찮게 졸립게 만드는 해적영화가 그토록 글로벌적인 대박을 친 건 여전히 수수께끼이긴 하다). 놀이공원에서 [라쇼몽]이나 [밀러스 크로싱]을 감상할 이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클로버필드]의 공포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 7년 전 뉴욕에 대한 유사체험이란 걸 고려하자면 텍스트적으로 보다 흥미로워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UCC에서부터 화제를 일으키고 자발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설정놀음들을 자양분 삼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이 영화 본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한참 부차적인 정치적 영역의 얘기로 보인다. [클로버필드]는 차라리 그 공포가 벌써부터(혹은 이제야) 마니악한 유희의 한 형태로 투사되기 시작했다는 어떤 증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