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화는 이어지는 처음의 두 씬에서 영화의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다. 우선 살인. 그 행동엔 어떠한 거리낌도, 감상주의적인 어떤 불필요한 요소도 없다. 희생자와 살인자, 그리고 순식간에 행해지는 죽음. 이 영화에서의 행동이란, 그리고 살인이란 그렇게 깔끔하고, '경제적으로' 이뤄질 것임이 여기서 암시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지는 대형 마트의 풍경. [아메리칸 갱스터]는 전혀 화려하지가 않은 영화다. 또한 [대부] 식의 장중하고 비장미 넘치는 클래식 드라마도 아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었다는 리들리 스콧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스콧 특유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미학은 최대한 거세되어 있다. 액션씬조차도 마지막에 가서야 단 한 번, 그것도 마이클 만보다도 더 가라앉은 난잡한 총격전으로 드러난다.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신 침착한 시선으로 중간상과 소매상을 붕괴시키면서 증식하는 대형 마트의 풍경과 비교하여 프랭크 루카스가 지향한 세상이 얼마나 비즈니스적이며 심지어 자본 지향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이기까지 한 것인지 알려준다(부동산과 이자 재테크의 귀재기도 했던 프랭크 루카스의 재산은 그 시절에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있었다). 말마따나 그는 정말 30년 쯤은 훌쩍 앞서 있었던 진보적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독점자본에 의해 대형화되어가는 세상, 미국식 제국주의, 그리고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회한 통찰이다. 그 세련되게 포장된 비즈니스 가면들에 갱스터라는 단어를 붙여놓음으로써 이 이야기는 명백히 조롱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낸다. 이미 국경이 사라진 단일 블록으로 진화중인 EU와 달러가 신의 지위를 잃어버린 현재에 있어 이 지적은 단순히 미국외 국가를 향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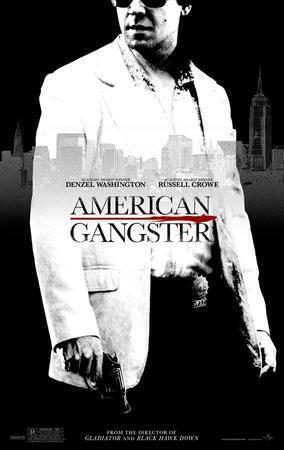
익숙하게, [아메리칸 갱스터]는 악과 선이 갈리지 않는 (대부분의) 세상의 공모에 대하여 보여준다. 이 장르의 영화에서 흔히 써먹게 되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진부한 표현은 [아메리칸 갱스터]에서도 거의 동어반복의 수준으로 다시 해당된다. 범죄자는 과연 지옥에 가는가? 글쎄. 경찰도 지옥에 갈 판인데 범죄자까지 신경 써 줄 수 있을까. 어차피 그 사이 좋은 커플들의 진한 동지의식이 관객에게 카타르시스적 면죄부와 함께 다같이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오래된 영화적 클리셰가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