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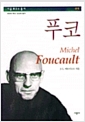
-
푸코 - 시공 로고스 총서 5 ㅣ 시공 로고스 총서 5
J. G. 메르키오르 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1998년 8월
평점 : 
절판

거인의 어깨에 걸터앉아 뒤통수를 보는 재미
미셸 푸코(1926-1984)
그의 저작은 하나의 숲과 같다. 그것도 단정하고 곧게 뻗은 침엽수림이라기 보다는 온갖 넝쿨손이 엇갈리고, 발밑은 푹푹 꺼지는 정글과 같은 숲이다. 언젠가 그의 초기 저작인 ‘광기의 역사’를 손에 들고, 읽은 줄 또 읽어가며 거의 광인(狂人)이 될 뻔 했었던 경험이 있다. 아마도 그가 사유하는 방식이 매우 낯선데다, 다소 지루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런 정글에 무턱대고 들어갔을 때는 몇 발 못가서 지쳐버리기 마련이다.
몇 년이 지나고, 이 정글의 지형을 알려주는 지도를 만나게 되었다. ‘푸코’라는 제목의 입문서가 바로 그것인데, 메르키오르(저자)는 푸코의 모든 저작들을 섭렵하고나서 나름대로 친절한 입문서를 남겼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정글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마치 거인의 어깨에 걸터앉은 채, 잔잔한 웃음까지 지으며 ‘푸코’라는 숲을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이는 입문서나 해설서에 관한 편견이 다소 사라지는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원전을 중요시 하며 입문서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다. 그러나 지식이란 자신에게 의미있을 때만 진정한 것이다. 혹자는 타인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독창적 책읽기’에 크게 방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 범람 시대에는 독창성 못지않게 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게다가 훌륭한 입문서는 원저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다. )
거인의 어깨에 앉아서 시야를 확보한 후, 숲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였다.
먼저 철학과 역사를 결합하려 한 푸코의 사유방식이 보였다. 생활이 모인 역사가 갖는 불완전함은 추상이 주는 철학의 완전함을 상대화 시킨다. 그는 이렇게 세상을 조감함으로 새로운 지식에 도달한다.(그는 부인하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에게는 구조주의자라는 호칭이 따라다닌다.)
다음에 보인 것은 ‘에피스테메(episteme)’라는 관념이다. 그는 앞서 말한 사유방식으로 ‘지식의 역사적 지층’을 찾아냈다. 한 시대와 문화의 일반화된 해석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단절적이고, 이 지층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이제 점점 그의 사유는 친숙해져서 일상과 결부되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판옵티콘(panopticon)은 왜 이리도 거칠고 어설픈지(비록 좋지 않은 의미에서 세련되고는 있지만…), 감시탑의 주인과 그의 행동이 훤히 보인다.
드디어 시선은 추상과 세계와 우리 사회를 거쳐 나의 뒤통수에 날아와 박힌다. 근대 서구의 자아의 조작된 인간관인 ‘온순한 인간(Homo Docilis)’의 개념이 내 속에서 숨쉬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는 거인의 어깨에서 만족한 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