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메모의 순간>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기록해두고 글을 써야 더 정확하고 생각도 잘 정리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년에는 좀 더 기록을 남겨야겠다.

다만 다른 사이트에 서평을 써둔 게 있다. https://trap.wiki/ 트랩위키라는 사이트인데, 지금은 멈춰있다. 나름 오랫동안 만들었던 사이트인데 서버 비용 문제로 지금은 멈춰있다. 돈을 내면 사이트가 다시 돌아가겠지만 1,2만원 정도여도 매달 나가니 부담이 되었다. 해당 사이트의 서평을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두긴 했다.
https://blog.naver.com/trapwiki
알라딘 블로그의 기존 글들과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옮겨 두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쓴 <찬란하고 무용한 공부>은 책이 참 좋았다.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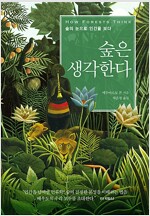
온라인 중독과 관련한 서평을 위 사이트에 써나가면서 언어 활동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숲은 생각한다>를 다시 읽으면서 이 생각을 또 수정하고 있다. 언어 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기호'로 생각을 '생각'하면 숲 안에서의 생명 활동도 생각의 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초 쯤에 <논어는 아름답다>에서 읽은 "지금 너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라는 말이 도움이 되었다. 올해도 몇가지 실패를 겪었지만 도전을 해보면서 배운 점이 있었다.
올해 <이이화의 한문공부>를 모두 읽고 논어(민음사)로 한문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이화의 한문공부>의 객관식 연습문제와 몇몇 긴 한문 글은 읽지 않고 넘겼다.

올해 가장 많이 읽은 소설가는 시그리드 누네즈이다. 나는 확실히 잡담 하는 작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비교적 오래전 작품인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들에는 작가-화자의 단상들이 담겨 있다.
작가의 작품은 최근에 <조용한 생활> 팟캐스트에서 올해의 소설로 다뤄지기도 했다. 팟캐스트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 중 내가 주목한 부분은 그녀의 소설들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꽤나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왜 그런건지는 누군가 설명해뒀을 것도 같은데 나중에 찾아 봐야겠다. 팟캐스트에서 다뤄진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은 작가가 꽤나 천착하는 주제이다. 남자가 연상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다루는 걸 꺼리는 이유가 정치적 올바름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어떤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다룬 걸까. 그렇다기엔 2005년에 나온 <그 부류의 마지막 존재>에도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이 등장한다.

<시에나에서의 한달>도 가장 좋은 책 중 하나였다. 다만 읽은지 꽤 지나서 긴 얘기는 못 쓰겠다.

<다시, 피아노>를 읽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로 했다. <다시, 피아노>는 올해 읽은 책 중 확실히 좋았던 책이다. 그외에도 악기 관련 에세이를 몇 권 읽었다. <오후의 기타>, <다시, 연습이다>는 기타 관련 책이다. 원래 자취하면서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했다가 디지털 피아노가 스피커일뿐이란 걸 알고 클래식기타를 시작했다. 그때가 코로나 시기 쯤이었다. 아무튼 <오후의 기타>, <다시, 연습이다>를 읽고 책에 나온 여러가지 클래식 기타 앨범을 들어보는데 감흥이 없는 거다. 기타를 쳐오면서도 피아노 음반만 주로 들어왔다.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배웠던 악기가 피아노이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 쯤 그만뒀는데 잊어먹지도 않아서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특히 <다시, 연습이다>는 클래식 기타 전공자가 기타를 그만두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서, 확실히 클래식 기타를 접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 현악기는 혼자 배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중에 레슨 받을 여유가 되면 현악기도 배워보고 싶다. 그게 클래식 기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피아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을 재미있게 읽었다.

한국 소설 중에는 <이상문학상 2025>에서 알게 된 정기현 작가의 <슬픔 마음 있는 사람>을 재밌게 읽었다. 편집자인 작가가 '세상적인 질문' 처럼 -적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쓰는 게 농담처럼 느껴졌다. 이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노트에 적은 건 '세상적인 질문' 뿐이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남겨진 자들의 삶> 작가님과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다. 줌파 라히리, 곽미성, 존 후퍼 작가의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작년 말쯤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다. 마테오 비앙키 작가에게 사인을 받으면서도 아름다운 책을 써줘서 고맙다고 적어서 작가님에게 보여주었다. 작가님이 기분 좋게 웃으셨던 게 기억난다. 작가님이 사인에서 무언가 써주셨는데 화려한 글씨체 때문에 제대로 읽지는 못했다. 다시 글씨를 파악해봐야겠다.
시그리드 누네즈는 자신의 경험을 적긴 하지만 픽션이 꽤나 들어간다고 말한다. 반면 마테오 비앙키 작가는 거의 본인 경험을 적는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아드리앵 파를랑주와 이수지 작가의 대담도 들었다. 대담을 듣기 전에 두 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었다. 그 중 <봄은 또 오고>는 올해의 그림책으로 남아있다. <100 인생 그림책>과 일생을 다뤘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좀 더 시적이다. 책 속의 구멍으로 기억을 형상화했다.
그외에도 토지문화재단에서 <육두구의 저주> 작가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올해는 해외 작가들을 많이 본 특이한 해年였다.

<우리는 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었을까>에서는 아이들과 몇년간 미술 활동을 하면서 쓴 '관찰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이런 거구나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일본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른 온라인 스터디에 글을 적곤 해서 여기 글을 남길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