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오랫동안 안 쓴다고 글 쓰는 법을 잊지는 않겠지만 영영 글을 안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읽었던 좋은 문장들을 옮겨본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왜 글을 쓸까요?" <쇼스타코비치는 어떻게 내 정신을 바꾸었는가> 154쪽에 소개된 베케트의 말이다. 희망이 사라진다면 영영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그런지 내가 쓴 글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나를 더 잘 보여주지 않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쓰레기는 내 생활을 보여준다).
"실제 구원의 순간은 살아있는 타인이 우리를 보고 이해하고 아직 우리가 구조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에야 비로소 다가오는 것이다."(173쪽) 이 문장을 읽을 때쯤 9월에 끝난 수업에서 봤던 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공감이 갔다. 어떤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다. 최근에 자주 생각하는 도식, '바깥의 햇빛=타인의 눈길<->실내의 어둠=나르시즘'. 지금 살고 있는 곳 옆에 건물이 있어서 방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 아침에 햇빛이 들면 잠에서 깰텐데 그렇지 않아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몇 개월 전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닫고 수업도 취소됐을 때 외부의 자극이 많이 사라졌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야 살아있게 되는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다.
"키츠는 인간이 '초조하게 사실과 이성을 갈구하지 않고서 불확실성, 불가사의, 의심 속에 깃들 수 있을' 때 가장 창조적이라고 생각했다."(113쪽) 이 문장은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 실천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

어제 다 읽은 <런던 거리 헤매기> 중에서 '위인들의 집'이라는 글에서도 키츠가 나온다. 그 중 두 문장. "여기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 그는 미동도 없이 귀를 기울였다. 흠칫 놀라는 일 없이 보았고 그의 시간이 아주 짧았어도 서두르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102쪽) 키츠는 26년간 살았다.
"시행 한두 개를 잘라내어 마음속 깊은 곳에 펼치고는 그것이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물 속에서 다채로운 물고기처럼 헤엄치게한다."(76쪽)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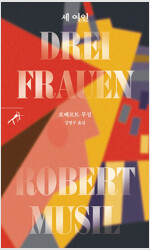
"운명이 침묵하려 할 때는 운명에게 말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다가올 일에 귀 기울여야 한다."(60쪽) 로베르트 무질의 <세 여인>에는 세 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그 중 '포르투갈 여인'에 나오는 문장이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이지만 기억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