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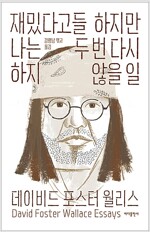

고향 집에 내려 갔다가 도서관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아무튼 시리즈의 비건, 외국어, 술을 빌려 읽었다.
<아무튼, 비건>은 <채식의 철학>에 이어서 채식주의에 관심을 이어가려고 손에 집었다(<채식의 철학>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DFW)의 에세이집에 실린 '랍스터를 생각해봐'와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있다). 나는 현재 기준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그런데 왜 채식주의자의 글에 관심이 갈까. 우선 DFW의 '랍스터를 생각해봐' 각주에 적힌 주소를 쳐서 들어간 동물권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본 동물 가죽을 벗기는 동영상이 떠오른다. 또한, 고향 집이 시골이고 집에 여러 동물들이 있어서 김한민 작가가 말하는 '동물의 얼굴'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어서 고민이 된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개와 관련한 기억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개가 죽임을 당하는 기억이 나에게도 있다.
채식주의자들이 쓴 책에는 '언행일치'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독특한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행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작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흥미롭다(언행일치가 어렵고 드물기 때문에). 채식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애쓰는 모습은 <채식의 철학>보단 <아무튼, 비건>에 더 많이 담겨 있다. <채식의 철학>은 논리를 따라가는 철학서인 반면, <아무튼, 비건>에서 김한민 작가는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채식을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김한민 작가가 '유럽파'라는 점은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또한,<채식의 철학>과 <아무튼, 비건>의 목소리의 열정도 비교해볼만 하다. <채식의 철학>의 토니 밀리건이 육식주의자의 의견도 다루며 육식주의를 온건한 논리로 격파하는 반면, <아무튼, 비건>에서 김한민 작가는 육식주의자의 잘못된 편견을 환경 운동가의 열정적인 어조로 비판한다. 나는 그 열정이 좋았지만, 토니 밀리건은 열정적인 어조를 경계한다. 김한민 작가의 입장에서 한 문장 더 쓰자면,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자가 아주 적은 소수 집단이어서 열정적인 어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무튼, 외국어>는 조지영 작가가 배웠던 언어 중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손에 들었다. <아무튼, 외국어>를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작가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한국어 문장도 독특하다는 점이었다. 쉼표를 많이 쓰고, 문장 구조도 독특하다. 조재룡 교수는 <번역하는 문장들>에서 김승옥이나 배수아 작가의 번역투 문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조지영 작가가 쓴 <아무튼, 외국어>에서도 외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문장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책에서 조지영 작가가 좋아했던 한국 작가들의 목록도 읽을 수 있었다. 독서와 외국어 공부가 작가의 문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참고로, <아무튼, 외국어>에서 영어 이야기는 마지막에 잠깐 나오고, 프랑스어(작가의 대학 때 전공),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야기가 각 챕터를 차지한다. 그래서인지, 아무튼 시리즈의 근간 목록에 <아무튼, 영어>가 있다. 한국인 독자에게 영어는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을 확보할 만한 주제일 수도 있다. <아무튼, 외국어>는 여러 외국어를 '적당히' 배우는 작가의 취미를 다룬다. 조지영 작가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왜 영어에는 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지도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영어가 그저 여러 외국어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술>은 도서관에서 빌릴까 말까 고민한 책이었다. 김혼비 작가의 전작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먼저 읽고 싶었지만, 도서관에 없어서 빌리지 못했다. 비건과 외국어에 비해 술에 관심이 적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맥주를 한 캔씩 자주 마신다.
웃음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술>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다. <아무튼, 술>에는 웃음보다는 웃김이라 표현하고 싶은 진솔한 글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웃김 속에 슬픔과 애환도 담겨 있다. 웃김과 슬픔, 그게 술의 특징 같기도 하다. 애주가이지만 주량이 많지는 않다는 점도 나와 비슷해서 공감이 갔다. 감히 말하자면, 이 책을 읽으며 풍류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독일 아마존 베스트 셀러로 소개된 <어느 애주가의 고백>을 읽고 아빠에게 선물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술>이 훨씬 좋았다. <어느 애주가의 고백>과 달리 <아무튼, 술>은 술을 권하는 책이어서 아빠에게는 전해 줄 수 없다.

<아무튼, 비건>과 짧은 시차 속에 읽다 보니 <아무튼, 술>에 나오는 안주들이 눈에 밟히긴 했다(나도 고기를 먹으면서도). 또한, <채식의 철학>에서 토니 밀리건은 술 속에 담긴 동물 성분을 지적하며 완전 채식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물 성분이 담겼다는 술의 종류는 책을 들춰보고 확인해야 적을 수 있는데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