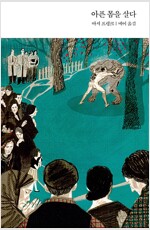이성복 시인의 시론집 세 권을 읽었을 때 반복해서 나온 말이 글을 거창하게 쓰지 말라는 거였
는데, 그 글을 읽고 얼마 후 글을 쓰다가 초반부에 거창한 문장을 적어버렸다. 어제인가 그 표현을 지웠지만 꽤 많은 사람이 읽은 후였다. 내가 쓴 거창한 문장의 일부에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너무 거창하다)이란 말이 들어갔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성복 시인의 조언을 잊어버렸을 테니 좋게 생각하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적지 않다.

이성복 시인은 글을 쓰는 기술보다는 '태도'를 강조했다. 좋은 태도는 한 권의 책만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태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해야겠다. "글쓰기에서 기본이란 '대상'과 '독자'에 대한 배려예요."(<극지의 시> p.135)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이 문장을 자주 생각한다(책 내용은 항상 금방 잊힌다. 그리고 곧 어리석어진다.) 이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은 이유는 내가 타인을 '깔보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인을 깔보는 태도를 가진 글쓴이에게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읽었던 '타자의 탁월성을 인정하라'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타인을 깔보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성찰이 아주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레비나스는 어려울 것 같지만 반드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지인이 (고맙게도) 지적해줘서 내가 대화할 때 공격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대화할 때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 건 분명 공격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소극적인 사람의 공격성은 냉소, 비웃음, 깔보는 태도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건강하지 못한 이 태도를 성찰하고,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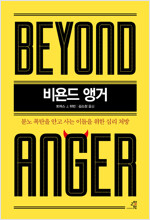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중에게 큰 희망이 없다고 보았다(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극복하려 하는 랑시에르는 대중의 역량을 인정한다). 회사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묶여 지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임금 노예'다. 짧은 여가 시간에 시간을 떼울 수 있는 건 휴대폰과 영상매체 등이다. 주된 관심사는 재산 축적으로 흐른다. 회사원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데, 정규직 중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달가워 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 따르면, 독일 나치는 유태인을 여러 역할로 나누고 차별 대우해서 유태인 지배를 좀 더 손 쉽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사회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각자 도생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적응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비난조의 글을 쓴다면 '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닐까? (무엇보다 회사원들은 고통받고 있고, 정말로 문제되는 구조와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최근에는 퇴사 관련 책이 많이 나오고 읽히고도 있다.) 이성복 시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아프게 하는 글은 쓸모 없다고 했다. 타인이 아니라 내가 아파야 한다고. 다른 얘기지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보면 알라딘 페이퍼를 쓰는 행위 또한 알라딘 마케팅을 돕는 자발적인 복종에 가깝다. 하지만 마케팅이든 뭐든 글쓰기 실력을 늘리려면 실수를 반복하면서 써야한다. 이러한 고민 하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삶과 죽음>을 읽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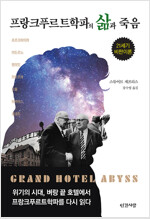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좋아하는 책인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에 나오는 문장이다. 괴테 또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곧 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문장이 떠오른 이유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보는 걸 그만 두고 TV 시청도 웬만하면 줄이자고 최근에 (다시) 다짐했기 때문이다. 위 문장은 '아름다운 걸 보면 의식의 균형을 얻을 수 있다'는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의 내용과도 통한다. '인스타그램 감옥(insta jail)'이란 표현도 있지만, 나는 지금 TV 감옥에 갇혀 있다. 가족들이 항상 TV를 켜놓고 나는 그 곁을 지나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독립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을 밤 11시 넘어서까지 쓰고 있지만,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10시 이후에는 전자기기에 열중하지 않는 게 '의식의 균형'에 도달하는 데 도움된다(너무 꼰대 같은 말인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 보고 살수는 없다. 딴 얘기 같지만 좋은 것만 보면 어리석은 정신승리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인간은 죽고 병들고 타인의 고통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아름다움이란 말에 긍정적인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나의 죽음과 타인의 삶에 성숙하게 다가가는 것도 아름다움의 일부 아닐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글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얼마나 성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임종진의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친구>라는 글에 소개된 '안양숙' 님). 어쩌면 타인과 사물을 우선으로 두고 행동해야만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 얼마 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서 읽은 나쓰메 소세키의 <춘분 지나고까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내적으로만 성찰하지 말고, 실수할지라도 새로운 사람과 사물을 만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아무튼 나도 '스나가 이치조'처럼 고민만 하다가 얼마 후 여행을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