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고 우울한 날이 계속된다. 대선 판도는 안개속이고 과거 프레임에 갇힌 콘크리트 지지율 45%는 도무지 꿈쩍을 할 줄 모른다. 연말만 되면 위촉직 연구원들이 살생부를 받고 떠나가고 남아 있는 자의 미안함과 죄책감에 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쫒겨나가는 자를 울먹이게 만든다. 지난 오년간 매년 반복이다.
최근에는 그야말로 이 책 저 책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잡이로 읽었다. 리스트를 만들고 보니 SF가 많다. 우울한 현실세계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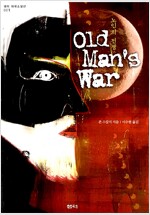


"75세 생일에 나는 두 가지 일을 했다. 아내의 무덤에 들렀고, 군에 입대했다."
너무나 매력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존 스칼지의 3부작이다.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발상도 재미있고..
미래를 낙관하며 기술에 의해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기반으로 하는 Trans-humanism 적인 배경을 깔고 있으나 결국 인간적인 인간으로 돌아오는 네오휴머니즘으로 시리즈를 마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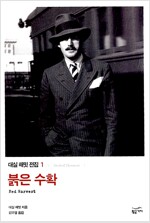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들때는 하드보일드 누아르 작품들이 도움이 된다. 붉은 수확은 제목 그대로 피가 너무 많이 튀고, 런던 대로에서는 책읽는 터프가이라는 양면성에 매혹된다. 현실성이 결여된 극도의 데카당한 이야기지만 묘하게 매력적인 전개였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겯들인 문장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원작을 먼저보고 영화를 봤는데 설정은 달랐지만 영화는 또 영화대로 내가 좋아하는 키이라 나이틀리와 콜린 파렐의 앙상블이 괜찮았다. 아버지들의 죄에서는 로렌스블록을 오랜만에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안이한 작품의 단점을 덮어준다.



두권 다 어릴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살인자들의 이야기라서 시대 배경도 다르고 작가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게다가 책 표지에서의 느낌도 비슷하다.
다음 시리즈에 주인공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게 만든다.
ps. 회사에서 틈틈이 썼던 글인데 집에 가서 보니 내가 읽은 책은 <라스트 차일드>가 아니라 <차일드 44>였다. 읽은 책 제목도 모르고 헐... 그래도 붙여 놓고 보니 표지의 느낌은 여전히 비슷하다. 이번 주말에는 <라스트 차일드> 읽어봐야겠다. ㅎㅎ


하루키의 에세이는 시대를 초월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다. 80년대 씌여진 글들인데도 전혀 고루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른 얘긴데. 나는 하루키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뜨거운 일본식 고로케가 먹고 싶어진다.


아마도 당분간은 어슐러 르귄에 빠져 있을 듯하다. 헤인 시리즈의 첫권 로캐넌의 세계. 단편 셈레이의 목걸이에서 시작된 이 시리즈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할런지 생각만 해도 즐겁다.
"이토록 멀리 떨어진 세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실과 전설을 구분할 수 있을까"로 시작되는 첫 문장에서 "로캐넌의 세계라고 명명되어진 것을 그는 알지 못햇다."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은유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면서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당을 선호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읽었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는 그 이유는 알게되었으나 고쳐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가치관에 따라 투표한다는 거. 가치관은 프레임이라는거. 결국은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