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험, 우정, 용기, 사랑, 정의, 영웅,, 잊혀져가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국경을 건너간 소년의 매혹적인 이야기다.
무뚝뚝하고 쿨한,, 하지만 따뜻한 인간애와 로맨틱한 감성을 지닌 존그래디콜. 현실주이자면서 측은지심을 지닌 롤린스. 이 둘의 모험은 '내일을 향해 쏴라'의 비극적 주인공들을 연상시켰다.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긍정성을 보여준다. '로드'에서 그러했듯이 코맥 매카시의 글은 텍스트로 읽히기보다는 하나의 영상으로 눈앞에 떠오른다. 간결하고도 심오한,, 하지만 유머러스한 문장. 역시나 최고다.




인물들의 심리묘사와 스피디한 전개가 너무나 탁월해서 그동안 내가 왜 스티븐킹을 멀리했나 싶다. 하지만 총 6권 중 3권까지는 순식간에 읽어버렸고 4권부터 머뭇거리고 있다. 이주일째 한장도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 휴가가 끝난 탓도 있겠지만 이 이후에 벌어질 악과의 전면전이 별로 땡기지 않는 듯 하다. 그냥 어찌어찌 살아남은 자들이 마더 애비게일에게 도착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잘살게 되었다로 마무리되었으면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어찌 그런가.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사회학자의 말대로 인간은 3명 이상이 모이면 계급이 생기고 제도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읽는 동안 어떤 영화가 생각났는데.. 가물가물 제목이 생각 안나다가 검색해보니 '페이첵'이었다. 페이첵은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다는 설정인데, 이 책에서도 과거의 나의 습관이 현재의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암튼 거대한 시스템적인 악에는 대항이 어려우니 그저 도망가서 살아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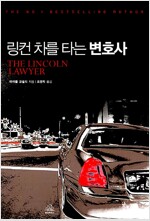
여름 휴가는 마이클 코넬리와 함께 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한권밖에 읽지 못했다. 낼름 다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의뢰인을 보면 자동적으로 견적이 나오는 LA 변호사 할러에게 "결백한 의뢰인"이 나타난다. 결백한 의뢰인은 타협이란 없다. 무죄 아니면 유죄. 유죄가 되면 엄청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니 무조건 이겨야 한다.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설정으로 인해 초반의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하지만 할러의 투덜투덜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름 휴가는 무조건 데니스루헤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규칙이 어느 해 인가부터 생겼다.
이 책은 갱단의 한바탕 전쟁이야기다. 거기에 정치권력이 개입되어주시고..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에 대한 루헤인의 고민스러움이 묻어난다. 이도 저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라고나 할까..
켄지&제나로 시리즈의 1편이라니 기대를 많이 했다. 켄지군의 블랙유머들은 좀 억지스럽고, 캐릭터들도 완전히 구축되기 전이라 뭔가 아쉽다. 특히 제나로양은 아직 제 역할을 찾지 못한 듯하다. 이후의 시리즈들에서 더 완성되어갔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암튼 1편을 먼저 봤다면 그 이후 시리즈들은 보지 않았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