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서점에 갔더니 신간 중에 눈에 확 띄는 표지와 제목을 단 이런 책이 보였다.
<가지와 함께 홀로 부엌에서>
부제: 혼자 요리해 먹는 일에 대한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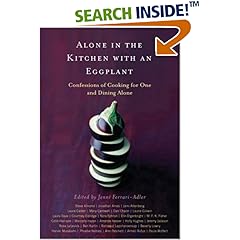
스물 여섯 명의 작가, 요리사, 음식 비평가들이 각자 혼자 요리하고 먹는 일에 대한 일화를 적은 짧은 글이 모여 아주 재미난 책을 만들었다. 잡지 뉴요커에 번역되어 실렸던 하루키의 "스파게티의 해"를 제외하면 전부 에세이들이다. 문예창작과정을 밟으러 뉴욕시에서 날씨 쌀쌀한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원으로 이주한 여학생이 매일 혼자 끼니를 떼우는 일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책이다.
혼자 끼니를 떼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 일인분을 용감하게 주문하고 느긋하게 즐길 용기가 있으신지?
혼자만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노동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혹은 아무에게도 털어놓기 곤란한 희한한 조합의 음식을 모처럼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에 설레이시는지?
그저 아무거로나 대충 허기를 잠재워도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시는지?
아무래도 먹는 일은 혼자 하기에는 김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종류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작년에 작가 황석영씨의 <맛과 추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 이야기를 털어놓는 작가의 즐거운 목소리가 왠지 그 때까지 내가 작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뭔가 엄숙하고 절제된 이미지와 맞아떨어지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먹는 일만큼 삶을 잘 요약하는 행위가 있을까? 먹을 것을 고르는 손에는 과거의 기억이 묻어난다. 종종 우리에게 특별한 음식은 단순히 그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접하던 때의 기억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일식집에 갔다가 에피타이저로 나온 구워진 작은 물고기를 보고 망연자실했었다. 뉴욕의 일식집에서 특별한 메뉴로 소개된 그 물고기는 다름아닌 양미리였다. 강원도 출신인 아버지가 겨울이 되면 양미리 좀 만들라고 어머니를 다그치시곤 했던 그 양미리다. 양미리는 사실 보잘것 없는 물고기다. 대구처럼 국물이 시원한 것도, 고등어처럼 잘 생긴 푸른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치처럼 살이 맛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양미리를 고집하셨다. 양미리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특별히 늦둥이 막내 아들을 위해 차려내던 음식이었는지도 모른다.
먹는 일이 이렇게 기억과 촘촘히 엮이므로 먹는 일 만큼은 즐겁게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즐겁게 먹는다는 건 꼭 특별한 것을 먹어야 한다거나 대단한 격식을 차려서 먹어야 한다거나 꼭 여러 사람과 떠들썩하게 한 상에 앉아 끝내주는 대화를 나누며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혼자 먹건 여럿이 먹건 특별한 음식이건 아니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위장의 허기 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