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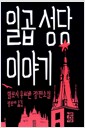
-
일곱 성당 이야기
밀로시 우르반 지음, 정보라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6월
평점 :



《일곱 성당 이야기》

이 소설은 출간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1990년대 말 체코의 베스트셀러 였다고 한다. 실은 이전에는 체코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움베르트 에코에 대한 체코의 답변>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기에 또한 고딕 문학을 크게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많은 기대를 안고 읽게 되었다. 이 소설을 읽고 난 느낌은 뭐랄까, 고딕 스릴러의 특징이라고도 하는 음산함, 무거움, 기묘함, 잔인함 등이 한꺼번에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영어권의 사건과 속도감, 반전이 특징이 스릴러 소설들을 주로 읽다가 접한 이 소설은 정말 색다른 느낌 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기대와는 달리 소설을 읽기는 참 어려웠다. 앞서 말한 대로 속도감에 익숙해진 탓, 그들 역사에 대해 잘 몰랐던 탓에 책장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읽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대단한 것은 어려웠지만 끝내 손에 놓을 수는 없게 만든 소설이랄까? 소설에서 묘사하는 체코의 건물, 거리, 특히 성당과 과거 역사에 대한 묘사들은 기본 지식이 없는 나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인터넷을 뒤지며 언급된 성당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하고, 체코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며 읽어야 했기에(그럼에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했던) 흐름이 많이 끊기기도 하고, 주인공의 가장 큰 특징인 <건물에 손을 대면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 도 환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바람에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K라 불리기 원하는 경찰이며, 등장인물들은 모두 독특하고 기괴하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만일 영화로 만들어 졌다면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일 테지만 귀에 진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K의 상사라든지, 키가 작고 등이 굽은 프룬슬릭이나 그와 반대로 거인처럼 생긴 남자 그윈드의 대화나 모습에 대한 묘사 등 또한 흐름을 따라가는데 참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소설 초반부 아버지와 주인공이 함께 성에 가는 장면 등은 과연 이 소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책을 다 읽은 후에 <옮긴이의 말>을 읽으며 어느 정도 걷어 낼 수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다.
프라하에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발목 인대에 밧줄을 꿰어 종에 달아놓기도 하고, 다리를 찢어 높은 곳에 달아놓기도 한다. K는 자신이 보호하려던 사람이 살해당하자 결국 경찰을 그만둬야 했지만 좀 전에 언급한 거인 그윈드의 요청으로 이 사건들에 깊숙이 개입하며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자꾸만 살인은 벌어지고 단서는 그 사람들이 살해 당하기전 창문으로 날아든 돌맹이. 그러나 자신도 몰랐던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고 서서히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결말은 생각했던 방향과 달랐다. 아슬아슬하고 섬뜩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다 작가는 결말 부분에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숨겨 놓은 것이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여름에 읽기에 딱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음산하고 엽기적인 고딕풍의 소설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소설을 참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다만, 만일 나처럼 아무런 지식 없이 이 소설을 읽다보면 중간에 지쳐버릴 지도 모르니 꼭 소설의 맨 뒤에 있는 <옮긴이의 말>을 먼저 읽고 난 뒤 읽기를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체코의 역사와 가톨릭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만일 내가 그럴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읽지는 않았을 거란 아쉬움이 많이 든다. 소설은 추천할 만하다. 내가 이렇게 혹평으로 보이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재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게 읽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소설 장르의 특성한 자세한 이야기를 쓰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만 한다면 아주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