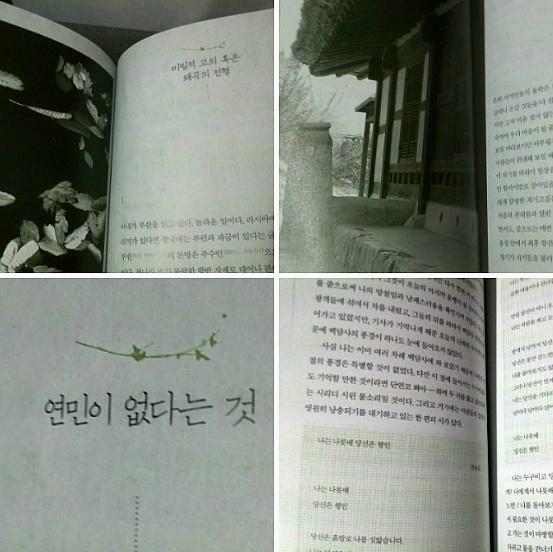-

-
연민이 없다는 것
천정근 지음 / 케포이북스 / 2013년 12월
평점 :



《연민이 없다는 것》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필집인지 알았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생각했던 그 가벼움과는 뭔가가 다름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보았다. 그리고 문득 삶의 출구를 찾아 러시아로 도망치듯 날아간다. 거기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얻었고, 모태신앙이었으나 나중에 합동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성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전에도 종교색이 짙은 수필집, 혹은 잠언 집, 명상서적들을 읽어왔는데 내게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큰 부담 없이 읽어왔고, 각각의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은 그런 종교 색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접했는데, 종교 색을 가진 수필이었다. 그래서 실은 처음에 몇 장, 조금은 책장을 넘기기가 망설여지기도 했다는 고백을 한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하고픈 말은 종교에 편견을 가지지 말자는 다짐이 아니었다면, 이 보물을 놓칠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저자의 젊은 시절의 삶은 과거의 나의 삶과 닮았다. 그의 모스끄바에서 살던 이야기들은, 특히 그의 우울한 독일 친구의 이야기는 정말로 빛 한줄기 보이지 않는 암흑 같았다. 나는 감히 그런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적은 없지만, 깊은 좌절과, 떨쳐낼 수 없는 인연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다. 그러다가 또 분위기기 바뀌어 아내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형적인 이 시대의 중년 남편들을 보는 것처럼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생활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면 그 누구와라도 행복했을 것> 이런 말엔 정말 웃음이 절로난다. 남편의 기를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만일 이 책이 수필이 아니라 작정하고 써 낸 글이었다면 이런 식의 속내를 다 꺼내 보이는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을 다듬어 책에 실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저자에게 인간적인 어떤 고매함을 느낀다. 가식이 없고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이는 삶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공>이라고 생각한다.
에피소드마다 성서의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말했듯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었지만,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저 그는 자신의 <고해성사>로써 성서의 글들을 인용하며, 그 해석도 오로지 믿음으로써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이므로, 현 세대, 정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정치 이야기는 민감할 법도 한데 이 시각도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젊은이, 뭔가 간절히 원하고 갈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그가 공부한 러시아 문학과 그 작가들과 우리나라의 작가와 작품, 역사에 대해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선입견, 편견들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 내 그릇을 넓히는 데 어떤 식으로 방해가 되는지 알 수 있게 한 고마운 책이다. 특히 요즘은 종교와 정치의 색깔, 성향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가고,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며 얼마나 대화하기를 거부하는지, 사고를 간편하게 하려고 얼마나 각각의 색깔을 가르려 하는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 라고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 책 <연민이 없다는 것>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등불이 되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인으로써 그의 모습이 같은 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줄 것이고, 종교가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솔직한 이야기들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배운' 사람들에게 겸손과 행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날카로운 이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삶과 사람과 자연과 동물에 대한 <연민>, <사랑>의 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우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