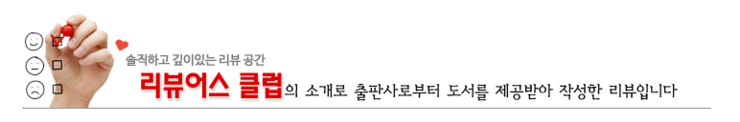-

-
파과
구병모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4월
평점 :

품절

《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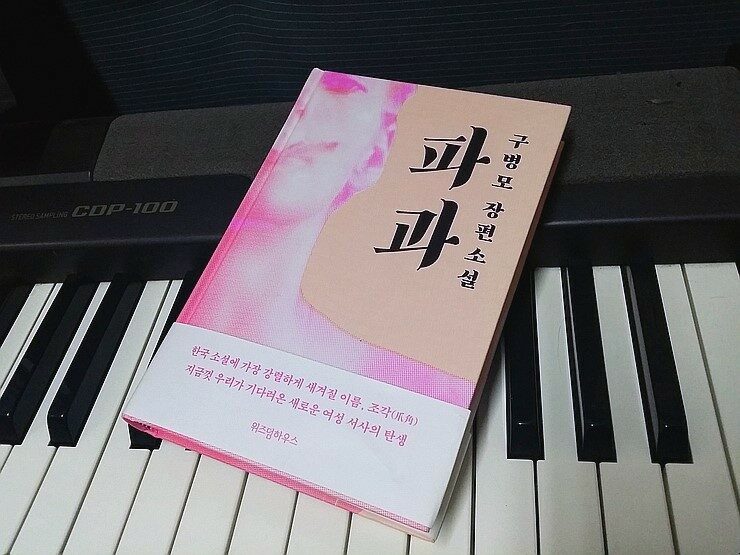
모든 지는 것, 바래는 것은 슬프다. 붉은 빛이 돌던 내 얼굴이 주름지고 칙칙해지는 것도 늙은 고양이의 털이 빠지고 빤짝거리던 눈빛이 흐려지는 것도, 오래된 가구들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고장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슬프다.
마흔 줄에 접어들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일에서 자꾸만 뒤쳐지는 것과 퇴물이 되어가는 것, 트렌드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는 나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일반적으로 마흔이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인데 나와 동료들은 세월을 앞당기고 있다.
구병모의 소설《파과》의 주인공 ‘조각’은 60이 넘은 여성 킬러이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킬러, 여성, 60대. 조각은 그 연령대의 여성에게 가장 보편적인 헤어스타일과 옷을 입고 어디에 서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배경에 녹아들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간다. 소설의 첫 장면은 그래서 너무나 강렬하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할머니의 지하철 임무수행 장면은.
소설 속 킬러의 일은 또 얼마나 일상적인가. 업자들이 행하는 일은 ‘방역’이라 표현된다. 출처가 보호된 일이 비밀이 보장되어 업자들에게 전해지면 업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의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누군가의 필요로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면 업자들은 ‘방역’을 할 뿐이다. 그러니 조각처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는 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이가 있었지만 가족은 그녀를, 그 시대엔 늘 그러했듯이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친척집에 식모로 보냈고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집을 나왔고 또 어떻게 하다 ‘류’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파트너가 되어 이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심을 받는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녀, 늘 무심하고 냉혹하게 신변을 정리하며 살아오던 그녀에게 ‘투우’라는 어린 업자의 도발은 조각을 긴장하게 하고, 우연히 위기의 순간에 만난 의사 강 선생도 그녀의 일상에 조그만 파문을 던진다. 그리고 소설은 투우의 과거를 보여주며 투우의 행동에 위기감을 조성한다.
조각의 흔들리는 눈을 잡아낸 투우, 조각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미끼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한다. 소설의 클라이맥스인 이 대결 장면은 소설의 첫 장면이상으로 강렬하다. 60대 중반의 늙은 여인의 처절한 액션, 젊은 킬러와 벌이는 피 튀기는 대결 장면은 뭐랄까, 거룩하고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회의 악이다. 돈이면 누구든 죽여주는 끔찍한 사람이다. 그런 조직도 그런 일을 의뢰하는 사람도 모두 그렇다. 그러나 그녀를 응원했다. ‘다녀, 온다.’ 라는 그녀의 말을 응원했다. 한 때는 먹음직한 과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허물어져 과일이었던 사실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처럼 사그라질 그녀의 삶이 나의 삶과 오버랩 되었기 때문일까.
사라지는 것은 슬프다. ‘언젠가는 사라질 삶이라서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걸까. 구병모의 소설을 연달아 두 편 읽었다. 《아가미》와 《파과》. 작가 특유의 문체인 듯 길게, 길게 늘어지는 문장들은 언제나 따뜻하다. 작가의 상상력도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눈도, 아픔과 슬픔, 절망과 희망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작가의 글이 너무 좋다.
이름 때문에 그를 남성이라 오해한 것이 조금 미안하다. 76년생, 나보다 2살 많은 언니다. 언니의 삶도 응원하고 싶다. 이런 좋은 소설을 계속 써 주면 좋겠다. ‘조각’처럼 기억하고 바래지고 흩어질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