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함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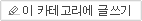
김여흔
( )
l
2004-01-14 10:15
)
l
2004-01-14 10:15
| 홍화씨님께서 2003-09-17일에 작성하신 "2003년 9월 2일, 화요일-하루 종일 비가 오다, 착잡하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
|
|
|
|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주)**과의 일을 정리하고 진안으로 옮기는 짐을 싣는 내내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다행히 오전 안에 짐을 정리하고 춘천을 떠날 수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밑반찬과 김치를 챙기러 집엘 들렀다. 걱정스런 얼굴을 하는 아내를 일별하고 하고 지호에게 인사를 했다. 지호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외면하고 손사래만 쳤다. 수연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차에 올랐다.
자! 이제 출발이다. 중앙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비는 더욱 맹렬하게 나리시고 차안에 탄 일행(최용재, 정기석, 하지혜, 나)은 모두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없다. 가슴 속에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이리라. 어색한 분위기를 깨 보려고 농을 했다. 반응이 시큰둥하다. 조수석에 앉은 기석 씨에게 신나는 음악을 주문했다. 우연치 않게 흐르는 첫 곡은 ‘What a wonder world'다. 굵직한 목소리가 가슴을 때린다. 음악이 흐르자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는다. 빗방울은 더욱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있는 듯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 그래!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거야. 중앙고속도로를 벗어나 영동으로 접어들었다. 오늘 새벽까지 석별의 술잔을 돌린 두 사람(기석, 지혜)은 잠이 들었다. 함께 자리에 있었던 영표 씨가 걱정이 되었다. “운전 괜찮니?” 전화로 확인을 하고야 안심이 된다. 운전은 괜찮은데 기름이 떨어졌단다. 쫄쫄이 굶으면서라도 함께 하자던 약속들이 실감났다. 다들 주머니에 현금은 물론 카드도 없는 듯 하다. 이제부터 굶는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렇기는 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개월째 급여를 못 받아 식구들은 카드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아내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사 비용도 없이 덜렁 짐을 싣고 이주를 감행하는 우리가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지?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뿐이다. 아직 일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같이 이주하지 못하는 정식 씨를 포함해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무사히, 잘 적응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두루두루 전화를 주고받고 시덥지 않은 잡담을 몇 마디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한 오창휴게소에 도착했다. 세대로 나누어 두어 시간 전에 출발한 식구들 얼굴이 그새 반갑다. 주머니를 탈탈 뒤져도 점심 값은 없었다. 박흥민 씨 카드로 계산을 하고 눈물 젖은 점심, 황태 해장국을 먹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고 마음도 착잡하기 그지없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자판기 커피를 한잔씩이라도 마시자는 제안을 못들은 척 하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차는 진안으로 향했다. 극도로 긴축하지 않으면 앞날이 어둡다. 진안에 거의 도착할 즈음 반가운 전화 한통이 왔다. 몇 해 전에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은 재혁이다. “행님요 어디만치 왔소?” 경상도 사투리가 정겹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온다고 마중을 오는 중이란다. “얼릉 얼릉 어서 오이소~” 가까운 곳에 지인이 있어 마중 나온다니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드디어 진안. 능길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은 빗속에 조용히 앉아있다. 환영의 플래카드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고즈넉하다. 이삿짐을 모두 내리고 차가 춘천으로 떠났다. 온 길을 되짚어 가려면 밤이 되어야 가능했기에 서둘러 떠나는 기사 아저씨를 배웅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능길마을 사람이 되는가 싶다. 사무실로 쓰기로 한 공간은 아직 정리가 안돼 폐교 현관을 대충 치우고 짐을 쌓았다. 각자의 숙소를 배정하고 개인 짐을 정리하기로 했다. 2·30대가 한방을 쓰고 지혜 씨가 방을 따로, 40대가 또 다른 한 방을 쓰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고 식당에서 마련해준 칼국수를 먹었다. 재혁 씨 일행을 보내고 회의를 했다. 진안에서의 첫 회의. 다들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표정들이 밝다. 식사 당번을 정하고 몇 가지 규칙을 만들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번 주에는 지혜 씨와 민종 씨가 식사 당번을 하기로 했다.
본사에 대한 불만도 몇 가지 토로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다짐을 할 즈음 누군가 문을 노크 했다. 박천창 씨다. 마을 대표로 많은 일을 챙기는 그이가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숙소에 온 것이다. 앞으로 진행 할 몇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잘 해봅시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사를 하고 하루 일정을 마쳤다.
담배 한대씩을 물고 밖으로 나왔다. 그새 비는 어느 정도 멈추고 구름 속에 희부연 달빛이 보인다. 담배를 살 돈도 없어서 겨우 남은 담배 몇 개비를 나누어 들고 길게 연기를 내 뿜었다. 박흥민, 정기석, 최용재, 정기남, 김민종, 홍영표, 하지혜, 아직 오지 않은 김정식, 그리고 나. 어렵고 힘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리라.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지친 걸음 서로 부추기며 이 길을 가리라. 마주 쥔 두 손에 힘을 주어 서로를 챙겨 주며 끝까지 가리라.
한참을 서성이고 있어도 아직 저녁 8시다. 시골의 밤이라 더 길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능길에서는 술을 자제 하자는 약속을 슬그머니 어기고 싶은 마음이 다들 들었던 모양이다. 흥민 씨가 약술이라도 한잔 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자귀나무 뿌리로 담근 약술인데 혼자서는 두 달 동안 복용 할 양이란다. 며칠 무리해서 컨디션이 말이 아닌 기석 씨를 제외 하고는 다들 싫지 않은 표정이다. 간단한 안주에 약술을 놓고 둘러 않았다. 이런 저런 얘기로 꽃을 피우며 밤이 깊어갔다. 두달치 약이 다 떨어질 즈음 12시가 되었다. 이젠 내일을 위해 잠을 자 두어야 하겠다.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능길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 |
김여흔
( )
l
2004-01-13 13:09
)
l
2004-01-13 13:09
| 홀씨님께서 2003-09-04일에 작성하신 "마을에 왔습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
|
|
|
|
마을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 ( http://www,nungil.org ) 이지요.
하루종일, 사무실(아마도, 옛 능길초등학교 교무실 자리..) 대청소, 자리배치,
방 배치, 각자 짐 정리를 하고,
막, 인터넷세팅까지 마쳤습니다.
밥도 2끼째 해먹었습니다.
이번주 밥 당번은 하지혜, 이민종입니다.
나는, 그새 별명도,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에서,
어이, '난장이'로,
이제는, 그냥 '난장'으로 진화했습니다.
늘, 자리와 술잔을 비워두겠습니다.
언제든, 마을에 와서,
자리와 술잔을 채워주기 바랍니다.
* 늘, 생필품(=주류, 담배, 그리고 쌀과 각종 반찬류 등)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9명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올때 챙겨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