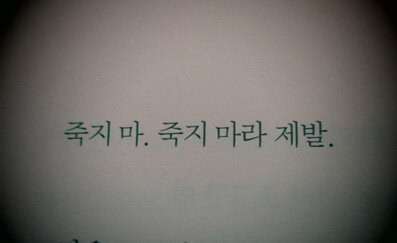흰 : The Elegy of Whiteness
흰 : The Elegy of Whiteness
한강 차미혜 사진
난다 2016년 05월 25일
하얀 개
집을 나가 왼쪽으로 꺾어서 잠깐 걸으면 오른쪽에 대중목욕탕이 있고 그 옆에는 집이 몇 채 있다. 대중목욕탕을 지나고 첫번째 집을 지나가면서 대문 밑으로 얼굴 내민 하얀 개를 보곤 했다. 개를 싫어하지 않지만 짖으면 무섭다. 그 하얀 개는 짖지 않았다. 그저 대문 밑으로 바깥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바깥이 보고 싶었던 건지도. 오랫동안 하얀 개를 보았는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다. 길을 지날 때만 잠깐 만난 개가 보이지 않아도 쓸쓸한데 오랫동안 함께 살던 개가 세상을 떠나면 더 슬프겠다.
하얀 밤
해가 지면 땅에는 어스름이 내리고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진다.
어느 저녁, 해가 졌는데도 창 밖이 캄캄하지 않고 밝았다. 아니 하얬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하얀 밤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하얀색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주 짧았던 건 아니지만, 조금 뒤 본래 밤으로 돌아왔다. 하얀 밤이었던 날,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했다. 날마다 찾아오는 밤과 아침이지만, 가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가끔이겠지.
하얀 달
어릴 때 어두운 밤을 무서워했던가. 밤이 오는 걸 아쉬워했던 것 같기도 하다. 밤이 오면 자야 했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지만, 밤에 자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는 달빛을 느낄 수 있었다. 어두운 밤에 보름달이 뜨면 그 빛만으로도 밤길이 무섭지 않았다. 보름달이 떠서 밤길을 걸은 건 아니고, 밤길을 걷다 다른 날과 다르게 밝아서 ‘오늘은 보름달이 떴나보다’ 했다. 난 그 밤에 어딜 간 거지. 먼 곳에 간 게 아니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온 걸지도.
밝은 낮과 다르지만 보름달이 뜬 밤에는 모든 게 잘 보였다. 해는 사물에 빛을 쏘아 흩어지게 하지만, 달은 사물을 빛으로 감싼다. 달이 빛나는 건 해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얀 비둘기
자주 본 건 아니지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하얀 비둘기를 많이 날렸다. 하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지. 그 하얀 비둘기는 어디에 있던 걸까. 평소에 보는 비둘기는 거의 잿빛이다. 그런 비둘기는 공원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군가는 아주 많은 비둘기를 하늘 쥐라고 했다. 살이 많이 찐 건 닭둘기라고 하던가. 하얀 비둘기는 잿빛 비둘기보다 드물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지, 따로 하얀 비둘기만 모아서 기르고 행사를 치렀는지도.
마술사는 하얀 비둘기로 마술을 부린다.
오래전에는 비둘기를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지금은 사라진 전서구. 하루키는 1980년대에 전서구를 보았다니. 그게 그때도 있었나보다.
하얀 나비
사람이 죽으면 하얀 나비가 된다고 한다. 죽은 사람 혼이 살짝 하얀 나비 몸을 빌려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걸지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하얀 나비를 죽은 사람 혼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엄마 무덤에 날아온 하얀 나비를 엄마로 믿었다. 엄마 품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 아이는 하얀 나비를 보고 ‘엄마, 엄마’ 외치다 비탈에서 미끄러지고 정신을 잃었다. 아이는 꿈속에서 하얀 나비가 엄마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흰 눈 사이로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를 찾아다녔다. 여자와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편안했다. 남자는 그런 날이 오래오래 이어지리라 여겼다. 여자를 만난 겨울이 가고 많은 것이 깨어나는 봄이 왔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봄이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과 반대로 여자는 시들어갔다. 얼마 뒤 그 날이 찾아왔다. 남자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단지 여자가 자주 앉던 흔들의자 밑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남자는 물웅덩이가 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물웅덩이가 모두 사라진 날 남자는 여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남자는 그만두지 않았다.
겨울, 큰눈이 내려 길도 없는 산 속으로 남자는 들어갔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산 속 깊은 곳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산 속으로 걸으면서 찍은 발자국은 곧 흰 눈에 덮였다. 남자는 여자를 만났을까.
희선
☆―
삶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짖눈깨비. 이마를, 눈썹을, 뺨을 물큰하게 적시는 진눈깨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걸을 때,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것.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 눈을 감아도 떠도, 걸음을 멈춰도 더 빨리해도 눈썹을 적시는, 물큰하게 이마를 적시는 진눈깨비. (<진눈깨비>, 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