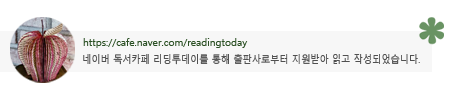-

-
올리버 트위스트 ㅣ 찰스 디킨스 선집
찰스 디킨스 지음, 황소연 옮김 / 시공사 / 2020년 3월
평점 :




올리버 트위스트 ㅣ 찰스 디킨즈 ㅣ 황소연 옮김 ㅣ 시공사
"제발, 나리, 조금만 더 주세요."
"뭐라고?"
"제발요, 나리."
내가 기억하는 올리버 트위스트는 바로 뮤지컬 영화였던 <올리버>였다. 올리버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난다. 순수하고 착하면서도 기품있는 태도의 올리버는 배역에 아주 딱 떨어지는 캐스팅이었다. 1968년에 제작된 <올리버>는 몇 살에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화면의 어느 곳을 봐야할지 모를 정도로 내 정신을 쏙 빼놨었다. 당시 뮤지컬 영화라는 것도 모르고 봤었는데 중간중간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은 굉장히 재미있었고 인상적이었다. 소매치기들이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을 앞장세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런던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한편으로는 진정성있는 올리버의 태도를 믿고 그를 구하려는 이들의 대비되는 이야기는 영화를 보는 나에게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찰스 디킨즈의 나이 스물다섯 살에 쓴 소설이라고 하니 사회를 보는 시선이 남달랐던 작가인 듯하다. 자신의 나이 열두 살 때 디킨즈는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아동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산업화의 폐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아동들의 현실에 눈을 뜬 것이다. 풍요로움 뒤의 그늘 속에 방치된 이들의 상황에 대해 저자는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빈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데 올리버가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없이 죽 한 그릇을 더 요구했다가 일주일동안 어둡고 외로운 방에 죄수나 다름없이 갇혀 지내는 일화는 어쩌면 사실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 가려는 방문객은 미로 같은 답답하고 비좁은 진창길을 통과해야 한다. 가장 거칠고 가장 가난한 강가 주민들이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거리마다 모여 있다. 가장 싸고 가장 저급한 식료품들이 가게 안에 쌓여 있고, 가장 거칠고 흔해빠진 옷들이 상점 문 앞에 걸려 있거나 상점 난간과 창문에서 나부낀다. 빈둥거리는 최하층 노동자들, 바닥짐 나르는 인부들, 석탄 운반부들, 노골적인 여자들, 헐벗은 아이들, 강가 폐기물과 쓰레기를 헤치면서 힘겹게 나아가다 보면, 좌우로 뻗어나간 비좁은 샛길의 불쾌한 광경과 냄새에 습격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모퉁이마다 우뚝 선 창고에서 물건을 잔뜩 싣고 덜컹대며 나오는 육중한 수레들의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다. 그러다 비교적 더 외지고 한적한 거리에 겨우 도달하면, 무너질 듯 인도를 침범한 집의 현관들, 지나갈 때 허물어져 내릴 듯한 부서진 벽들, 반쯤 무너졌으나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저하는 듯한 굴뚝들, 시간과 오염에 거의 삭아버린 녹슨 쇠창살 창문들 등 황폐와 방치가 갖가지 양상으로 구현된 풍경이 펼쳐진다."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영국의 빈민층의 어려움은 심각했기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알리는 것, 이것이 디킨즈 스스로가 내걸은 자신의 사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찰스 디킨즈가 올리버 트위스트를 쓰게 된 배경은 어쩌면 위의 문장 속 영국의 그늘을 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영제국에도 역시나 하층민들은 있었고 찰스 디킨즈의 눈에 그들은 안쓰럽고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작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올리버트위스트> 안에는 지금도 드라마에 자주 등장되는 출생의 비밀과 권선징악, 빈부격차라는 큰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등장인물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장착하고 있다. 혈혈단신이었던 올리버가 어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해 희생되는 상황에서 선과 악이 대치하며 영국사회의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올리버트위스트는 어른이나 어린이가 함께 보는 동화처럼 안타깝지만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