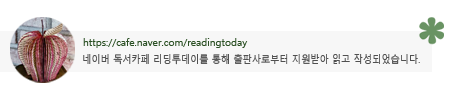-

-
페스트 - 인류의 재앙과 코로나를 경고한 소설, 요즘책방 책읽어드립니다
알베르 카뮈 지음, 서상원 옮김 / 스타북스 / 2021년 1월
평점 :




페스트 I 알베르 까뮈 I 서상원 옮김 I 스타북스
"재앙이란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 즉 허구이다. 하지만 소설이 허무맹랑하지 않은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 때문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썼다면 리얼리티가 높아지므로 진정성을 갖추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는 유럽에서 실제 있었던 재앙이었고 20세기 중반에 다시 페스트가 온다는 설정 아래 쓴 소설이라서 매우 리얼하다. 더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회의 변화들은 <페스트> 속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 않아 큰 공감과 연대감이 높아지는 느낌이다. 지구가 변하고 각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세상이다. 서로를 경계해야 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장거리 이동을 피해야하는 등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지금, <페스트> 같은 소설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소설이 필요할까 싶다.
페스트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바이러스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참 나약하게 비춰졌다는 것이다. 사망자가 늘어가고 필수품들을 사기 어려워지며 불을 지르고 시시각각 보도되는 뉴스들 때문에 고조되는 불안감 등은 마치 디스토피아 세상을 연상케했고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다라는 슬픈 예감이 들었다.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으면서 참 무섭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디스토피아 소설의 작가들 때문에 우리들은 한 번 더 인류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줬던 것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전과 다른 감정선을 지니고 있다면 추천하고 싶다, <페스트>를.
<페스트> 속 인물들을 통해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부인의 요양을 위해 멀리 보내고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의사 리외,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신부,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를 위해 폐쇄된 오랑 시를 탈출하고자 애쓰는 기자 랑베르 등 다양한 입장과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은 무서운 연대감을 불러온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저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소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페스트 속에서 발견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팬데믹 사회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정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페스트가 모두에게서 사랑의 힘과 우정의 힘까지도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랑은 약간의 미래를 요구하는데 우리에게는 순간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이 점차 변하고 페스트로 사망자가 나와도 그저 지나갈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시가 폐쇄가 되자 어떻게든 시를 벗어나고자 애쓰는 모습들은 비난을 면치 못한다. 또한 팬데믹 세상에서 종교는 큰 몫을 한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버티게도 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는 찬밥신세로 전락한다. 홀로코스트 속 희생자들의 한탄 속에서도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 종교조차 인간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아 놀랍기도,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시대를 불구하고 인간에게 내려진 재앙 앞에 한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끄러워지는 대목이었다.
<페스트>는 큰 공감과 연대감을 주지만 사실 두려움도 함께 던져준다. 이러한 두려움은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가 바라보는 미래가 일치하는데서 오지 않나 싶다. 고전은 괜히 고전이 아니며 고전 작가들은 우리에게 그저 소설가가 아닌 예언가처럼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으며 우리에게 반드시 메세지를 준다는 점이 고전을 읽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어 새삼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