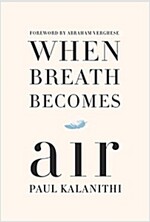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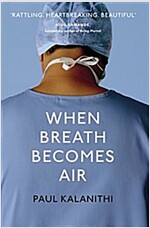
서른 여섯 살, 신경외과 레지던트인 폴 칼라니티는 폐암 4기 선고를 받는다. 얼마간은 치료 효과가 있어 종양이 더 자라지 않고 조절되는 듯했지만, 곧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저자는 투병 중에 태어난 어린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첫 책이 출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책이 나왔다.
출간 전부터 아픈 사연이 미국의 매체들에 소개되었고 크게 주목받았던 책이다. 최근 죽음에 관해 꽤 유명한 저자들이 쓴 좋은 책이 여럿 나왔다. 이 책도 아마 금방 번역되겠지 싶다. (지금 이걸 새소식으로 올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저자는 오래 전부터 글을 쓰고 싶어했다고 한다.
책의 일부가 출간 당시 {뉴요커}에 실렸다.
http://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my-last-day-as-a-surgeon
===
내게 멏 달이나, 몇 년이나 남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앞으로 할 일이 정해질 것 같았다. 3개월 남았다고 하면,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 된다. 1년 남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것이다(책을 쓰자). 10년 남았다고 하면 진료실로 돌아가면 된다.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는 소용이 없었다. 그 하루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내 주치의는 이렇게만 말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암을 진단받기 전, 나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제인지 몰랐을 뿐. 암을 진단받은 뒤에도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사실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심란해진다. 하지만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14/01/25/opinion/sunday/how-long-have-i-got-left.html
중에서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