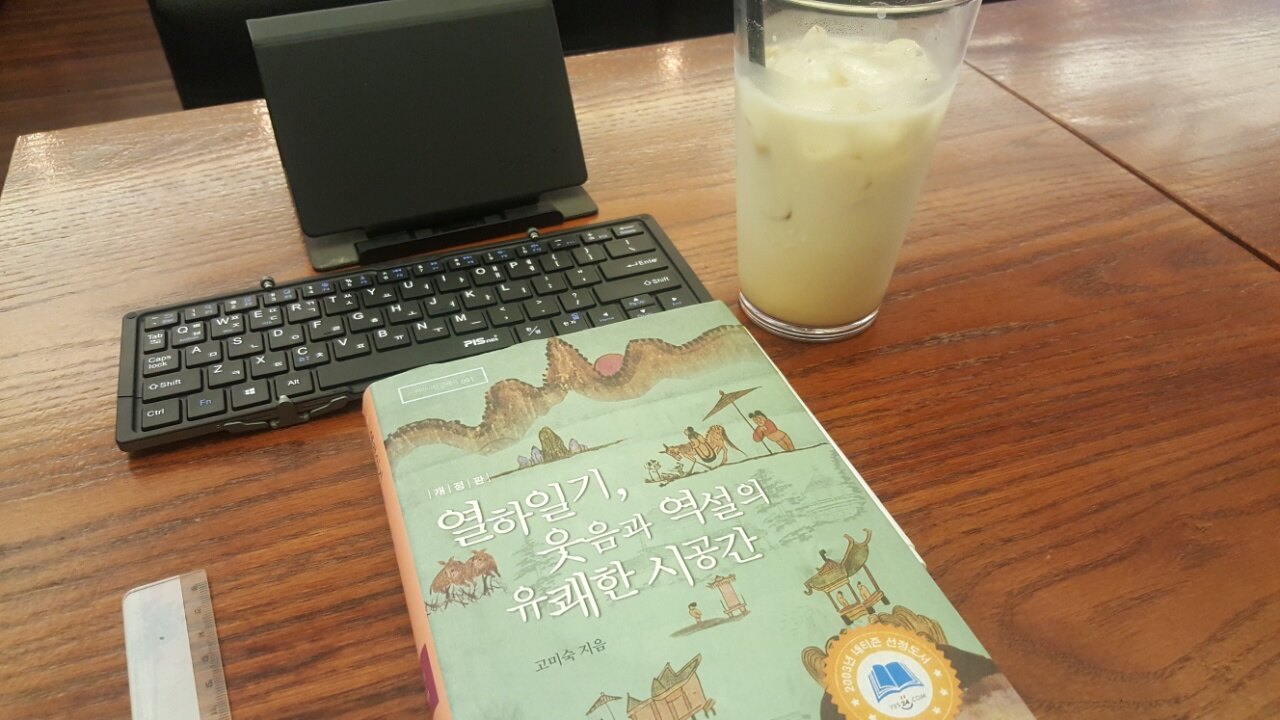누군가 내게 대체 왜 이 책을 썼냐고 묻는다면, 나도 이렇게 답할 작정이다.
연암이 얼마나 ‘유머의 천재‘인지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열하일기의 웃음을 사방에 전염시키고 싶었다고, 그 웃음의 물결이 삶과 사유에 무르녹아 얼마나 열정적인 무늬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노라고. - 10쪽 책머리에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열하일기(완역본,3권)을 책장에 떡하니 꼽아두고 침만 삼키고 있습니다.
직진하자니 고통스러울 것 같아 우회로로 갑니다.
리라이팅 클래식 시리즈 목차들을 살펴보니
꽤 매력적인 책들이군요.
고미숙 작가의 이 책은 책좀 읽는다(?)는 독자들에게 유명세로 보자면 왠만한 베스트셀러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때론 뜨거운 반론의 도마위에 올라가 공격당할 때도 있더라구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미숙 작가의 아래 글은 제가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꽤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그리고 비평가의 내공이 묻어나오는 문장입니다.
˝하기야 이런 건 사소한 핑계에 불과한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행에 대해 냉소적인 진짜 이유는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노라마식 관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파노라마란 무엇인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퍼레이드다. 거기에는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간의 얼굴과 액션(action)이 지워져 있다. 또, 그때 풍경은 자연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생명의 거친 호흡과 약동이 생략된 ‘침묵의 소묘‘일 따름이다. 이런 구도에선 오직 주체의 나른한 시선만이 특권적 지위를 확보한다. 시선이 ‘클로즈 업‘되는 순간, 대상은 전적으로 거기에 종속될 뿐.
도시인들이 보는 전원, 동양인의 눈에 비친 서구, 서구가 발견한 동양, 사실 이런 건 모두 외부자가 낯선 땅을 ‘흘깃‘ 바라보고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 아니던가. 그 허상이 막강한 힘을 확보해 한 시대와 사회를 ‘주름잡는‘ 표상이 되면 모두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것을 대상에 위압적으로 덧씌우는 식의 악순환을 얼마나 반복했던지.˝ -18쪽
˝이질적인 마주침과 신체적 변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화려한 여행도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패션‘, ‘레저‘이상이 되기 어렵다. 하나의 문턱을 넘는 체험이 되지 않는 여행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