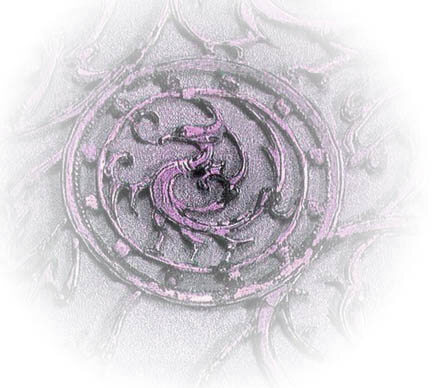
1부. 야철신
[난 팔색조를 먹는 취미는 없으니 걱정말라고. 꽤 오래 심심했는데 소문으로 들은 게 눈 앞에 보여서 온 거 뿐이야]
[소문?]
[인간이 팔색조를 들고 다니는데, 살이 올라서 맛있어 보이는 놈이라고]
아..그래서 쉴 틈도 없게 덤벼들었나보다. 그들의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리고 뭔가에 홀린 듯 했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으니 걱정이다.
[내 체취 때문에 이 녀석의 냄새가 안 날텐데..]
예전에 새지가 그런 말을 했었다. 내 냄새는 좀 비릿한데가 있고 강한 편이라 같이 있으면 자신이 덜 위험하다고..
[피의 향만큼 진한 건 없지. 지금도 코를 찌를 정도야. 이 부근에 너만큼 지독하게 냄새나는 생물은 없어]
나랑 새지는 살육의 현장을 떠난 후로 목욕을 전혀 하지 않아 피가 온몸에 덕지덕지 묻은 채였다. 옆에 인간이 있다면 아마 이런저런 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할지도 모른다. 내 몸을 내려다보니 문득 씻고 싶어졌다. 가는 내내 요괴들이랑 싸우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하루 정도 후에 마을 근처에 도착할 것이므로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과 이런 괴물같은 모습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이 근처에 혹시 냇가가 있을까?]
내 물음에 요괴는 빙긋 웃으며 눈을 감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귀에는 물 소리가 들리는지 손을 들어 왼 쪽을 가리켰다.
[사람은..없어도..요괴들은 있겠지]
[물론 그렇지. 널 열열히 환영할 껄]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지 큰 소리로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며 근처 나무들이 몸을 떨었다. 가지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던 새들이 깜짝 놀라 박차고 날아올랐다.
숲을 통과하여 내리막길로 들어섰더니 그의 말대로 그리 넓거나 깊지는 않지만 물이 맑아보이는 냇가가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전달해주는 차가움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인지 물 속에 숨어 있던 바가지 모양의 요괴가 물을 팅기며 솟아올라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이곳에 데려다준 요괴를 찾았다. 그는 바위에 앉아 부채질을 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