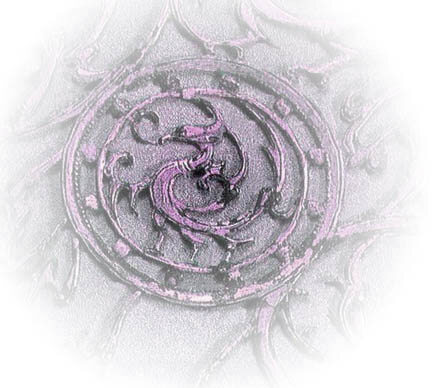
1부. 야철신
해가 뜨면 일어나 걷는다. 배가 고프면 열매를 먹고, 토끼를 잡아 먹었다. 올가미를 만들어 설치하고 기다리면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쉽게 잡힌다. 이 곳 지역에서는 올가미를 설치하는 이가 없는지 동물들이 경계를 전혀 안한다. 제일 처음에 토끼를 잡았을 때가 생각난다. 몸부림을 치다 죽은 토끼를 본 순간 시체들이 떠올라 속에 든 것을 몽땅 게워냈다. 아픈 속을 문질러도 그 역겨움이 멈추질 않고 치밀어 올라 결국엔 먹지 못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일 뿐,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었다. 먹어야 걷을 수 있다는 생각에 토끼의 내장을 제거하고 불에 구웠다. 무슨 맛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배가 부르면 그만일 뿐. 그 후론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으니 힘이 생겨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 나의 계획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면 분명히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이를 만날 수 있을테니, 새지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이~그거 팔색조 맞지?]
낮이고 밤이고 요괴가 없는 곳이 없다보니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지를 탐낸다.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달라는 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덤벼든다. 힘이 센 놈, 약한 놈, 눈이 한 개 인 놈, 팔이 세 개인 놈, 개구리의 머리를 들고 있는 놈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만났다.
만약 사람들이 요괴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는 게 지금처럼 우아할까? 나 역시 이 놈들을 보지 못했다면 전쟁터에서 이미 죽어, 그들의 뱃 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삶이란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보다. 태어날 때 귀족이었던 것도, 천한 지위로 변한 일도, 요괴를 만나고 대장간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고 전쟁터에서 무기 직공이 내 대신 죽은 상황도 어느 것 하나 내 의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삶에 나의 의지가 끼어들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되버리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심정이다.
[그 놈을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해가 중천이라 땀이 비오듯 떨어진다. 원래는 길이 아닌 듯 하지만, 사람과 짐승들이 다녀서 만들어 진 오솔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부터 내 키만한 크기에 저고리와 바지를 차려입은 요괴가 뒤따라 오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요괴들처럼 갑작스레 덤비지도 않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광풍을 불러 일으켜 눈 앞에 어둠을 만들며 나와 새지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도 없다. 그저 몇 걸음 뒤에서 슬렁슬렁 걷는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로 판단하건데, 이 놈은 아주 세서 나 같은 인간은 단칼에 해결볼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들에 지쳐 차라리 빨리 덤비라는 마음을 걸어가는데, 어느새 내 옆에 와 말을 한다.
[넌 인간이라 먹어봤자 하등 쓸모가 없는데...게다가 그렇게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워. 잘 만 자라주면 사신을 능가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요괴인지, 내가 대꾸하지 않아도 혼자 잘도 지껄인다. 어찌나 떠드는지 귀를 막고 싶다. 조용히 좀 하라는 소리가 나오려는 찰라에 갑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생겼다. 위를 쳐다보니 이 말 많은 요괴가 큰 연잎을 들어 해를 가려주었다. 고마움에 슬쩍 처다보니 히죽 웃는다.
[먹을 생각도 없고, 너에게 내 줄 것도 아니니까 사라지던지, 덤비던지 맘 대로 해라]
다시 고개를 숙여 새지를 바라보며 반쯤 늘어지는 목소리로 한 마디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