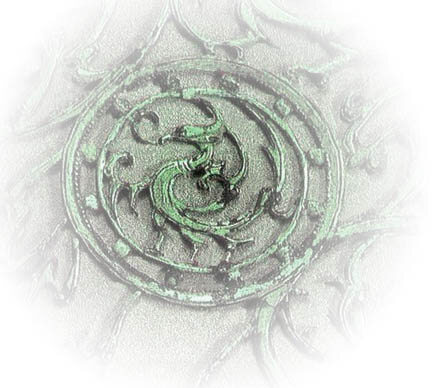
1부. 야철신
춥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마치 허허벌판에서 벌거벗은 채 찬서리를 맞는 기분이다.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불평을 하다니..어이가 없다. 스스로의 모순에 웃음이 터져나와 사래가 들렸다.
[캐캑.케캑]
마른 입술 너머로 한바탕 기침을 쏟아내며 매운 눈물까지 흘리다보니 문득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비록 몸은 차고 뒷머리는 젓어있지만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하늘은 별이 반짝이는 밤이고 저 멀리에서는 엄마품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모든 상황에 전쟁과 죽을뻔했던 일들이 꿈결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전부 죽은 사람들 뿐이다. 피 웅덩이 속에서 조금의 움직임도 없는 시체,시체,시체들이 활과 창에 찔린 상처를 공개한 채 널부러져 있었다. 욕지기가 올라오는 걸 느끼며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자 근처의 피 웅덩이에 뭔가 익숙한 것이 쫙 펼쳐진 채 빠져있었다.
[새..지?]
분명 수 십 가지의 색을 가진 팔색조였다. 피에 젓어 거의 모든 부분이 검붉은 색이지만, 새지가 분명하다. 배를 보인 채로 하늘을 향해 둥둥 떠서 죽은 것처럼 보인다. 소스라치게 놀라 엉금엉금 기어 피웅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건저내 옷으로 얼굴 주변의 피를 닦아냈으나 새지는 미동도 없었다.
[이봐! 야!]
살살 흔들어도, 미친 듯이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스스로 깨어나지도 않는다. 목이 쉬도록 울면서 불러도 반응이 없다. 손바닥만한 새지로 돌아가지도 않는 것을 보면 정말로 죽은 것 같다. 요괴가 사멸되지 않고 죽는 게 가능한가? 이 모습이 정말 죽은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품에 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쪽으로 가자. 누군가..도와줄 사람이 있을거야]
[크큭..크큭..]
뒤를 돌아보자 언제들 왔는지 밤에 만났던 그 요괴 놈이 동료들을 왕창 끌고 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이 박통만하게 벌어지며 웃는다. 그 웃음..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비열한 지옥사자의 모습.
지금은 그 놈이 웃던 울던 사실 중요하지 않다. 새지만 살려준다면 여기 죽어 있는 모든 시체들을 저 놈들이 먹어도 좋다. 혹시 내 팔다리를 원한다면 그것도 줄 수 있다. 새지가 여기에 있는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을테고, 병사의 칼이 내리꼿히는 순간 그것을 막기 위해 변신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 창에 죽을 수도 있을텐데 이 겁장이가 어떻게 달려들었을까..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
와그작 와그작 거리는 소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눈을 들었다. 그 요괴가 내 동료 무기 직공, 나를 살려준 무기 직공의 다리 한쪽을 뜯어내어 씹는 소리에 새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