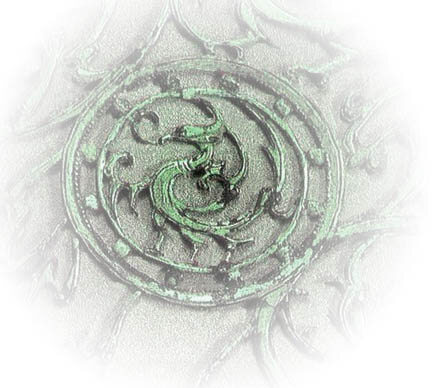
1부.야철신(2)
내가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된 건 10살 때 부터였다. 그해 정월에 마마를 호되게 겪으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사흘 만에 깨어난 후부터 그랬다. 그 때 나는 정신은 들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낮인데도 해가 들지 않아 어둑어둑한 방안에는 나 혼자 인데도 귓가에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깨어날까?]
[오늘까지 눈 못 뜨면 내가 먹어야지]
[에에~또 그러면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먹고 튀는 거지. 넌 어디를 먹을래? 다리?]
[거긴 뼈가 두꺼워서 먹을 게 없어, 엉덩이를 줘]
그들은 내가 죽을 거라 단정하듯이 말하며 고깃간의 쇠고기 처럼 내 몸을 토막토막 골랐다. 기분이 점점 나빠져서 눈을 살짝 뜨니 언젠가 칠성당 그림에서 본 도깨비들이었다.
[도깨비가 정말로 있었구나!]
희안하게도 곧 생으로 해체당할 상황인데 별로 두려움이 없었다. 마음 한 켠에선 지겨운 병마보다는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다. 이 돌림병은 한 번 걸리면 무섭게 고생을 하는데다가 살아도 병신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 살 마음이 없었다.
[으윽, 으윽]
그들이 내 다리 위에 올라왔는지 무게감이 느껴져 다리가 저리고 아팠다.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다가 살짝 움직였다.
[앗! 깨는 거 같아!]
[에에~이 놈 목숨도 질기네. 다 죽어가서 잘 되었다 했더니..쩝쩝]
정말로 아쉬운 듯한 탄식이 들리다가 방 안은 곧 고요해졌다. 좀 있다 눈을 떠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 뒤로는 세상, 사방이 요괴 투성이다.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심지어는 뒷간에도 없는 데가 없다. 지난 해 겨울엔, 똥 살 때 하도 뒷골이 뻑뻑해서 목을 주무르다 뒤로 꺾었더니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요괴랑 눈이 마주쳐 똥간에 빠졌다.
물론 이제는 하도 봐서 별 느낌이 없다. 게다가 요령이 생겨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어차피 딴 세상에 가서 살 게 아니라면 어쩌겠는가..그냥 보면서 살아야지..그렇게 결론짓고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