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ㅣ 클래식 보물창고 23
에드거 앨런 포 지음, 황윤영 옮김 / 보물창고 / 2013년 7월
평점 :



그의 이름에선
무언가 어두우면서도 강렬한, 타고 남은 유황의 냄새가 풍기는 듯하다.
에드거 앨런 포.
시(Poet)를 연상시키는 'Poe'라는 성이 가명도 아닌 본명이라니...
그의 운명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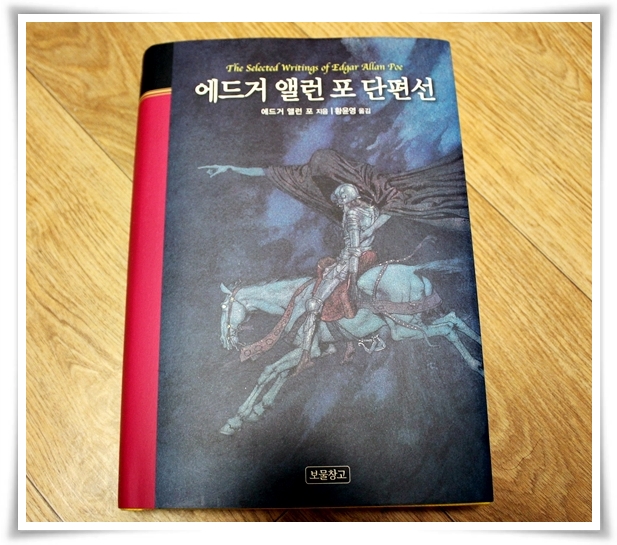
'어셔가의 몰락'이 발표된 것이 1839년,
'모르그 거리의 살인 사건'이 발표된 것이 1841년,
'검은 고양이'는 1843년......
10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그의 작품이 가지는 힘과 어두운 광채는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았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글로도 독자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는
진정 천재다.
한 번 읽으면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쓰는 작가, 포.
공포문학이나 섬뜩한 환상문학을 꽤나 좋아하는 나에게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검은 고양이>.
이 작품의 마지막은 '식스 센스'에도 밀리지 않을 만한 진정한 '반전'이다.
벽속에서 심장을 찢는 듯한 고양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이란....
그러나,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따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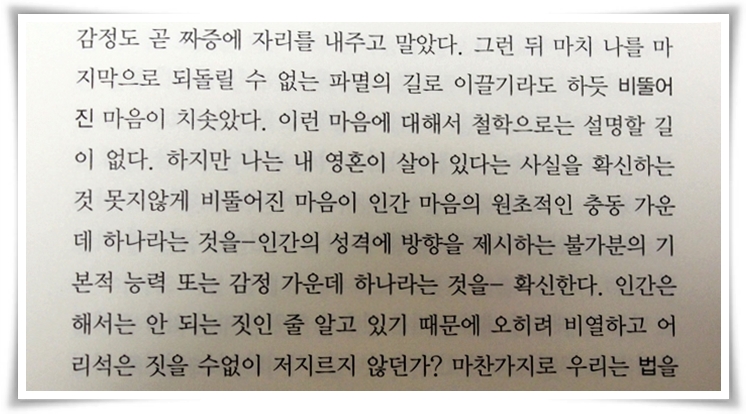
지극히 평범했던 인간이 망가져
자신을 사랑하는 작은 생명을 학대하고 잔혹히 죽이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며 웃음을 흘리는 인간 내면의 사악함.
포는 결코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를 그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의 마음에나 존재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악'을 드러낸다.
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검은 고양이의 주인이 말하듯 어떨 수 없는, 인간을 이룬 한 요소인 것인가?
<검은 고양이>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괴롭힌 작은 짐승에게 심적으로 쫓기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결론으로 인해 공포에 질리는데,
처음 접한 또다른 단편 <절름발이 개구리>에서는
외로움과 조롱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짐승'과 다름없는 난쟁이 어릿광대가
잔학한 왕과 대신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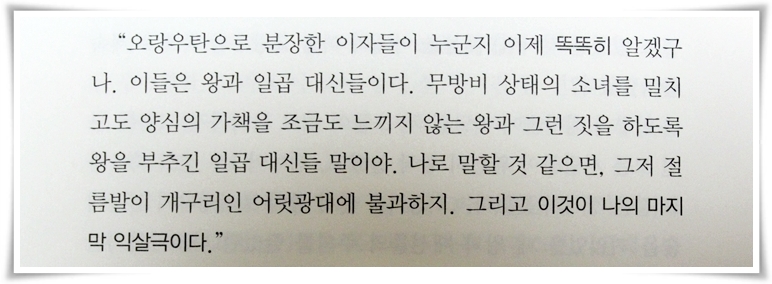
사람들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볼 때에나 환희를 느끼던 왕은
자신이 숙원하던 더할 나위 없는 익살극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게 된 것이다.
그나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납득할 만한 복수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악에 불을 지피는 것은 또다른 '악'이라는 답을 내놓는 듯하다.
그런데, <고자질하는 심장>의 주인공은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과 여러모로 닮아 있는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살의를 노인의 눈 탓이라고 둘러댄다.
살인이라는 생각에 끌려가며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정당화하는 그.
'포'는 인간을 휘두르는 어둠의 힘에 대해 깊은 통찰과 함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다.
허나, 이 어둠이 결코 그 주인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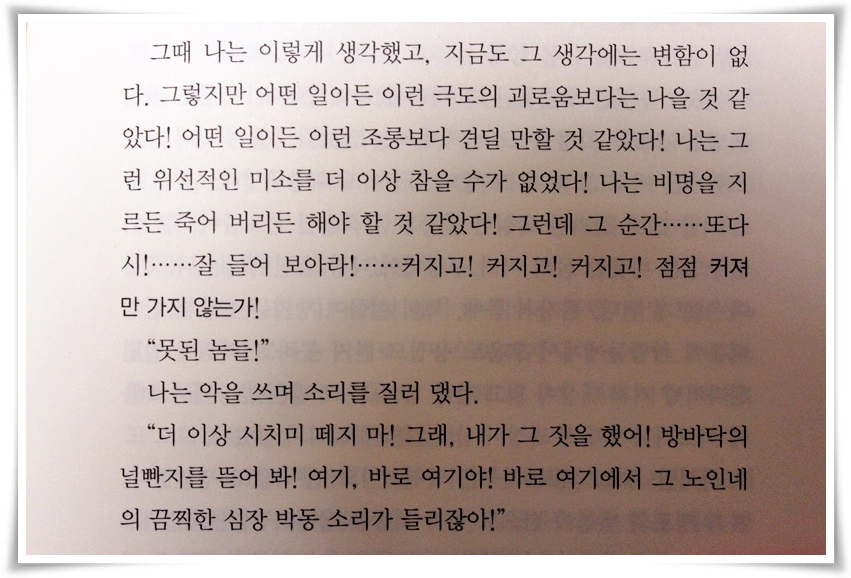
때로는 고양이의 울음 소리로,
때로는 하찮고 힘없는 존재로,
때로는 실재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악은 무서운 속도로 그 발원자를 덮친다.
파편 하나 남기지 않고 대저택을 삼켜버리는 깊고 축축한 늪처럼. (<어셔 가의 몰락> 중에서)
만나는 횟수가 쌓여가고 내 나이가 늘어가면서
에드거 앨런 포는 친구 같아진다.
그의 다양한 작품들은 그의 다각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신경질적이고 어둡고 차갑기만 하던 그의 초상화에
<모르그 거리의 살인 사건>에서 등장하는 뒤팽이 의외의 표정을 불어넣는다.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숨 돌릴 틈조차 없이
'분석적이라 얘기되는 정신적 특성'에 대해 무려 여섯 페이지나 토해내는 열변은
나를 웃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건 내 친구 이야긴데..."하면서 시작되는 바로 그 이야기들 중 하나 같아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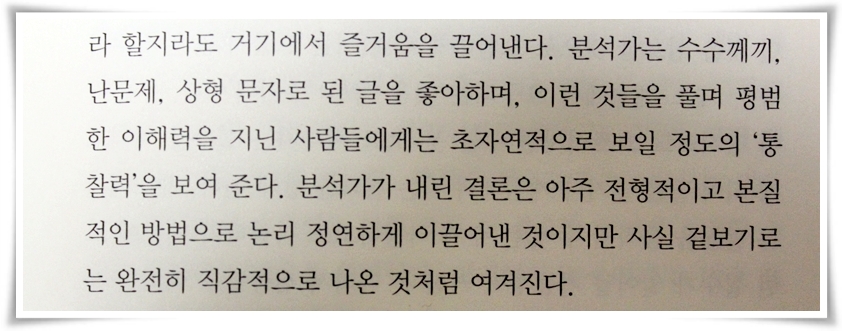
'완전히 직감적으로 나온 것처럼 여겨지는' 건 다름아닌 그의 글들이 주는 인상 아닌가?
'인파 가득한 도시의 거친 빛과 그림자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무한한 정신적 흥분을 구하는(P.89)' 뒤팽에게 포를 겹쳐 보며
'무엇보다 격렬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생생하고 신선하기까지 한 그의 상상력(P.88)'에
나 또한 매료되었음을 깨닫는다.
천재성의 다른 얼굴인 극도의 섬약함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암울한 환영과 싸우는 (P.208) 어셔가의 마지막 후계자는
또다른 포의 얼굴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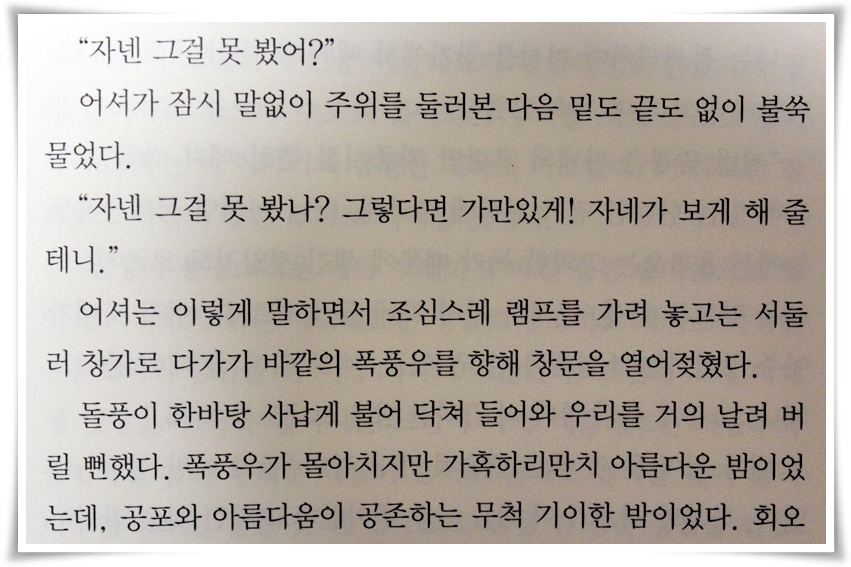
'공포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무척 기이한 밤'
바로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다.
문학사에 선물한 또 하나의 차원인 동시에.
포가 죽음을 맞은 나이는 40세.
그에게 그 이후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머리가 희어지며 미소를 띄고 인간과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늙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또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아직도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