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미안 ㅣ 클래식 보물창고 15
헤르만 헤세 지음, 이옥용 옮김 / 보물창고 / 2013년 2월
평점 :



알과 새, 그리고 아프락싸스...
이 셋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어설프지만 치열했던 첫번째 '방황과 고독'의 동의어인 듯
제목만으로 마음 한 켠을 건드려 싸르르 아파오는 이름.
이 책을 읽었던 것이 20년도 더 전이었다.
뭔가 멋있고 깊이 있다는 느낌,
잘 모르겠지만 끌리는...그런 책이었다.
'데미안' 같은 이를 만나고 싶어서
그 이후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데미안 아닐까?'하며 설레였던 기억이 함께 떠오른다.

피어나는 작은 꽃송이들이 하늘을 수놓은 표지이다.
하얀 꽃들이 약해 보이면서도 아름답다.
닮은 듯 저마다 분명히 다른 꽃송이들을 보며
'이 그림은 무얼 말하려는 것일까?'하는 고민이 든다.
다른 책이 아닌, '데미안'이기에 이런 것이겠지.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어둡고 금지된 세계를 감지하고 끌리는
열 살의 싱클레어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어 빛의 세상에서 멀어지고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악의에 찬 웃음으로 자신에게 속아넘어가는 아버지를 경멸하기도 하는 싱클레어.
내가 겪었던 사춘기도 이런 것이었던가?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겪었던 이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겪었던 이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죽음과 새로 태어남을 딱 한 번 체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남'은
우리가 사랑하게 된 모든 것,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결별을 고하고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싱클레어가 되뇌이는 한 마디는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이 왜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공허한가에 대한 답인 것 같다.
'아,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꺼림칙하고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는 싱클레어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두 세계가 아닌, 다른 길도 있음을 알려주는 데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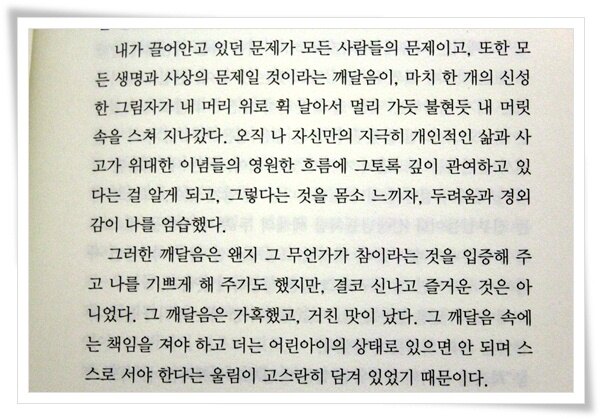
그리고, 데미안이 열어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싱클레어는
두려움과 경외감 속에
'더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며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다시 허망하고 방탕한 생활 속에 자신을 몰아넣지만
그 속에서도 애써 외면할 뿐,
그 때의 깨달음을 잊지는 못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이상'을 찾고 그것이 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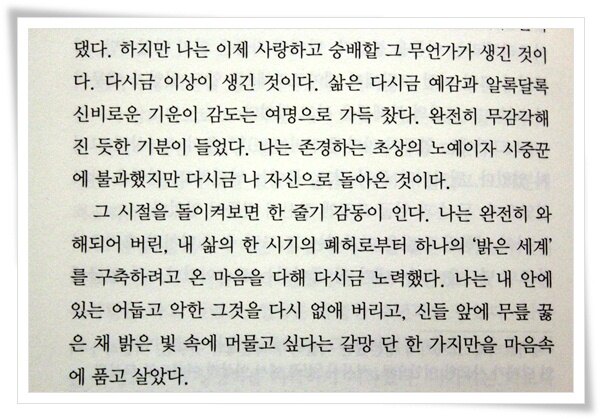
싱클레어를 구원한 것은 '빛'이다.
다시금 '빛'을 원하게 된 것.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저 처음에 속해 있었던 '밝음'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빛.. 스스로 만들어갈 길을 비추는 횃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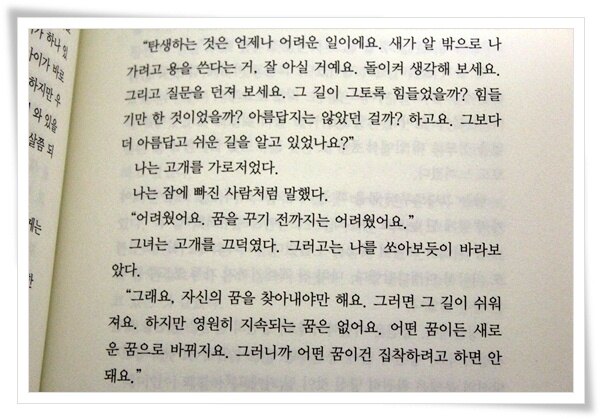
오랜 시간 뒤 만난,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준다.
'그 길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힘들기만 한 것이었을까?
아름답지는 않았던 걸까?'
'어머니'란 이름의 에바가 주는 이 이야기는
끝없는 탄생을 거듭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는
신의 메세지일 것이다.
'꿈'이라는 열쇠가 우리의 길을 힘들지만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다시금 '데미안'을 읽는 순간 순간, 싱클레어가 겪는 그 시절들로 함께 돌아가는 것 같았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살아왔으면서도 지나쳤던 '삶'을
어쩌면 이렇게 맑고 날카로운 눈으로
거울에 비춘 듯 다시 펼쳐낸 것일까?
데미안의 눈에, 우리는 대부분 아직 어린아이일 것이다.
아니, 영원히 어린아이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세계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나'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
끝없이 꿈꾸고 찾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그러니, 절망도 방황도 당연한 것이며 아름답다고
데미안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