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박완서 지음 / 세계사 / 2024년 1월
평점 : 



박완서 작가님이 타계하신지도 올해로 벌써 13년째가 된다.
한국 현대 문학계의 큰 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박완서 작가님은 특히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다.
나이 40이라는 꽤나 늦은 나이에 여성동아에 [나목]이 당선되어 늦게 등단하였다는 것도 나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네 딸과 외아들을 키우며 전업주부에서 글을 쓰는 작가로 직업이 바뀌고 난후 맹렬하게 많은
작품들을 써왔다. 본인 스스로도 일년 한두편 정도 우아하게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어느날 보니
다작을 하는 작가가 되었더라고 할 만큼 글쓰는 것에 대해 진심이었던 것 같다.
다시는 박완서 작가님의 신작을 접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유고작들이 새로이 꽃단장하고 나올때마다 다시 뵙는듯하여 마음이 설레인다.
읽고 또 읽어도 좋을 만큼 박완서 작가님의 글에는 매력이 많다.
이번에 세계사에 출판된 [사랑이 무게로 안 느껴지게]라는 그녀의 에세이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이다.
수록된 46편의 에세이는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써오신 작품들이다.


작가님을 회상할 수 있도록 싸인과 생전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어두었다.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지금까지 오래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경험이 누적돼서 그것이 속에서
웅성거려야 해요
글을 쓰것이 직업이라고 하지만 작가라고 해서 결코 쉽게 글을 쓸 수 있는건 아닐것이다.
생각을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그것이 차오를때 그때 펜을 들고 작업에 몰두하셨을
작가님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기다릴줄 아는 여유, 여물어 가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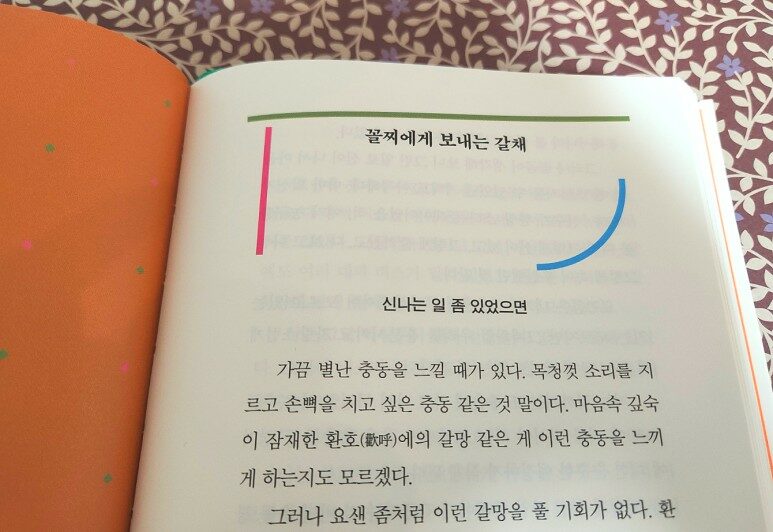
수록된 많은 에세이 중에서도 역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
박완서님이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버스가 길가에 멈춰서 버린다.
무슨 일인지 도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버스가 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버스 안내양은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교통이 통제 되었다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재미있는 일 하나 없던 그녀는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환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버스에서 내려 마라톤 코스가 지나가는 사거리로 신이나서 황급히 가보지만
거리는 잔치끝난 집처럼 휑하니 매가리가 없다.
이미 한참 전에 선두주자를 포함한 주자들이 사거리를 지나간 뒤였던 것이다.
멈춰서 있던 차량들이 기다림에 지쳐 들썩거리지만 사거리를 지키는 경찰은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를 내며 차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었다.
'뭐야, 다 지나가고 꼴찌만 남은건가..'싶어 실망하던 와중에 유니폼을 입고 달려오는 마라토너를 보았다.
그리고 박완서는 여태껏 본적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고통스럽고,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보게 된다.
그 순간 그녀는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면서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를 질렀다.
주저 앉으면 안돼. 포기하면 안돼.
그녀의 환호에 남아 있던 몇명의 관중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었다.
속임수가 용납되지 앟은 정직한 운동인 마라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오로지 의지력으로
버티고 버텨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한 꼴찌에게 그날 선생님은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우리는 1등만 주목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찬사와 박수는 언제나 1등의 몫이다. 물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1등이 감내하고
버텨왔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찬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1등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한명의 1등과 수많은 1등이 아닌자들..
나의 삶도 1등 아닌자에 속하겠지만 나름대로 내 삶속에 나는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다.
노력한 꼴찌도 분명 박수받고 격려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나에게 울림이 컸던 이야기였다.
그 밖에 '나의 아름다운 이웃' , '내가 걸어온 길','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항아리를 고르던 손'등 작가로써의 박완서, 일반인으로써의 박완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글들도 인상적이었다.

박완서 작가님의 생전에 좋아하시고 아끼시던 물건들도 책 말미에 소개가 되어 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작은 라디오, 손바닥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연필깎이 등..
낡고 오래되었지만 한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는 애틋한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보물같은 수 많은 글을 주시고 떠나신 박완서 작가님과 다시 조우할 수 있었던
고마운 책이다.

*본 포스팅은 문화충전과 제휴업체와의 협약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