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가 산으로 간다 ㅣ 문학동네 시인선 65
민구 지음 / 문학동네 / 2014년 11월
평점 :



1. 어두운 갈색에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다
이 색은 마을 입구에서 비를 맞는 장승의 부라린 눈이고, 색색의 줄을 가지마다 걸친 성황당 나무의 단단함이다. 연기가 올라오는 지붕, 낮은 기둥을 이루는 손 때이며 다른 소문이 침범할 수 없는 방 입구의 붉은 글씨다. 지금은 사라진 마을, 그곳에 살았던 이들을 단단히 결속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시작은 달이다. 달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일까. 누구나 달이 있다고 하늘을 가리켜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을 끌어내 '여기 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 달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 아닐까 싶다. 달이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과학의 일이 아닌가 하며 어물쩍 물러선다. 그러나 시인은 이지러지는 유약에 묻는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목을 빼고 저것을 쳐다보았다고? 시인은 달을 보고 짖었을 늑대를 풀어놓는다. '줄을 풀고 창문으로 넘어들어온 달이 구석에서 나를 물고 어금니를 드러낸다// 오줌발이 얼마나 센지 사방 벽으로 튀어 잘 지워지지 않는다// 달은 나무를 잘 탄다' 「움직이는 달」 부분.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달에 관한 신화 중 가장 얼굴이 잘 보이는 달이다. 달은 소원을 등에 받아두기만 하지 않는다. 달은 유년의 등을 쫓길 잘하는 곰보 핀 개구진 모습이다. 시인의 주문으로 달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움직인다. 시가 가진 힘은 새로운 믿음을 견지하는 데 있지 않을까. 아름다움이 논리를 뛰어넘는 것을 본다. 달이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달이 갈긴 담벼락 오줌발을 보여주면서
달을 존재하는 것으로 끌어내린 시인은 이제 '동백'을 통해 설화를 빚는다. '나는 천천히 돌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눈 덮인 지붕 아래서 죽은 자들이 일가를 이루고 산다/ (...) 파리채로 모기를 잡던 여자가 밥상을 내온다/ 이걸 먹으라고? 기가 차서 주위를 둘러보면/ 벽에 문드러진 동백들' 「동백」부분. 벽에 문드러진 동백이 보여주는 인상은 무엇인가. 시는 끝이 났고, 기가 찬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나'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 동백이 주는 서늘함과 죽은 자들이 이룬 일가의 으스스 함.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화자의 순진함이 위험해 보인다. '동백'은 다른 세계를 알리는 이정표이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연기'로 보인다. 동일한 제목의 '동백'을 보자. '나는 항상 그를 본다 유년의 어느 날/ 따귀 맞은 채 올려다본 교정 한가운데서/ 유유히 담을 넘던 사내의/ 멋진 신발을 기억한다' 「동백」 부분. '목줄을 풀고' 들어오는 달도 있는데, '민첩하게','산 너머로 달아나는' 동백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동백'을 잡으려는 '나'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지만 동백을 '멋진 사내'로 만드는 데는 성공한다. 이어지는 동백의 연작에서는 동백으로 현재와 예전을 포개 잇는다.
'딸애가 여우에게 물렸다고/ 새 장화에 피가 묻어 친구들이 자길 피하더라고/ 설산에 떨어진 핏자국 따라 첩첩산중/ 등굣길 걸어 너를 업고 오는 길' 「동백2」 부분. 여우에 물린 딸을 안고 '나'는 급한 대로 바위를 두드린다. 딸을 뺏긴다, 기다린다, 시간이 흐르고 의사는 돌이 된 딸을 돌려주는데. 지폐를 건네고 돌려받는 여비가 '동백' 몇 닢이다. '낯익은 총성만 동백나무/ 빈 광주리에 담겨/ 내려오는데' 「동백3」 부분. 「동백」연작의 인상은 눈 속에서 피는 붉은 꽃잎의 기이함으로 현생과 다른 생을 이으려는 간절함 아닐지. 눈 속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과 여우와, 총성과 광주리가 떠오르는 세계로 가는 길은 끊겼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눈도 여우도 없다. 그러나 길마다 동백은 키 반듯하게 잘려 동그랗고 매끄러운 잎들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나. 커다랗게 피는 붉은 꽃이 어둔 보도블록에 떨어진다. 시인은 지금과 이 낯선 공간을 '동백'으로 겹쳐 꿰매잇는다. 단절된 이야기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동백을 매개로 일어난 것은 이름 하나로 그칠 꽃에서 거대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음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지금과 이어내는 시인의 바늘을. 그것으로 하여금 몰랐던 눈밭이 하나 생기고, 그리로 발을 옮김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 바위를 두드려 의사를 만나는 공간을 낯설어하면 안 된다. 작년 겨울,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 일가가 안나의 치료를 위해 트롤을 만나는 장면이 떠올리자. 없는 세계로 내는 문을 '시'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는 이야기 없음이 아니라 상상력 없음이리라. 이야기 있으되 그것을 이미지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로 명확해진다. 열광의 일부도 시에게 돌리지 않는 깜깜한 얼굴에도 여전히 시를 읽는 시인을 생각한다.
2. 투명한 공간을 그리는 화가, 아니 시인
나는 기다려
천천히 녹는 겨울을
흐르는 평범한 세계를
「房-거울」부분.
이전과 사뭇 다른 차분한 어조는 맹렬함과 선명함이 없이 '방'에 도착한다. 방이라 하면, 무엇이 없을수록 깨끗하고 정갈한 방일 테지만 그 무엇들 중에서 가장 없어야 정갈할 것으로 방에 사는 이임을 떠올리면, 사는 이 없이는 '방'자체마저 사라지는 위험을 떠올린다. 정갈함과 방의 존재 이유는 태생적으로 반대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각기 다른 부제를 통해 방의 연작들은 화자인 '나'를 희미하게 지우는 시도를 지속한다. 이것으로 마침내 '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연의 모습에 다가가려는 모습이랄 수 있을지. 방에 대한 이와 같은 집중은「공기」의 연작에서도 이어진다.
나는 빛도 어둠도
털이 다 빠진
까마귀도 아니야
나는 백지
가느다란 손가락이 아니야
「공기-나는」 부분.
시인은 어떤 색으로도 덧칠 할 수 없는 오래된 기억의 색(달과 동백)으로 시작해 어떤 색도 들어올 수 없는 '색 없는 풍경'(공기와 방)을 기록했다. '달과 동백'에서 시인은 달에 대한 수천 년 인간의 믿음을 담벼락으로 끌어내리고 길가를 네모 반듯하게 장식한 동백을 통해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달은 누구나 어느 곳에나 있으나 잡을 수 없는 풍경이고 동백은 겨울에도 꽃을 피우고 초록 잎을 '생경'하게 간직하는 기이한 풍경이다. '달에게 물리'던 시인은 '광주리이고 내려가는' 동백의 정취로 떠나 '방'과 '공기'에 도착하는데. 방과 공기는 내밀하고 순수하게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같다. 그곳은 무엇보다 내가 없는 어떤 곳. 자신이 지워진 곳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를 색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으로도 덧칠 할 수 없는 색의 풍경과 어떤 색도 존재하지 않는 색으로써의 풍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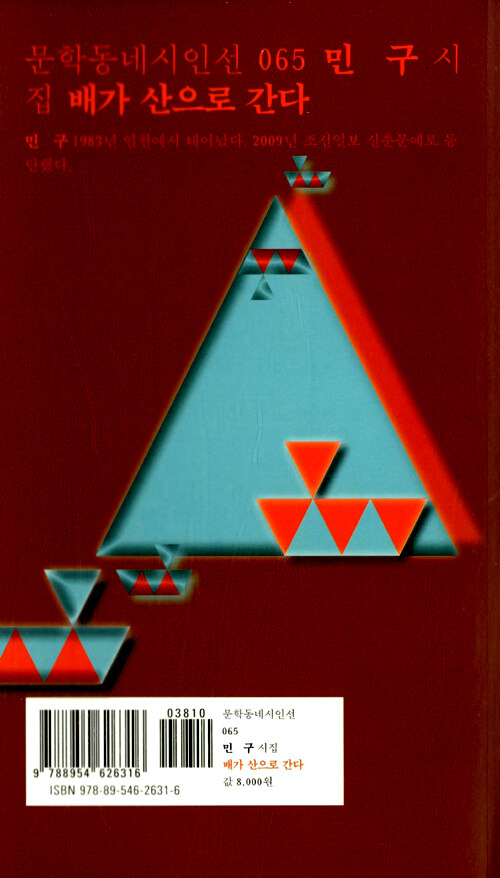
시인은 1983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인의 첫 시집, 마지막 시는 '저리 보면/ 달이 뭐 별건가'「불청객」부분. 로 끝난다. 이것을 말하기 되기까지, '어금니를 드러낸 달'을 불러온 것에서 불과 시집 한 권의 시간이다. 『배가 산으로 간다』의 제목은 산을 오르는 배가 사실은 산 몇 개로 이뤄진 구조물이었다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집 뒤표지, 배가 산으로 가거나 산이 배로 가는 일은 결국 한 모습이었다는 그림. 이것과 같은 구조인지, '달'로 오래 들고 볶은 그가 마침내 '달이 뭐 별건가'라는 대답을 냈다. 그를 보며 언제고 '시가 뭐 별건가' 라며 웃음을 보일 모습을 기다린다. 시인이 처음 만든 일가, 고동-치는 색을 몸에 녹여내는 일이 우리가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만들거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는 비밀일 수 있다는 것을 귀띔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