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이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4년 12월
평점 :



소문난 독서가이자 매일 죽음을 만나는 사람, 그러나 누구보다 유쾌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들려주는 ‘어떤 죽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본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자문 법의학자이자 〈알쓸인잡〉, 〈유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도 익숙한 이호 교수가 “잘 살고 싶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첫 책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을 출간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약 4천여 구의 변사 시신을 부검해온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마주한 여러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들려준다.
<인터넷 알라딘 제공>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당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불의의 사고나 혹은 범죄로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부주의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 그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혹은 그 옆의 누군가가 부도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 완전하고 주의 깊은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래야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불안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얼마나 위험에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p46~47
죽음 이후의 세게는 경험할 수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다. 공자조타 "이 삶도 모르는데 저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했는데, 타인과 다르지 않은 범부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고 그 답을 알리가 있을까. 단지 남들보다 주검을 많이 대하다 보니 삶과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일 뿐. 법의학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내가 무상과 허무를 많이 느낄꺼라 짐작하지만, 오히려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생긴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나무의 맨 끝이 곧 맨 앞인것처럼, 타인의 생의 끝에서 느낀 메시지를 품고 돌아서서 다시 삶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자주 느낀다. 정상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를 끊임없이 다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 P53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이 문제에 답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다. 단 하나의 정답은 ‘물에 빠진 아이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뛰어들어야 한다. 아이에게 달려가느라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오는 것도 보지 못했어야 한다. 이 사고 실험에서 말하는 ‘물’은 정말로 출렁이는 연못의 물이 아니다. 학대당하고, 방임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차가운 세계다. p75
조금 이르거나 느리거나 방법이 다를 뿐 인간이 죽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부조리의 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한 의미를 찾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다. p123
가족을 잃은 사람, 상실의 아픔을 껶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사실 어려운 일이다. 병문안을 가거나 조문을 갔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론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이다.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것. 그 정도가 좋겠다 싶다. 간혹 옆 사람들이 위로 한답시고 그동안의 기억을 자꾸 잊으라고 할 때가 있다. 그만 잊고 떠나보내라고 그런데 가까운 이는 그 사람의 경험이 내 몸에 체화돼 있다.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빨리 잊어라' 그렇게 종용할 필요가 없다. p202~203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지난주엔,
꼬맹이와 여행을 다녀온 후
매일 점심약속이 있었다.
약속 중 하나가 지방에서 10여년을 보낼때
꼬맹이와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인연으로 만나
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고
몇해 뒤에 나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어느덧 자라 결혼을 하고
예쁜 아들을 지난 여름에 출산했다.
내게도 아이를 기다리는 결혼한 딸이 있으니
자연스레 이야기의 주제가 손주 얘기로 흘러갔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듣고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전해 주었다.
'급성 백혈병으로 손주가 태어난지 50여일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ㅠ.ㅠ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는지?!...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만 훔쳐냈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죽음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삶과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고,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는 법의학자 저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죽음 수업을 마침 읽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을 마주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누구라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져 죽을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나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아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벌도 아니다.
고차원적인 메시지나 특별히 선택받은 이유 같은 것은 없다.
지나가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그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자 사건일 뿐이다. p119
처음 내가 암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자책 또 원망의 시간을 보냈을찌
미루어 짐작이 된다.
하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자 사건일 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이 세상의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이가 껶은 사고, 사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책임도 위로도 함께 짊어지는 사회를 꿈꾸라 하지만
지금은 아무말없이 곁에 있어주려 한다.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갈 생각이다.
혹시 또 길을 잘 못 들어서도
다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 최적 경로를 찾아 새길로 가기로 하자.
내 인생도 내비게이션 같은 태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도 인생을 내비게이션 같은 태도로 살면 좋겠다.
아무리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
몇 번이고 길을 잘 못 들어서도,
코 앞의 분기점에서 방향이 헷갈려도,
얼른 다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면 되니까 말이다.
후회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그저 새로운 최적 경로를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새 길로 가면 좋겠다. p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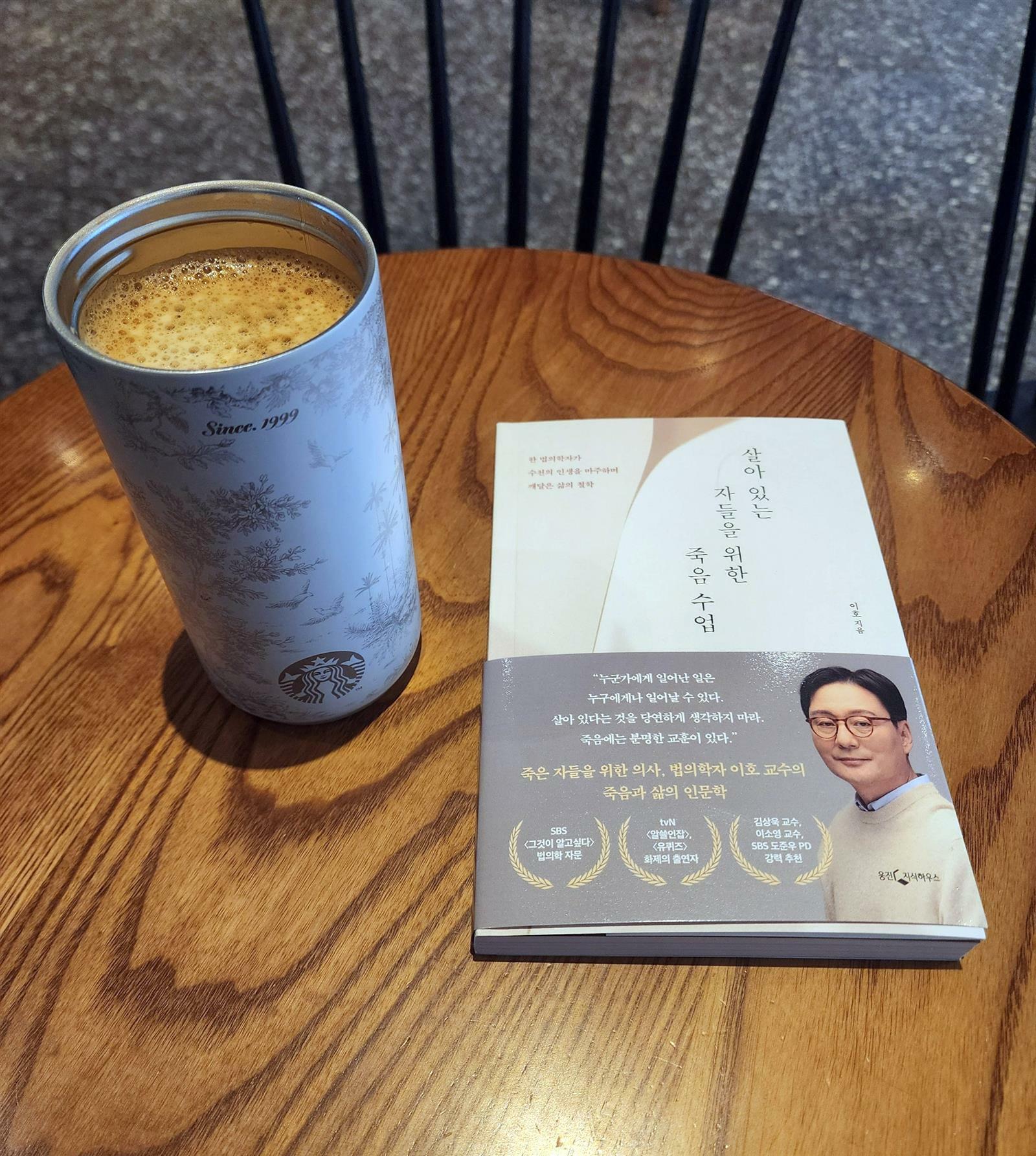
** 이 책은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