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벌거벗은 미술관 - 양정무의 미술 에세이
양정무 지음 / 창비 / 2021년 8월
평점 :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술사를 풀어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 안내자 양정무가 미술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환기하며 미술작품을 통한 사유와 감성의 확대를 모색한 책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미술의 장구한 역사를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미술사학자이자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대중화하는 데 노력해온 양정무가 오랫동안 미술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해오던 문제들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집요하면서도 자상하게 풀어낸다.
‘미술은 왜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고전미술의 신화화 과정을 파헤치고, 미술관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던 무게감을 초상화의 무표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밖에도 박물관과 시민사회의 함수관계, 화려한 미술 속에 담긴 질병의 그림자 등을 통해 인간이 미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축했는가를 살핌으로써 독자들을 미술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로 이끈다.
과거와 현재, 서구와 한국을 넘나들면서 펼쳐지는 설명은 직관적이고도 유려해서 저자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다. 풍성한 화보를 곁들인 양정무의 입체적 안내를 통해 독자들은 안온하고 고상한 세계로 여겼던 미의 세계가 격동하는 뜨거운 세계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인터넷 알라딘 제공]
먼저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바라보기 위해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고전미술이란 무엇이가?' '미술은 문명의 표정이 될 수 있는가?' '미술관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처럼 자칫하면 피상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최대한 현실에 근거한 실천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술이 신비주의의 베일에 가려져 고상한 취미나 교양으로 포장되는 현실을 넘어서 영욕의 인류사는 담은 생생한 실체라는 인식에 다가가디 위해 크고 묵직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p6
누가 고전을 중심으로 세기의 명작을 차지하는가는 곧 누가 유럽의 정신적 뿌리를 차지하는가의 문제, 즉 유럽 전역에서 권위를 발휘할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벌인 이 같은 약탈극은 고전의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라는 혁명의 이념이 약탈의 정당한 근거로 둔갑한 걸 보면 조금 무시무시한 반전이라는 느낌도 들죠. P155
그러나 유럽 각지에 박물관과 미술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담한 정복 전쟁 속에서 벌어진 부당한 미술품 갈취가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p164
뭉크는 의외로 장수했습니다. 스페인독감을 이겨내고 81세까지 살았습니다. 병에서 어느정도 회복한 다음에 그린 1919년의 자화상을 보면 눈, 코, 입이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병마를 딛고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죠. 어렸을 때부터 질병과 죽음의 한가운데서 자라온 뭉크는 가족의 연이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미술을 그 모든 슬픔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의 강렬한 도전정신과 예술혼은 질병 속에서도 뭉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p257~258
여러 방송을 통해 다정한 목소리(?)로 미술사를 쉽게 풀어주시던
양정무님의 미술에세이 벌거벗은 미술관이 출간 되었다.
어린시절 고모의 아뜨리에에서 만나던
줄리앙, 아그리파, 비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대 그리스는 몸짱이 대접받는 사회였다는 흥미로운 구간을 지나
고전미술이 신비화되는 과정을 읽고나니
저자의 이야기처럼 그동안 아름답다고 느끼던
완벽한 비율의 조각상들이
앞으로는 조금 달리 보일 듯도 하다.
초상화는 화가가 모델을 앞에 둔 채 오랜 기간 동안 그려야 하는데,
그동안 웃는 표정을 계속 유지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로크 시대의 풍속화나 초상화를 보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도리어 화가들을 자극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환한 웃음이나 순간적 동작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를 통해 자신의 그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p119

알브레히트 뒤러 / 오스발트 크렐의 초상 / 1499년

프란스 할스 / 웃고 있는 기사 / 1624년
가장 흥미로왔던 섹션은 아무래도 '초상화속 인물은 왜 웃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시대의 미술전에 다녀오지 못한 한을
이 책으로 풀었다. ^^;
가끔 만나게 되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오스발트 크렐의 초상을 보면서
억지스럽게 쓴 인상에 오히려 코믹하게 느껴졌었는데
오스발트 크렐은 뉘른베르크 출신의 상인으로 심각한 표정을 통해
강하게 보이고 싶어했다고 한다.
웃는 모습에 초상화는 바로크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화가들은 이렇게 웃는 모습을 그리는게
자신의 그림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니?!.... @.@

에드바르 뭉크 / 병든 아이 / 1885~86년
질병과 광기와 죽음은 내 요람을 지키던 천사였고,
그때부터 나를 평생 따라다녔다.
몸은 아프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지옥의 벌을 받는 느낌이었다. p253
태양이 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붉어졌다.
암청색의 피오르와 도시 위로 구름이 피처럼 불타올랐다.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나만이 공포에 떨며 서 있었다.
그때 무한한 절규가 대자연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들었다. p256

에드바른 뭉크 / 스페인독감 직후의 자화상 / 1919년
미술과 팬데믹도 관심있게 읽은 섹션으로
뭉크전시회에서 '병든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 생각났다.
뭉크의 작품이라고는 '절규' 밖에 알지 못했던 상황에
'병든 아이'를 직접 보고 도슨트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그후로 뭉크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스페인독감이라는 무서운 병에서 어느정도 회복한 다음에 그린
뭉크의 눈, 코, 입이 다 있는 자화상에선
병마를 딛고 일어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연이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한 미술...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담긴
고전미술과 미술관이야기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다.
회화에 비해 관심도 덜하고
영~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리스조각상도
아주 쬐끔 좋아진 느낌도 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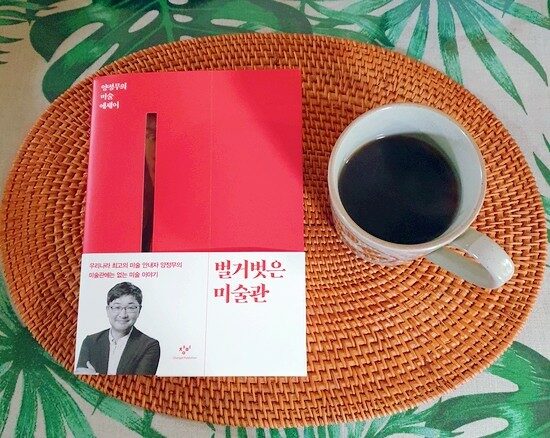
미술을 통해 본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인간은 늘 방황하지만 그것에 도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미술의 역사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술의 역사를 명작들로 이어진 위대한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 조금만 냉철하게 살펴보면 미술의 역사는 도리어 실패와 미완성으로 이루어진 고뇌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예술가들은 완벽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쩔수 없이 겪는 일상적 번민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완벽함과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과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옵니다. p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