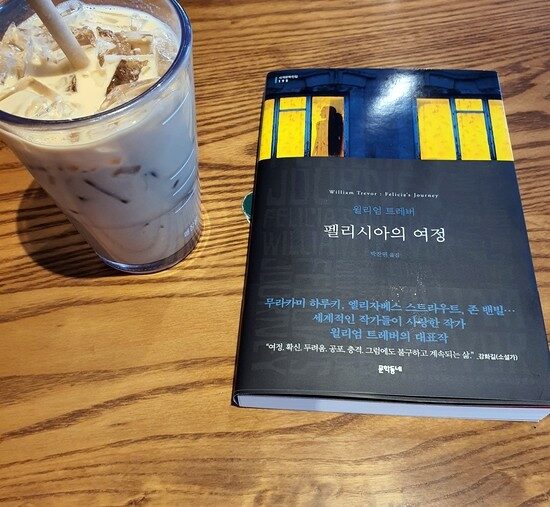-

-
펠리시아의 여정 ㅣ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95
윌리엄 트레버 지음, 박찬원 옮김 / 문학동네 / 2021년 5월
평점 :



세계적인 작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아일랜드문학의 대가 윌리엄 트레버의 대표 장편소설로,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주변부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온정어린 시선,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이 녹아든 작품이다. 평범해 보이는 삶의 장면들은 세심히 들여다볼수록 기괴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띠며, 개인의 삶과 운명은 어떤 사건 하나로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출신 소녀 펠리시아가 여정을 떠나는 서사를 중심으로 하나,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이야기, 즉 미성숙한 주인공이 길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성숙에 가닿거나 깨달음을 얻는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다. 펠리시아 역시 홀로 여정에 오르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지만 독자의 예상이나 바람과는 다른 방향이다.
펠리시아는 남자친구 조니를 찾기 위해 영국행 배에 몸을 싣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와 오빠들, 백 세에 가까운 증조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뒤로하고 떠나온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조니와 재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러나 낯선 나라의 산업 단지를 하염없이 거닐며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일은 녹록지 않다.
그러던 중 힐디치라는 한 중년 남성과 마주치는데, 그가 선뜻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공장의 구내식당 매니저로 일한다는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으로 상냥하고 친절하다. 조심성 많은 펠리시아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한편 힐디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서 그는 펠리시아는 도시를 헤매고 다니며 예상치 못한 여러 인물과 함께하게 되는데, 저마다 슬픈 사연을 하나씩 지니고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괴로워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만나고, 충돌하고, 엇갈린다.
<인터넷 알라딘 제공>
기차에 사람이 들어찬다. 말없이 신문을 읽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곧 시선을 돌린다. - 사람과 집과 차, 철탑과 안테나 - 전부 자리잡을 만큼 넉넉한 공간은 없다는 듯 다닥다닥 붙어 있다. 역이 아닌 곳에서 기차가 멈출 듯하자 사람들 얼굴에 초조함이 떠오른다.
조니도 일하러 갈 것이다. 펠리시아는 그를 그려본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두르는, 하지만 태평하고 걱정 없는 그를,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녀가 본 그의 마자막 모습, 그녀가 아직 광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버스에 오르던 그날 오후의 옆모습과 그의 느긋한 표정을 펠리시아는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저멀리서, 속삭이는 메아리처럼, 낮게 웅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p15~16
힐디치 씨의 사생활은 한편으로는 평범하고 예상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스럽다. 공장 동료들은 그를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람 좋고 유쾌한 인물로 생각한다. 퉁퉁한 풍채에서는 그가 오래사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미소 짓는 모습에서는 외향적인 인생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면 힐디치씨는 종종 그의 내면 깊이 존재하는 다른, 더 어두운 면에 가닿곤 한다. 더는 미소가 필요치 않을 때 그는 우울한 사람이 된다. p19
어느날 저녁 초인종이 울리자 그는 잠깐 망설이다 안락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레코드 바늘을 들어올린다. 그가 평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것뿐이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혼란스러움에 떠밀려 - 한순간 거기 있다가 바로 다음 순간 사라지는 희망, 위안의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찾고 싶어 낙담한 가운데서도 손을 뻗으며 - 천천히 홀을 가로지른다. p271
다시 한 번 그녀의 생각이 옮겨간다. 부엌바닥에 쓰러지 어머니에게로, 그후 다정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가져다준 조개껍데기에게로, 녹색 점박이 알들, 존 카운터의 노래, 그 무렵 어떤 기색도 내비치지 않던 아버지의 쓸쓸한 눈, 떠나버린 남편이 안긴 치욕에 대한 답이었던 형벌 같은 상처, 아들을 향한 암처럼 조용한 사랑, 살인을 한 남자의 저 깊은 곳에도 다른 영혼과 다를바없는 영혼이, 한때는 분명 순수했을 영혼이 있었을 것이다. p319
비를 간절히 기다리던 때도 분명 있었을텐데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비가 장마도 전에 자주 내리는것 같다.
이렇게 비오는 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딱 읽기 좋았던 책
'펠리시아의 여정'
신간소식에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내가 딱 좋아할만한 블랙과 대비되는 묘한 분위기의 푸른빛 표지에
내가 또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랑한 작가라고 하니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자 싶었드랬다.
처음하는 해외여행 그것도 혼자하는...
아주 오래전이지만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은 낯선 도시에서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며 당황스러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친구가 오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국제미아(?)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던 그날의 기억...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출신 소녀 펠리시아는
남자친구 조니를 찾기 위해 영국행 배에 몸을 싣는다.
펠리시아펠리시아 역시 홀로 여정에 오르며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책을 읽기 전
조금은 낭만적인 여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험란한 여정이 펼쳐지고 있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와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힐디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종종 내면의 깊은 상처를 감추기위해
겉으론 더 다정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을 만나곤 한다.
'살인을 한 남자의 저 깊은 곳에도 다른 영혼과 다를바없는 영혼이,
한때는 분명 순수했을 영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저자
트래버는 한 인터뷰에서 "이 책은 선함에 관한 이야기'라 말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선은 우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접한 후에야 눈에 보인다. 『펠리시아 여정』역시 여정의 끝에 이르러서야 주변에 선이 흐른다. 평범한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 부랑자들의 이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며 노숙인들에게 수프를 나눠주는 여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작가도 인정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서너 페이지에 가서야 나오는 것은 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p326

이 책은 '펠리시아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책만한 영화는 없다는 생각이지만
펠리시아가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졌을찌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