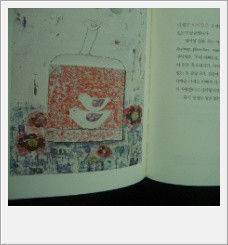-

-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 장영희가 남긴 문학의 향기
장영희 지음, 장지원 그림 / 샘터사 / 201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장영희 교수의 소박한 꿈이 묻어있는 그녀를 닮은 책과 마주하니 문득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2009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던 5월, 꽃같이 살다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지요. 떠난자의 뒷모습이 이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문학의 숲을 거닐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이야기하던 그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글들이 그녀의 올곧은 마음과 한결같음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의 글 속에는 진실함과 삶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충만했고 문학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그가 남긴 글을 통해 진한 감동으로 전해져 옵니다.
장영희 교수가 생전에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과 글을 모아 엮은 '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는 신문을 통해 만나 본 적이 있기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읽으면 읽을 수록 맛깔스런 그녀의 글은 오래 두고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보리밥처럼 구수한 단내가 나고 그리움이 배어져 나옵니다. 그의 글에는 늘 '희망'이 존재네요. 절망을 말할 때 조차도 그 뒷면에 더 강한 희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그녀가 장애인이였다는 사실도 많이 아팠다는 것 조차도 잊어 버리곤 합니다. 도리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선물과 그리움의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이 책은 장영희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이들에게 선물이 될것 입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누군가가 나로 인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장영희가 왔다 간 흔적으로 이 세상이 손톱만큼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고 장영희는 말합니다.
그녀의 글의 소재는 대부분 그녀 자신이기에 글을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발가벗고 대중 앞에 선 기분이라더니 그의 글 속에는 그녀의 소소한 일상과 그녀를 둘러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들과 평범함 마저도 소중하다며 일일이 글로 적어 남겼네요. 그저 담담하게 지나치던 일상의 풍경 마저도 그의 눈에 비치면 아름다운 글이되고 녹아 들어 작품이 됩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삶의 작은 일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삶이 가치를 일깨우게 합니다.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대단한 사람인양 특별한 감정이 들게 되네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녀만의 마술과도 같은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무더운 날, 우연히 만난 주유소에서 일하는 젊은이와 한 여학생의 작은 선행을 통해,‘톨스토이의 행복의 이론’을 생각해 보고, 심한 뇌성마비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며 오히려 그 아이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아이보다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그 아이를 통해 사랑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어느 부인의 말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_장영희가 사랑한 영미문학
영미문학 칼럼을 통해 연재 되었던 글을 다시 봅니다. 척추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당시에도 영미시가 그에게 바깥세상과 소통의 수단이였으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편이였기에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녀의 갸녀린 몸뚱아리 어디서 그런 힘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지 병원에 입원하기전까지 그토록 좋아했다던 '영미 문학'과 만나 봅니다.
그가 좋아하고 아껴 두었던 영미시와 영미문학을 들여다 보면 삶과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이네요. 윌리엄 케네디의 <내가 너를 사랑한 도시>에선 저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향, 은하수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만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깔려서 버림 받고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사람들을 통해 작가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다시 억새풀 처럼 끈질기게 태어나는 삶을 말하고자 했다네요. 로버트 브리지스의 〈6월이 오면〉을 조용히 읊조리며 인생은 아름답고 또 살만하다고 하네요.
앨프레드 테니슨의 <사우보思友譜> 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로 '마치 숨만 쉬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양 살지 않고, 상처받을 줄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삶을 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살해본 적 없는 것보다
사랑해보고 잃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
그녀는 가슴저미는 사랑이야기를 좋아하는군요. 위대한 개츠비, 주홍글자, 폭풍의 언덕 등 격정정인 사랑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 적이 내게 있엇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녀에게 그 사랑의 대상은 아마도 영미문학이 아니였던가 싶습니다. '당신이 고른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글귀에 곁들인 당신의 친절한 해설을 읽으면서는 아아, 좋은 시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구도자에게나 그 진정한 속살을 드러내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게 아니로구나'라던 박완서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장영희를 사랑하고 기억하며 소설가 박와서님도 그녀에게 글을 썼고, 김점선 화백과 더불어 ‘삼총사’로 늘 함께하던 이해인 수녀님도 장영희, 그녀에게 마음을 담은 시 한 수를 띄워 보냅니다. 지인들이 그녀의 픗픗했던 학창시절 사진도 담고 노래도 만들었네요.
미소와 위로의 말 한 마디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게 일깨워 주고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무덤에 있지 않고 늘 우리곁에 영원히 함게 할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부눈 바람이며
금강석처럼 반짝이는 눈이며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빛이며
폭촉히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도 중-